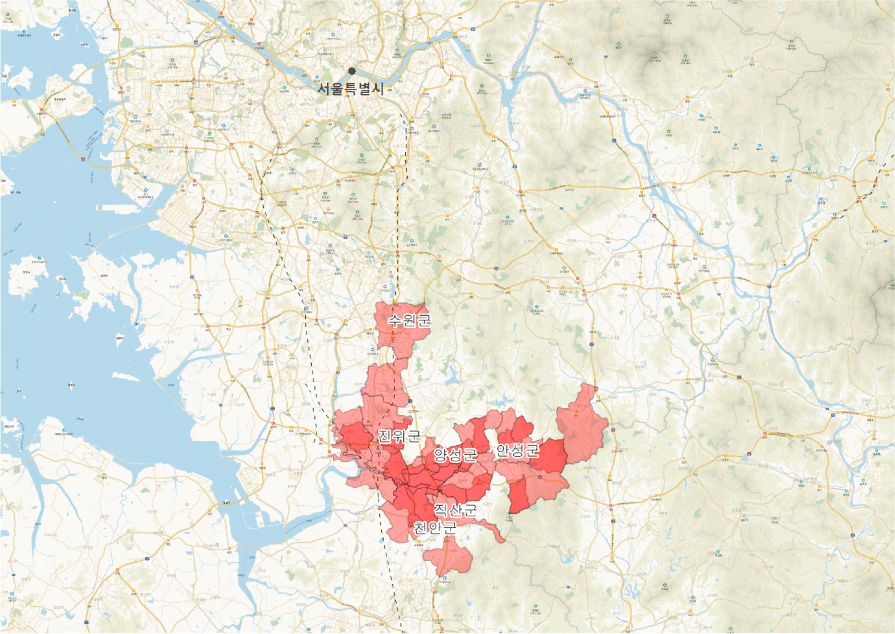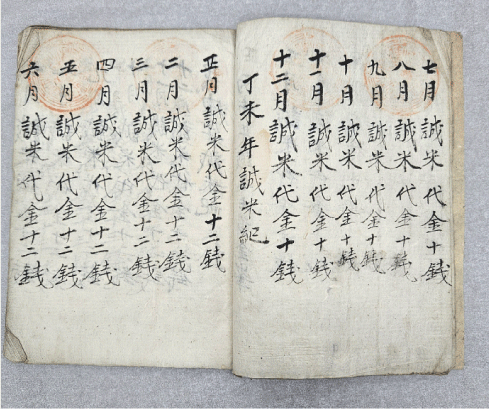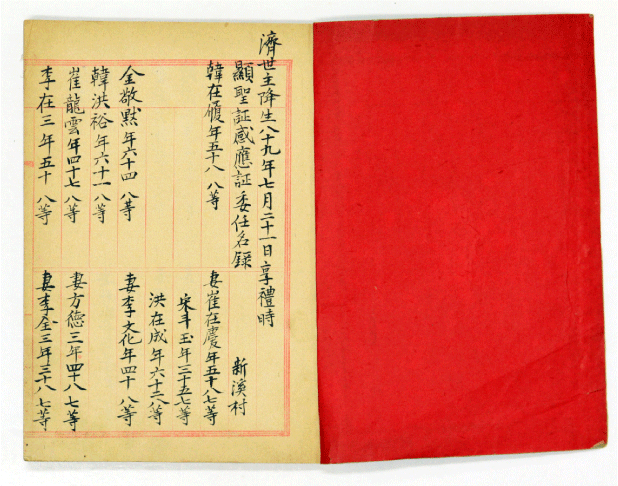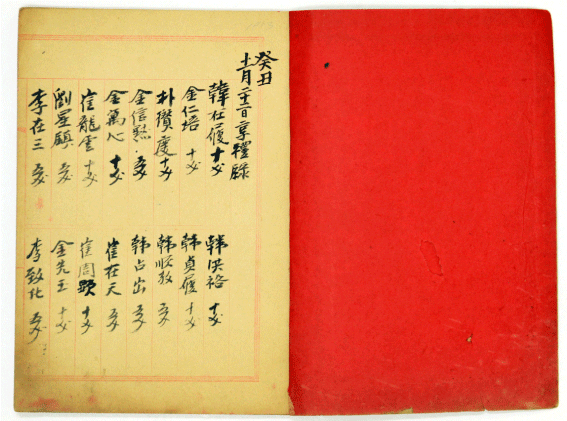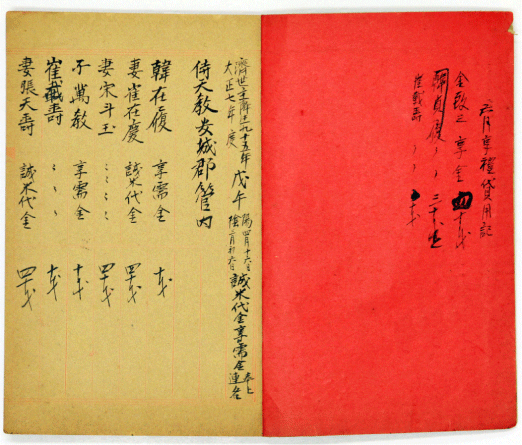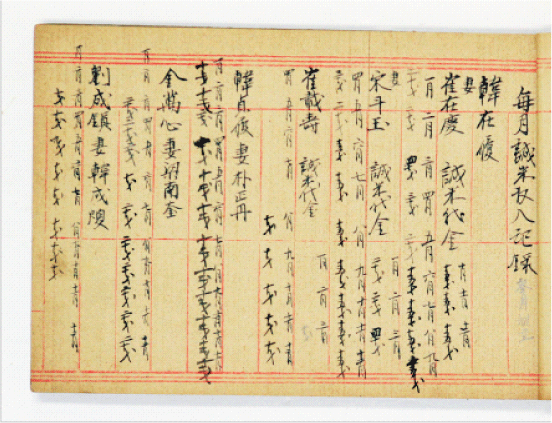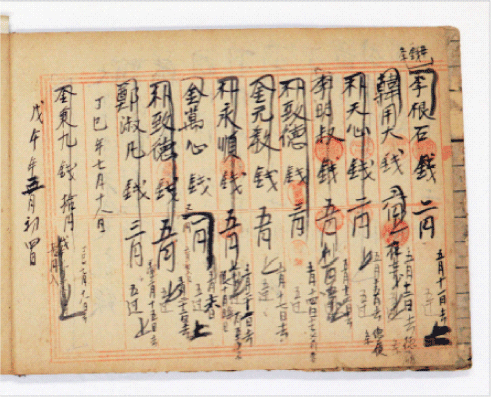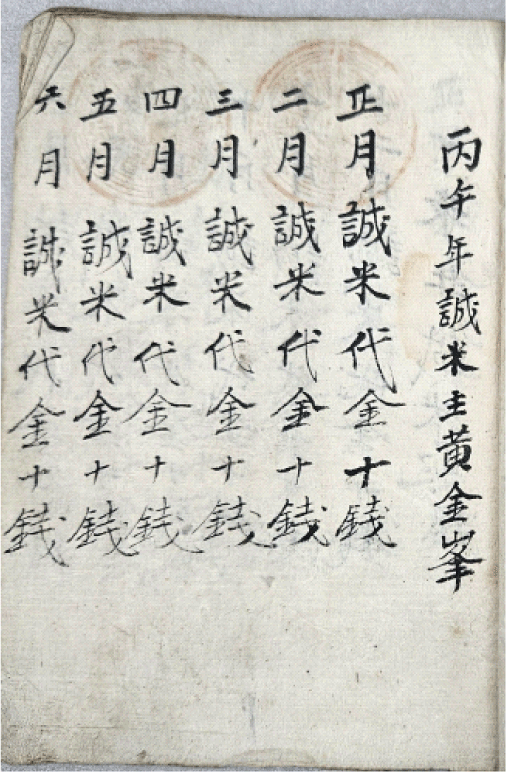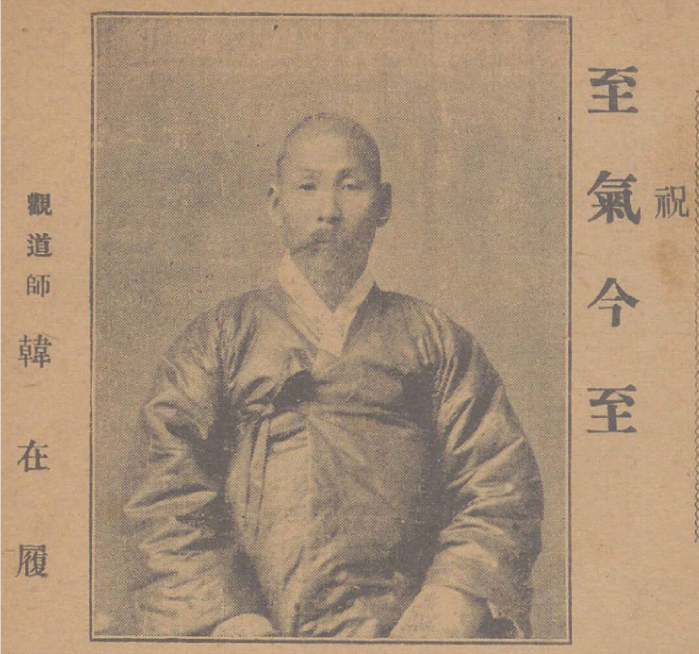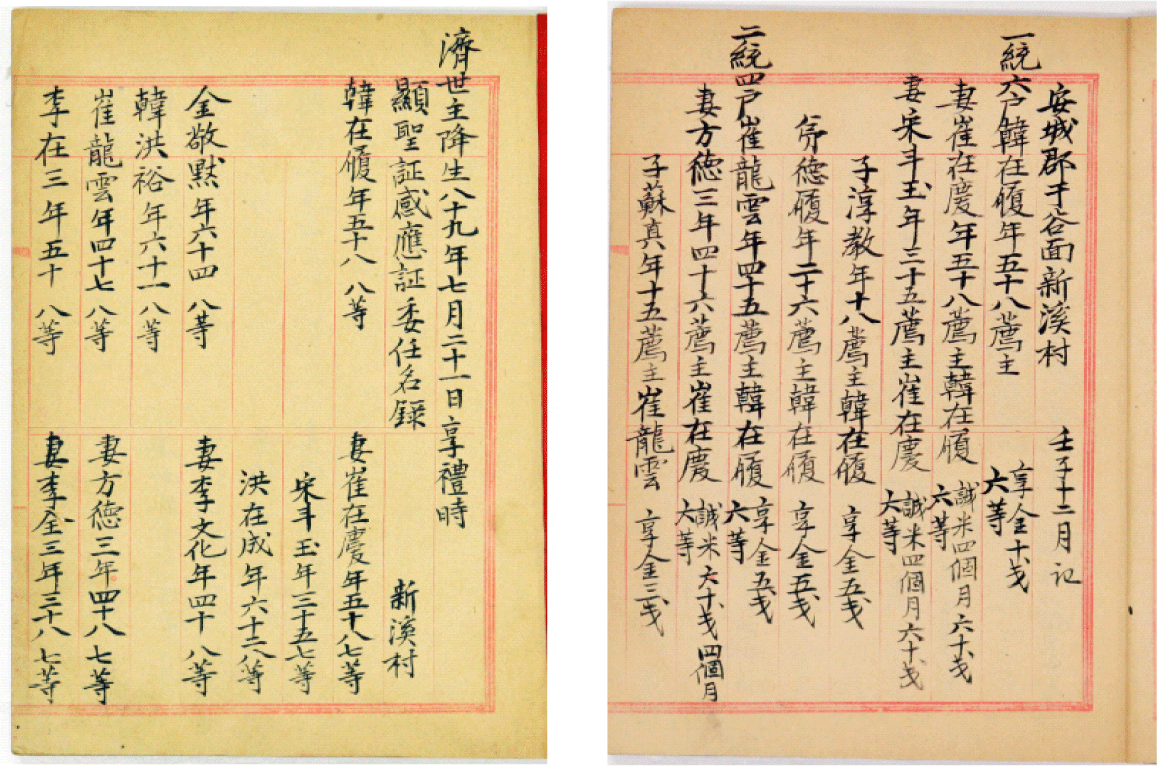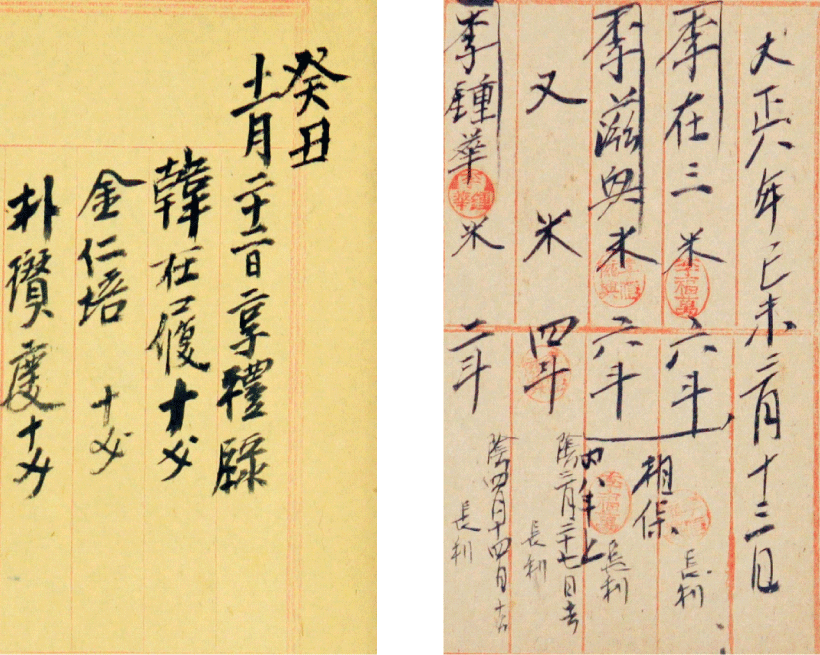Ⅰ. 들어가며
1906년 설립된 시천교(侍天敎)는 천도교(天道敎)로부터 분립하며 생겨난 동학 계통의 신종교로, 주요 인물로는 김연국(金演局, 1857~ 1944), 이용구(李容九, 1868~1912), 송병준(宋秉畯, 1858~1925) 등이 있었다. 초기에 천도교의 교인들을 상당 부분 흡수하며 약 20만 명 이상의 강력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천도교의 대교구가 시천교의 분립 이후 1년 안에 72개에서 23개로 축소될 정도였다는 점, 시천교의 교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받는 1910년대에 접어든 1913년 시점에서도 조선인 신자 수가 천도교에 이은 2위였다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1) 그러나 이후 점차 교단의 분열과 갈등 등을 겪으며 신자들이 이탈했고, 오늘날에는 ‘시천교’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종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쇠락과는 별개로, 초기의 적극적인 활동과 상당한 교인 수 등의 요소들은 시천교가 한국 종교사에서 분명 살펴봐야 할 대상임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이 천도교가 아닌 자신들이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964)로부터 이어지는 종통을 이었음을 주장했다는 점 등은 시천교 연구가 균형 잡힌 동학사 연구에도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동학사 연구는 시천교 혹은 시천교로부터 이어지는 상제교(上帝敎)등의 시천교 계열 종교들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동학과 천도교로 이어지는 교단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천도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천도교 계열과 달리 시천교 계열은 시천교의 친일적 성격 등의 여러 이유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천교의 역사를 개괄한 첫 연구조차 시천교의 역사를 친일진영과 민족진영 사이의 역사로 다룬 김정인의 연구2)였다는 점에서 시천교를 동학사의 차원에서 종교 교단의 특성으로 주목한 연구는 더더욱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박병훈(2016)과 이원섭(2024)의 연구3)가 종교 교단으로서의 시천교의 의례와 교리 등을 밝히는 데 성과를 보였고,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4) 『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祖遺蹟圖志)』5)와 같은 교단 서적이 번역 혹은 역주되어 간행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해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한 단면을 보다 상세히 그려내고자 한다.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 중인 6권의 장부로, 주로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지역의 교당(敎堂)6)에 헌납된 ‘물질적 정성’7)과 교당에서 사람들에게 대출 등을 해준 내역이 기록된 자료다. 자료의 분석을 통해 종교 생활의 의미를 조직적,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네 가지 양상으로 나눠 서술하고, 이를 통해 20세기 초 신종교의 일상적인 풍경과 그 속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안성군 지역 교당은 안성군에 거주하던 교인들 외에도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북부의 여러 지역의 교인들이 의례에 참석하고, 헌성을 바치던 장소였다.8) 이 자료들이 현재까지 학계에 소개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장에서는 각 장부의 명칭과 내용, 기타 특징적인 요소 등을 서술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했을 때 안성 교당에서 어떤 조직적, 사회적 특성이 존재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때 서술은 안성 교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적인 요소, 즉 지역 교당이 어떻게 중앙 교당과 연결되었는지, 헌납 장부에 나타나는 물질 헌성과 수도 실적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안성 교당의 대출이 어떤 것이었으며 형태는 무엇인지, 헌납금과 시천교 교세 변화의 상관성은 존재하는지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를 종합하는 한편 향후의 연구 과제를 논하며 글을 마친다.
Ⅱ. 장부 자료의 구성과 내용
정읍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시천교인들의 장부 자료 6권이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당시 동학을 신앙한 교인들의 물질 헌성이 어떠했는가를 일면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제대로 소개된 적은 없었다. 각 자료의 명칭은 표지의 적힌 제목에 따라 붙여졌는데, 각각 『시천교성미명부(侍天敎誠米名簿)』, 『현성증감응증명록(顯聖証感應証名錄)』, 『향례록(享禮錄)』, 『현성감응식양(顯聖感應式樣)』, 『매월성미기록(每月誠米記錄)』, 『전미조분□(錢米租紛□)』9)이다. 『시천교성미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5권은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에서 DB화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원문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의 내용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소장 정보를 종합하면, 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6종의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시천교성미명부』이다. 유물번호의 ‘이’는 이관된 자료에 붙는 명칭으로, 출처에 대한 기록 확인이 어려워 원소장처는 미상이다. 반면, 나머지 5권의 유물번호는 구입된 자료에 붙는 ‘구’와 함께 나열된 번호가 부여된 것을 볼 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동시에 구입한 자료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원소장처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나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권 자료의 원소장처는 ‘남선리 상제교 대본원’이다. 다만, 이 자료들은 시천교-시천교총부-상제교로 이어지는 김연국계 교단이 아닌, 시천교-시천교본부-시천교중앙종무부로 이어지는 이용구·송병준계 교단에서 기록된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제교 대본원에 소장된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자료는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시천교성미명부』는 구한말부터 1910년대 초까지 기록된 자료로, 구한말의 성미 납입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성미금 내역은 월별로 총액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역 교당에서 정리하는 과정 중에 기록한 자료라기보다는, 중앙의 본교당으로 성미금과 함께 송부한 보고용 자료라고 추정되며 구체적인 성미 납부자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나머지 5권 중, 『전미조분□』을 제외한 4권은 연대기가 연결되며 기록된 내용 항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자료로 생각된다. 『시천교성미명부』와는 달리, 향례금 혹은 성미금을 낸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록 양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수정하고 다시 쓴 흔적들도 남아 있어 깔끔한 느낌이 덜하다. 이는 보고용 자료라기보다는 지역 교당에서 정리해서 보관했던 기록물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된다.
『현성증감응증명록』은 1912~1913년도의 기록으로 거주지, 이름, 나이, 가족 관계, 전도자, 수도 등급 등이 기록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시천교인들의 인적 연결망과 생활 양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지에서 언급된 ‘현성증(顯聖証)’과 ‘감응증(感應証)’은 수도 실적을 인정받은 교인에게 주는 증서의 명칭으로, 남자에게 주는 증서를 ‘현성증’, 여자에게 주는 증서를 ‘감응증’이라고 부른다.10) 교인들의 물질로 드리는 정성 또한 수도실적의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례금, 성미금 명부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11) 수도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으로서 105일 간의 ‘청수기도’를 행한 부인들의 명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향례록』은 1913~1917년도의 기록으로 향례금, 특별헌금, 헌성자 명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에는 성미금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시기 성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미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향례금은 1대 교조 최제우의 강생일(음10월28일)과 수형일(음3월10일), 2대 교조 최시형의 수형일(음6월2일), 해산 대례사 이용구의 환원일(양5월22일) 등의 향례식에서 납부되었고, 함경도 수재의연금, 용담건축헌금, 해산 대례사 영정봉안과 기념비 조성금 등을 납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현성감응식양』은 1918~1921년도의 기록으로 향례금, 성미금 명부가 주를 이룬다. 『현성증감응증명록』과 같이 수도 등급에 대한 별도 표시가 종종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남성은 향례금, 여성은 성미금을 냈다고 표기된다. 다만, 가족 관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미금은 가구 단위로서 납부되었을 것이다.
『매월성미기록』은 1921~1939년도의 기록으로 성미금, 향례금, 특별헌금 이외에 제민사(濟民社) 청약 명부, 교빙(敎憑) 분급 기록, 공함(公函), 주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미금 명부는 월별로 기록되었었는데, 양식이 변경되어 1년 단위로 교인 당 월별 납입액을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성미금을 내는 교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록이 간소화되었다. 한편, 「공함」, 「시중서발(侍中庶發)」라는 공문서가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방 종무부에서 중앙에 헌납금을 송부한 방식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록적 의의가 크다.
『전미조분□』은 1918~1928년도 기록으로 전·미·조 대출 내역, 공조조합 납입금, 차용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기록들과는 성격이 다른 자료로 시천교의 지역 교당에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시천교인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이름이 다수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시천교 지역 교당은 지역에서 일종의 은행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자료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천교인의 헌금 생활과 관련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안성군 중심의 시천교인들의 헌금 생활의 변화 양상, 년도별 향례금과 성미금을 납입한 교인 명부, 함경도 수재의연금, 용담건축헌금, 기념물 조성헌금 등 특별헌금이 실시되었던 실례 등이 확인된다. 물질로 드린 정성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들이 본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둘째, 물질을 드린 정성과 결부된 시천교인들의 수도 실적을 엿볼 수 있다. 향례금, 성미금 등 정기적인 헌금 생활이 수도실적과 연관된다는 점은 공식적인 교단 기록에는 확인되었으나 실제 시천교인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는 실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본 자료는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서 그 가치가 있다. 105일 간의 청수기도를 행한 부인들의 명부, 향례금 및 성미금 명부에 부기되는 수도 등급, 헌성자 명부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귀중한 기록들이다.
셋째, 구한말부터 일제시기 전반에 걸친 연대기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방대한 연대기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내용의 성격상 특정 지역에서 작성된 기록물들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연대기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성군 지역 중심에서 포교가 퍼져나간 양상, 향례금 및 성미금 액수의 변화, 교인 수의 변화, 시천교 교단의 정책적 변화 등을 자료 분석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
넷째, 교단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교당에서 교인들에게 헌납 받은 물질을 중앙의 본교당으로 송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문서 내용, ‘제민사’라는 주식회사의 운영과 주식 분배 내용, 송병준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축문 등은 다른 자료에서 살펴보기 힘든 시천교에 관한 정보들이다. 문헌 자료의 표제로는 쉽게 추측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료 발굴의 의의와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부터는 해당 자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이 어떠했는지 조직·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지역 교당의 조직·사회적 특징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시천교의 교단사의 맥락을 염두에 둘 때, 그 의미가 풍부해진다. 시천교는 천도교와의 분립으로 시작됐다. 천도교에서 출교 당한 일진회원들이 이용구를 중심으로 분립하였고, 1906년 12월 13일 별도로 최제우강생 기념 예식을 거행하며 시천교 설립을 공식화했다.12) 손병희가 천도교 창립을 공언하며 1906년 1월에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로 천도교 내부에서는 일진회 활동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었는데, 결국 한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교단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13) 『시천교성미명부』는 1906년부터 기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천교가 분립될 때부터 시천교인의 성미 헌납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천도교가 시천교 분립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1907년부터 성미제가 실시된 것처럼,14) 시천교 또한 비슷한 시기부터 성미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미제는 천도교 및 시천교 교단이 정비되는 초기 단계부터 교인들의 헌성(獻誠)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시천교성미명부』에 기록된 모든 성미는 금전으로 헌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성미(誠米)’는 각 교인들의 가정에서 매 끼니마다 한 숟갈씩 식구 수대로 떠서 모은 쌀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은 성미를 매월말 자신이 다니는 교당에 헌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쌀로써 모든 헌성을 관리하는 것에는 번거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모은 성미를 팔아 금전으로 헌납했던 것이다.15) 『시천교성미명부』는 교인들이 성미로 헌납하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시행 초기부터 성미대금으로 재정이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천도교에서도 성미를 금전으로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생각된다.16)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민회 조직이었던 일진회가 해산되었고, 교단 조직으로의 일원화를 위해 시천교의 쇄신이 진행되었다. 1912년 「시천교종규」가 반포되면서 종무정 1인과 종무보 1인, 서기 0인이 지역 교당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17) 이는 1913년 송병준계가 김연국계와 분열된 이후 시천교본부를 운영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안성군 지역 교당 종무정으로 한재리(韓在履)가 선임된 것은 이러한 교단사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18) 그는 “덕망이 두터운 인사”로서 열심을 다한 결과로 안성군 우곡면 신계촌에 교당을 새로 지었던 것이다.19) 『현성증감응증명록』, 『향례록』, 『현성감응식양』, 『매월성미기록』이 모두 안성군 종무정이었던 한재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1930년대까지 20여 년간 시천교인으로서 신앙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천교본부에서 발행한 교단 잡지 《지기금지(至氣今至)》 속간 제4호(1920. 11)에 한재리 초상이 실렸을 정도로,20) 그가 교단 중앙의 조직 운영 방식을 따르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재리는 중앙 본교당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종무정이었다. 1914년 10월 3일자로 각지방에 공시된 발기문에는 9월 12일에 큰 수재를 겪은 함경도 교인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 모금 독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21) 한재리는 종무본부의 이러한 안내를 넘겨버리지 않고 안성군 교인들과 함께 모금을 실시했으며, 35명의 교인이 모금에 참여하였고 해당 명부와 금액이 『향례록』에 기록되었다. 또한, 종무본부에서는 1914년 9월 17일자 「공시 제10호」를 통해 양선사(兩先師) 향례를 거행할 때에 교인들로 하여금 향례금을 적극적으로 헌성하여 힘쓰기를 당부하였다.22) 『향례록』의 꼼꼼한 작성은 이와 같은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양선사의 향례뿐만 아니라 해산 대례사 이용구의 환원일 때에도 향례시 향수금을 헌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
| 기념일\년도 | 1927 | 1928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1938 | 1939 |
|---|---|---|---|---|---|---|---|---|---|---|---|---|---|
| 개교기념일 | ○ | ○ | ○ | ○ | ○ | ○ | ○ | ○ | ○ | ||||
| 제세주탄신일 | ○ | ○ | ○ | ○ | ○ | ○ | ○ | ○ | ○ | ○ | |||
| 날짜 미상 | ○ | ○ |
위와 같이 향례 때마다 걷은 교인들의 물질 헌성은 지역 교당에서 취합했다가 정기적으로 본교당으로 송부했다. 이후 1921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해산대례사탄생일(양2월15일)과 개교기념일(양4월5일)에서의 향례금 납부가 확인되고, 1926년까지 다른 예식에서의 향례금 납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1927년부터는 종종 누락되기도 했으나 개교기념일 및 제세주탄신일에만 향례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취합된 물질 헌성은 『매월성미기록』에 필사된 「공함」과 「시중서발」 공문서의 내용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함(公函) 제
제세주강생100년 대정12년
충북도 진성군 종무지부종무장 최기동(崔棋東)
시천교종무본부종무장 유지훈(柳志薰) 도좌(道座)
경계자(敬啓者)은 본 종무지부소 관내에 5월 삭월종(朔月終) 성미대금과 명부(名簿)를 수정 상송(上送)하오니 조량(照亮)하심을 경요(敬要)
시중서발(侍中庶發) 제1호
제세주강생108년 4월 5일
시천교중앙종무위원장 유지훈 도좌
안성군 미양면 개정리 종무위원장 某
본 종무부소 관내 교인의 향금과 성미대금을 수봉(收捧)하야 성안(成案) 한건(一件)을 이와 같이 보고(報告)하오니 조량(趙亮)하심을 경요(景耀)
필사된 두 공문서는 지역 교당에서 향례금 및 성미금을 중앙에 있는 본부로 송부할 때, 관련 내역을 정리한 명부를 함께 보냈음을 나타낸다. 「시중서발」의 4월 5일은 최제우가 종교체험을 통해 득도한 날로, 시천교의 개교기념일이다. 아울러 문서 번호가 1호임을 고려할 때, 1930년대24)에는 개교기념일인 4월 5일이 당해 처음으로 중앙종무부에 향례금 및 성미금을 송부하는 시기였다고 짐작된다.25) 한편, 『현성증감응증명록』, 『향례록』, 『현성감응식양』, 『매월성미기록』 등은 교인별로 헌성한 금액이 기록되었고, 월별 혹은 연도별로는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으로 송부한 명부라기보다는 지부에서 관리한 기록물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는 『시천교성미명부』가 월별 및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고, 2~3개월마다 확인의 의미로 추정되는 시천교 인장이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해당 기록물들의 비교를 통해 종무본부로 송부했던 명부와 종무지부에서 정리했던 기록물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종무본부와 종무지부는 정기적으로 헌성된 물질 및 관련 명부가 오가며 교단 재정의 유통이 연결되어 있었다.
시천교인들의 물질 헌성은 수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다. 『현성증감응정명록』, 『현성감응식양』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천교에서 물질 헌성의 기록은 곧 수도 실적을 증명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1911년 2월 25일에 반포된 「수도규정」은 중앙의 본부에서 교인들의 수도 실적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도 등급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1912년 「종문 제3호」에는 각 지방 교인들의 수도를 독려하는 공문이 반포되었다.26)
하나, 각 지방에 일정한 교당구역 내에 있는 교인은 피차천(彼此薦)을 막론하고 일절 조사해 성적(成籍)하여 1부는 해당 교당에 두고, 1부는 본교당에 보내서 해당 지역 관헌이 조사시에 모호(模糊)한 것이 없도록 하며, 교중 시무에 착오의 폐해가 없게 할 것.
하나, 수도규정에 의거하여 실적이 있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함께 매달 수보(修報)할 것.
하나, 개인 스스로의 정성으로 향수(享需)나 성미대금을 봉상(奉上)할 때에는 일일이 빠지는 것 없이 수보(修報)하여 개개인의 성심을 표현할 것.
하나, 수도규정에 현성증, 감응증의 등수는 1년에 6개월씩을 4개월씩으로 개정하여 4월, 8월, 12월 3차로 실적을 살펴볼 것.27)
본 공문에서 주목할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시천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 생활이 신앙의 목적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남기고자 한 점이다. 일진회를 운영했던 경력은 시천교가 종교 단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치 조직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수도 생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수도 행적에 대한 기록을 함께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정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향수금 및 성미금에 대한 헌성이 수도 실적과 연관되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수도규정」에도 ‘헌성미(獻誠米)’와 ‘양성향례(兩聖享禮)’를 수도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28) 물질 헌성과 수도 실적은 헌성에 대한 기록물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수도규정」에는 매년 2차례씩 수도에 관한 실적평가를 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종문을 통해 3차례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수도를 독려하였다. 특히, 『현성증감응증명록』에 ‘성미대금봉상연명록(誠米代金奉上連名錄)’이라는 제목의 내용 또한 기록되었는데, 이는 인용문의 세 번째 규정에 따라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정리한 명부라고 생각된다.
『현성증감응증명록』에 기록된 1912년 7월 21일 향례시(양선사신원일) 현성증과 감응증을 받기 위한 명단은 앞에서 살펴본 공문과 관련이 있다. 해당 명단은 주소, 이름, 나이, 등급 등의 항목을 넣은 양식으로 기록하였다. ‘한재리 58세 8등, 처 최재경 58세 7등 … ’과 같은 식이다. 1912년 12월에 기록된 명단에는 내용이 더 추가되어 천주(薦主)와 향수금 및 성미금 헌성 액수가 포함되었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명단을 요구하는 본부의 요구에 맞춰서 양식의 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헌성 관련 기록물에는 향수금과 성미금 외 교인들의 수도 실적도 함께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05일 청수부인록’이다. 105일 간 청수기도를 실시한 부인들의 명단을 정리했으며, 그중 영험한 체험이 있었던 경우, 해당 내용을 함께 첨언했다.29) 『현성감응식양』에도 교인들의 향례금 및 성미금 헌성 명단이지만, 교인마다 수도 등급을 부기한 것이 특징이다. 1920년대부터는 수도 등급에 대한 부기가 사라지는데, 시천교 교단의 교세 약화에 따른 수도 실적의 등급별 포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30년대에도 교인들의 수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월성미기록』에 필사된 「시중서발」에 부기된 「추고(追告)」에는 수도 실적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추고(追告)
본 관내 성적과 수도실행인 조사록(調査錄)을 올리오며 황대연(黃大淵), 강대흥(姜大興) 양씨로 종무부 종무원을 선임지지(選任之地)를 복망(伏望)함.
성적(成績)
교회에 특별공로(特別工勞)가 있는 사람 - 한재리(韓在履)
수도과목(修道科目) 실행인 - 특별기도와 삭망기도, 송두옥(宋斗玉)
성심으로 여러 구역내 순회설교(巡回說敎)한 사람 - 유영환(兪榮煥)
수도실행인 - 박천홍(朴千弘)
수도실행인 - 이일례(李一禮)
수도실행인 - 한봉임(韓鳳任)
수도실행인 - 양남규(梁南奎)
수도 실적으로 거론된 것은 교회에 대한 ‘특별공로’, 특별기도와 삭망기도와 같은 ‘치성기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힘을 다한 ‘순회설교’, 그 외에 ‘수도실행’이다. 수도를 실행한 것이 무엇인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수도의 실적으로서 ‘성미금’에 대한 헌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1930년대까지 이어진 교인들의 향례금 및 성미금 헌성은 교단의 재정 운영을 위한 헌납일 뿐만 아니라 수도 생활의 한 측면으로서도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5권의 장부가 시천교인들이 물질로 드린 헌성, 종교적으로 헌납한 내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라면, 2장에서 서술했듯이 『전미조분□』은 대출 내역을 주로 기록한 장부다. 이처럼 상이한 내용을 소재로 한 『전미조분□』은 안성 지역 교당이 종교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교당이 사회와 소통하는 장소였음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교인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종교시설을 통해 대출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장소였음을 드러낸다.
장부는 다른 책들과 같이 이름, 금액,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 주를 이뤄 이를 시천교 교인들의 일반적인 헌납 내역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헌성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책의 구성 방식이 다른 책과 상당히 구분되어, 이 책이 대출 장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책들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식이 다소간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록 시기가 앞부분에 적히고, 그 후 각 교인별로 어떤 교인이, 어떤 이유로 해당 성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개인의 이름과 금액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 아래 한 줄의 하단에 제각기 다른 날짜와, 이와 함께 장리(長利), 오과(五过)라는 서술이 적혀 있다는 점, 이 내용 중 절반 이상의 내용에 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개인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점 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문서가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리와 오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리는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고 이를 가을 추수기에 회수하는 방식의 대출로, 조선시대에 널리 쓰이던 방식의 대출이지만 1년 이자가 5할에 달하는 높은 이율이었다.30) 오과는 과(过)로 적혀 있으나 이것이 장리와 동일한 위치에 적혀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장리와 마찬가지로 대출의 한 종류일 수 있는데, 그 경우 이는 오변(五邊)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오변전(五邊錢)이라는 종류의 대출로, 한 달에 5%의 이자가 매겨지는, 조선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자율이었다.31) 또한, 기록이 시작될 때 날짜가 먼저 나오고, 개별 기록마다 별도의 날짜가 적혀 있음을 고려한다면, 각 줄마다 적힌 날짜는 이 대출을 언제 상환했는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부를 다시 보면, 『전미조분□』의 중심 내용은 지역 교당이 춘궁기 혹은 다른 사유로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후 수금을 위해 기록한 관련 내역들이며, 줄 혹은 개인의 인감은 그 대출들이 환수되었음을 가리키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에 있는 시천교 지역 교당이 단순히 종교 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도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회적 영역이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1927년 자료에 실린 시천교 교규(敎規)에 따르면, 시천교 지역 교당은 헌납받은 금액의 1/3을 중앙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32) 지역 교당은 이 예산을 다시 주민들에게 대출하고 이를 환수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33)
시천교는 1923년부터 설립된 제민사(濟民社)를 통해 금융 및 보증,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 등 일종의 금융신탁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34) 『전미조분□』은 1910년대부터 대출 내역이 기록된 장부라는 점에서 시천교가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대출 내역에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성미금이나 향례금과 같은 물질 헌성 명단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이처럼 물질적 정성을 바치던 이들까지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지 못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헌성을 하려 할 정도로 종교 생활이 개인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 밖에 『전미조분□』의 다른 내용을 보면 안성 지역 교당은 교인들에게 대출 사업을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지역 주민들 혹은 교인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시천교와 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뒷부분에는 지역 교당에서 소유한 농지를 빌려준 후 이용 대금을 환수하거나, 교인의 부모가 죽었을 때 상사(喪事)를 위해 만든 계를 통해 돈을 거두고 이를 다시 지급하고, 기타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만든 공조조합(共助組合)의 조합비를 거두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35) 이는 안성 지역 교당이 지역 교민들의 삶에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삶의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제시한다. 시천교의 교당이라는 공간은 수도 생활의 중심지인 동시에 교인들이 살아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이었으며, 교인들이 종교적인 절실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요구되는 장소였다.
동시에, 안성 지역 교당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중앙 교당, 그리고 식민지 조선이라는 더 큰 영역의 사회와 시천교 교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였다. 상술했듯이 한재리는 함경도에 발생한 수해에 대응하는 중앙의 요구에 따라 안성 지역 교당의 교인들에게 수재를 위한 모금을 했고, 이에 지역 교인들이 화답하여 35인의 모금액이 함경도의 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지역 교인들은 이처럼 지방 교당을 통해 시천교 중앙 교당이라는 보다 큰 조직과 연결되어 한반도의 다른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전미조분□』을 제외한 자료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성 교당의 교세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였는지, 교인의 수와 헌납액수는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천교의 교세는 상술하였듯이 초기에는 천도교를 급속도로 위축시킬 정도로 폭발적이었으나, 기존의 여러 자료들은 시천교의 교세가 1910년대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서술하는데, 그 근거는 대체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저서, 『조선의 유사종교』에 나오는 신종교 신자 수 추이였다.36)
| 년도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
| 교인 수 | 8,080 | 9,099 | 9,284 | 8,194 | 7,815 | 7,289 | 7,815 | 5,611 |
무라야마는 책의 서문에서 교세 수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교단 본부에 방문하기도 했으나 경무국의 출판물과 각 도의 경찰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이 있음을 밝혔다.37) 이 방법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보면 시천교의 전국 교인 수는 1915년까지 증가한 후 이후 빠르게 감소하며 1920년에는 1912년보다 교인 수가 감소했으며, 그 중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교인 수는 191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18년부터 변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것과 같이 두 개 지역의 교인 수의 합이 1912년부터 1917년까지 남녀의 성비까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더욱이 그가 한반도로 건너오는 1919년 이전 자료들은 실제 방문 조사 결과일 수가 없다. 따라서 1910년대 시천교의 교인에 대한 그의 통계는 상당 부분 경찰부나 경무국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 안성 지역 교당에서 실제로 헌납을 한 신자들의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향례식에 헌성을 바친 교인 수는 무라야마가 제시한 교인 추이와는 달리 1914년부터 1920년 증감이 있었지만, 제세주수형일처럼 종합적으로 처음과 끝이 큰 차이가 없거나, 해산대례사환원일과 같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다가 행해지지 않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 기념일\년도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
|---|---|---|---|---|---|---|---|---|
| 제세주수형일 | 115 | 67 | 65 | 66 | 79 | 78 | 56 | 68 |
| 해산대례사환원일 | 63 | 42 | 44 | |||||
| 해월수형일 | 58 | 34 | 7 | 21 | 54 | 42 | 28 | |
| 제세주탄신일 | 110 | 63 | 56 | 71 | 55 | 59 | ||
| 성미금(단위: 錢) 38) | 3,552~? | - | - | - | - | 3,890 | 3,775 | 3,205 |
무라야마가 제시한 시천교 교인 수 변화는 실제 안성군 지역 교당에서 나타난 변화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제강점기의 시천교 조사 결과가 실제로 시천교를 믿던 교인 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그는 각종 신종교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교인 수를 확인하기보다는 각 교단에 신자 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식민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 방법은 교인 명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전부가 교인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명부 기반의 교인 수 통계는 안성군 지역 교당의 장부에서 나타난 신자들, 즉 적극적으로 정성을 드리며 종교 활동을 이어가는 신자 수의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한 종교의 실제적인 교인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통계와는 다른 방식을 통한 연구가 유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방식의 조사로 물질로 헌성한 교인 명부를 활용하였으며,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헌금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는 지표 기반의 조사 결과가 보다 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기에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성미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안성 교당의 성미 금액은 1913년에 6천여 센(錢)으로 추측되며, 1910년대 말에도 3천여 센이었다.39) 1910년대 시기 목수, 농부, 어부 등 46개 직업의 임금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들의 하루 평균 임금은 대체로 직종에 따라 0.4엔에서 1.5엔 사이로 형성되어 있었다.40) 일제강점기 화폐단위에서 1엔은 100센이었으므로, 안성 지역 교당은 1년 성미금으로 대체로 30~40엔을 거두었다고 치환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면 신도 1명이 부담했을 돈은 대체로 많아도 하루 일급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안성 지역 교당의 신자들이 1년 치 성미로 3~4천 센을 모으는 것은 신도들의 경제 상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1)
동시에 시천교에서 성미를 걷은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일제시기에 ‘종교유사단체’ 혹은 ‘유사종교’가 당국에 어떻게 대해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한 지표이기도 하다. 일제시기의 신종교 정책을 다룬 최근 연구에서는 ‘유사종교’라 불리던 시천교 등의 신종교가 1930년대 이전에는 주로 ‘종교’나 ‘종교유사단체’로 불렸고, 1910년대에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탄압이 오히려 다른 유형의 결사보다 적었으며, 풍속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단체는 오히려 유지시켰음을 제시했다.42) 시천교 역시 성미를 걷는 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겪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같은 동학계 신종교였던 천도교에 대한 취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시천교와 달리 천도교는 일제 당국의 탄압을 받아 1911년부터 1914년 사이에 성미제를 금지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천도교 간부 4인이 한일 병합을 반대하는 편지를 각국 영사들에게 보낸 결과 단속되거나, 천도교 교구를 경찰들이 감시하는 등 천도교가 ‘풍속에 해를 끼치는’ 종교로 분류되어 발생한 것일 수 있다.43) 반면 시천교는 독립과 같은 ‘불온한 언동’을 하지 않은 결과 천도교가 성미를 걷지 못하던 1913년에도 성미를 거둬 종교의 유지에 큰 문제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4)
Ⅳ. 나가며
최제우의 생가터와 묘 등이 있는 용담정 인근 토지는 동학계 종교들의 성지로 여겨지는데, 이 토지는 시천교가 1910년대부터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는 이 땅이 천도교로 소유권이 넘어갈 정도로 오늘날 시천교, 혹은 시천교 계열의 종교들은 현재 활동 중인 천진교(天眞敎)를 제외하면 쇠락했다.45) 이러한 종교의 쇠락과 시천교의 친일 행적 등은 시천교에 관한 연구 동력을 불어넣기에 부족했고, 오늘날에야 시천교 연구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구한말부터 시천교가 가졌던 교세와 영향력 등은 한국 신종교사에 분명한 족적으로 남아 있기에 계속해서 시천교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된 시천교 교당 장부를 통해 안성 교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천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그려보고자 했다.
시천교의 안성 교당은 한재리를 종무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신도들에게 향례, 성미 등의 대금을 헌납받았다. 교조와 관련된 시천교 기념일에는 특별 향례를 행했고, 다른 명목이 생기면 별도의 헌금을 걷기도 했다. 시천교인들은 물질 헌성을 수도 실적과 관련시켰는데, 부인들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성미 헌납을 통해 내수도 실적을 인정받았고, 이를 중앙 교당으로 보고하여 수도 등급을 부여받았다. 시천교 지역 교당은 종교 시설이면서도 지역 사람들의 삶과 얽혀 있는 사회 시설이기도 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대출을 알선받거나, 토지를 빌리고, 공조조합을 만드는 등의 사회적인 만남이 이뤄지는 장이었다. 때로는 다른 지역의 시천교인들에게 수해지원금을 보내는 것과 같이 동떨어진 사회와 교류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진 안성군 지역 교당은 지역 주민과 교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장소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안성 교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교인 수를 보여준다. 이는 1910년대 일제의 신종교 정책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종교 인구의 통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인 수와는 괴리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시천교의 안성군 지역 교당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서 다룬 사례는 안성 지역 교당 단일 사례이기에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 교당의 장부나 타 종교의 자료, 그 외에 시천교인의 목소리가 담긴 자전적 기록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면 더욱 진전된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 연구에서 활용했던 6개의 장부 자료는 일제강점기 시기 종교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경제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무라야마는 그의 책에서 유사종교가 어떻게 신도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여서 109개 교구 중 3개 교구만이 천도교를 통해 이익을 얻었음을 서술하며 유사종교의 악영향을 서술했는데,4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뤘던 시천교의 장부는 신도들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물질적 헌성이 크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분석을 더 발전시켜서 향후 일제강점기 시기 신종교와 신도들의 경제적 연관관계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