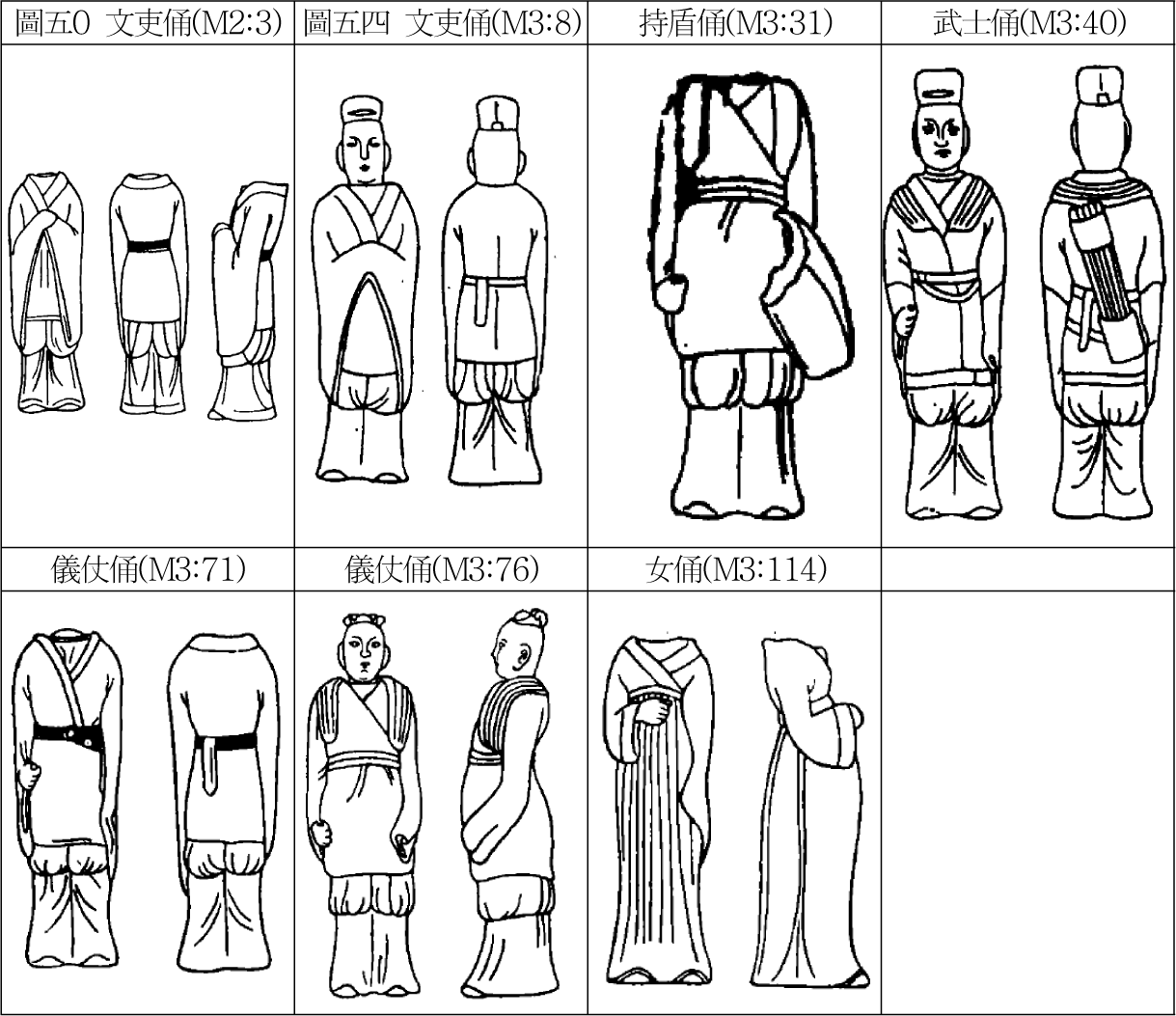Ⅰ. 서론
역사가 승자의 기록임이 화북 통일을 두고 각축을 벌인 동위북제(東魏北齊)와 서위북주(西魏北周)1)의 역사를 다룬 중국 사서의 서술에서도 확인되며 이에 영향을 받은 선행연구에도 후자의 부강과 전자의 부패 및 무능이라는 시각이 반영되었다. 문화적으로 호성재행(胡姓再行)으로 상징되는 선비문화(鮮卑文化)2)를 계승한 서위북주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동위북제가 효문제의 ‘한화 정책’을 계승한 동위북제의 ‘한화(漢化)’를 강조하는 연구가 우세하였다.3) 이와 반대로 동위북제 지배층이 선비문화 또는 서역문화4)를 수용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었다.5) 그러나 양자 모두 출토유물 분석 없이 사료 분석만으로 주장한 한계가 있다. 다행히 동위북제시대 무덤과 고고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동위북제의 선비(鮮卑)와 한인(漢人) 지배층이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받아들였음을 증명하는 유물이 대거 발굴됨에 따라 관념과 주의를 배제한 실증된 분석이 가능해졌다.6)
이러한 발굴 성과를 정리하여 동위북제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수도 업(鄴)을 중심으로 한 경기(京畿) 지역, 태원(太原) 중심의 병주(幷州) 지역, 하북(河北, 冀·定·滄·幽) 지역, 청제(靑齊) 지역의 네 광역지역으로 나누어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를 논한 연구가 있다.7) 이 가운데 고고유물의 발굴 결과 동위북제에서 한문화(漢文化)뿐만 아니라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도 유행했음이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8) 이러한 연구와 궤를 같이하지만, 연구 지역을 세분화하여 동위북제의 수도 업9)과 태원10) 지역의 선비인과 한인(중국인)이 선비문화와 서역문화, 한문화가 공존했음을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북위의 제도를 이어받은 동위북제가 한화(漢化), 즉 중국문화로 동화되었다는 기존의 선입견의 오류를 제거한 연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두 도시가 동위북제의 영토 가운데 두 점에 불과하므로 두 도시의 다문화 공존 현상을 동위북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의 다문화 공존 양상을 검토한 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두 수도’ 업과 태원11) 이외에 공식적인 수도 업의 배후지역인 하북 지방1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북 지방은 북위시대부터 당 전기까지 인구가 밀집되고 농업이 발전했던 지방이었다.13) 문화적으로도 북위시대부터 연·제·조·위(燕齊趙魏), 즉 하북(燕趙魏)과 청제(齊) 지방은 유학이 성행한 지역이었고14) 동위북제시대 하북 지방의 유생들이 정강성(鄭康成)이 주석한 주역(周易)을 배우는 등15) 하북 지방이 유학이 발전하여 한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방이었다.16) 사서의 기록만 보면, 하북 지방이 선비문화와 서역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오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과 태원의 다문화 공존도 문헌 기록과 다른 고고학 발굴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출한 결론이었던 것처럼 하북 지방에서도 사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출토된 한인 관료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17)을 분석하여 다문화가 공존한 수도 업의 문화가 배후 지역인 하북 지방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문헌과 고고학, 미술사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동위북제 하북 지방의 다문화 공존 양상을 검토한다. 2장에서 『북제서』와 『북사』 등의 문헌에서 하북 지방 한인(중국인)이 선비문화(鮮卑文化)와 서역문화의 수용 양상을 검토한다. 3장과 4장에서 고고 발굴 성과를 다룬다. 3장에서 복식과 변발, 긴 역사다리꼴 모양의 관(梯形棺) 등 선비문화를 분석하고 4장에서 서역문화의 양상을 검토한다.
Ⅱ. 사서에 기록된 하북(河北) 한인(漢人)의 선비문화(鮮卑文化)와 서역문화(西域文化) 수용
하북 지방 출신 가운데 발해군(渤海郡) 출신인 고앙(高昻), 고계식(高季式), 고장명(高長命), 안덕군(安德郡) 출신 동방로(東方老)18)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거나 좋아했고19) 범양군(范陽郡) 출신 노용(盧勇)20)과 조군(趙郡) 출신 이경유(李景遺)21)도 무예에 뛰어났다. 이상으로 살펴본 6명의 하북 지방의 한인(漢人)들이 무장(武將)으로 활약하였다. 이들이 무예에 뛰어난 배경에 북위말·동위 시대 내란과 잦은 전쟁 때문이겠지만, 초원문화를 유지한 회삭진(懷朔鎭) 출신의 동위북제 지배층의 상무적(尙武的) 문화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22)
사서에서 이덕림(李德林)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덕림이 북제 멸망 이후 북주 무제 밑에서 벼슬하였다. 북주 무제와 신하들이 운양궁(雲陽宮)에서 선비어(鮮卑語)로 대화한 자리에 그가 참석하였다.23) 이는 그가 선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음을 뜻하며 덕분에 선비어가 사용되는 북주 궁정과 관청에서 벼슬할 수 있었을 것이다.24) 박릉군(博陵郡) 안평현(安平縣) 출신인25) 이덕림이 선비어를 사용한 북제 황실 일족인 임성왕(任城王) 개(湝)와 대화했으므로26) 선비어를 사용하는 임성왕 개가 정주자사에 임명되기 전에 선비어를 배웠을 것이다.27) 수재(秀才)로 발탁되어 전중장군(殿中將軍)에 임명된 이덕림이 북제 문선제(文宣帝) 천보(天保) 말년에 귀향했다가 이후에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28) 그의 동선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고향에서 활동하였다.29) 노사도(盧思道)도 이덕림과 함께 북주군에게 포로가 되었으나, 어정상사(御正上士)에 발탁되었다.30) 북제 궁중과 조정에서 선비어를 사용하였고 이덕림이 선비어를 사용하였음이 사서에 명시되었으므로31) 노사도 역시 선비어에 능했을 것이다.
정주 거록군(鉅鹿郡) 하곡양현(下曲陽縣) 출신32)인 위수(魏收)가 아버지 위자건(魏子建)을 따라 변경에 가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서 무예로 출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형양군(滎陽郡) 출신인 정백조(鄭伯調)가 이를 조롱하자 생각을 바꿔 독서에 전염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33) 변경이 저인(氐人)이 거주하는 동익주를 가리키므로 저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 선비의 상무 풍조의 영향이기도 했다. 문무에 능하였고 북위·동위·북제에서 문재(文才)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위수가 성악(聲樂)을 좋아하고 호무(胡舞)를 잘 추었다.34) ‘성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인지 알 수 없으나 ‘호무’가 비파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소그드의 호등무(胡騰舞)로 추정된다.35) 이는 위수가 중국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호등무로 추정되는 서역 춤(胡舞)과 서역 음악에도 능했고 즐겼음을 뜻한다. 즉 위수가 한문화와 서역문화를 모두 즐기는 다문화 향유자였으며, 선비 유목문화의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능했음을 고려하면 유목민의 초원문화도 받아들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박릉군 안평현 출신이며 음악에 능하였고36) 의술에도 정통했던37) 최계서(崔季舒)가 죽기 전에 선비 모자를 착용하였다.38) 이는 유가의 경학, 사학, 음악, 의술 등 중국 전통문화에 정통한 최계서가 선비복을 착용하여 한문화와 선비문화를 동시에 향유했다는 뜻이다.
선비문화와 서역문화에 정통한 조정(祖珽)과 평감(平鑒)이 하북 북부 지역 출신이었다. 범양군(范陽郡) 주현(遒縣) 출신인 조정39)이 선비어를 잘하여 진원강(陳元康)의 추천으로 고환에게 등용되었다.40) 조정이 선비어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서 고환이 선비어로 말한 36사(事)를 정확히 기억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상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41) 조정이 장광왕(長廣王) 고담(高湛)과 대화를 주고 받은 일화42)에서 훗날 무성제(4대 황제)로 즉위한 고담도 선비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43) 사이어(四夷語), 즉 선비 등 유목민을 포함한 이민족의 언어에 능하고 음률·점·의약에도 능했던44) 조정이 호도유(胡桃油)로 그린 그림을 장광왕 고담(武成帝)에게 바치고 아부하였다. 무성제가 후원에서 조정에게 비파를 타고 화사개(和士開)에게 호무(胡舞)를 추라고 명령하였다.45) 이 일화에서 조정이 서역에서 전래된 비파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유목민과 서역의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호도유로 그린 그림이 아마도 서역 화풍의 그림으로 추정되므로 서역 미술에도 조예가 깊고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아들 조군신(祖君信)도 서·사(書史)를 섭렵하고 잡예(雜藝)에 능하였다.46) 그가 능한 “잡예”에 주목하면 그의 아버지 조정처럼 비파와 서역 음악, 호도유를 이용한 서역풍의 그림 등에도 능숙했을 것이다.47) 조정의 아버지 조영(祖塋)이 북위 효명제 효창 연간에 광평왕(廣平王) 원회(元懷)의 집에서 얻은 옛 옥인(古玉印)이 호탄 국왕이 서진 태강(太康) 연간에 바쳤음을 판독하여 당시 사람들이 많은 분야의 지식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48) 그가 이주조의 낙양 점령 이후 파괴된 조정음악인 아악을 복원하였고 태상(太常)의 직책으로 효무제(孝武帝) 즉위와 관련된 예를 행했고49) 문장이 뛰어나 그의 문집이 당시에 유행하였다.50) 이상의 기록을 보면 조영이 한문화에만 정통한 관료 또는 학자처럼 보인다. 그런데 효무제가 대도(代都)의 구제(舊制)에 따라 즉위 의식을 거행했다는 『북사』51)와 『자치통감』52) 기사를 분석한 녹요동(逯耀東)이 이를 근거로 서교제천(西郊祭天)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북위말까지 제실십성(帝室十姓)의 제천(祭天) 참여가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53) 호삼성(胡三省)이 효무제(孝武帝)가 즉위할 때 다시 ‘이례(夷禮)’를 사용했다고 주석을 달았다.54) 즉 효무제 즉위 과정에서 북위전기 탁발부의 서교제천(西郊祭天)과 즉위의식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55) 조영이 효무제 즉위 의례를 거행하는 책임자(太常)이었으므로 그가 중국 의례가 아닌 탁발부의 의례까지 알고 있다. 또 조영이 북위 효무제 영희(永熙) 연간에 선비인 장손승업과 함께 융(戎)과 화(華), 즉 이민족의 음악과 중국 전통음악을 모두 채용한 궁중음악을 정비하였다.56) 따라서 조영이 탁발부가 거행한 유목민의 제천의례뿐만 아니라 융악(戎樂), 즉 유목민의 초원 음악과 중앙아시아 음악(西域音樂) 모두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57) 조정이 유목민의 음악과 서역음악에 정통한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음악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연군(燕郡) 계현(薊縣) 출신인 평감이 호화(胡畫)를 그려 생계를 유지한 기사58)에서 그가 서역 그림을 잘 그렸음을 알 수 있다.59) 그가 낙양에서 호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한 시점이 북위 효명제 효창 연간이었고 이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북위의 수도 낙양을 왕래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고향인 연군 계현 일대에서 서역 그림을 배웠을 것이다.60) 하북 북부의 유주 범양군 출신인 조정이 주로 중앙정부에서 벼슬하여 수도 업과 태원에서 활동했던 반면 평감이 주로 무군장군(撫軍將軍) 양주자사(襄州刺史),61) 회주자사(懷州刺史),62)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제주자사(齊州刺史) 등 8주의 자사를 역임하고 도관상서령(都官尙書令)을 역임하였다.63) 평감의 관력을 보면 그는 주로 지방에서 활동했으므로 고향에서 서역문화를 즐겼고 서역풍 그림을 배우고 그리는 등 연군 탁현 일대의 문화적 영향과 전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Ⅲ. 선비문화(鮮卑文化)의 양상
본 절에서 하북 지방에서 출토된 도용의 복식을 분석한다. 당시 행정구역으로 정주(定州) 상산군(常山郡) 포오현(蒲吾縣)에 있었던 최앙묘에서 출토된 도용(陶俑) 가운데 시리용(侍吏俑, 6件)이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외모를 지녔고, 선비 모자인 원정풍모(圓頂風帽)를 쓰고, 안에 장삼(長衫), 밖에 관수투의(寬袖套衣)를 입었다.64)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의장용(儀仗俑, 2件)은 소관(小冠)을 쓰고 위에 단수번령능문삼(短袖翻領菱紋衫), 안에 장의(長衣), 허리띠를 착용하였다.65) 그런데 의장용의 사진66)을 보면, 좌임(左衽)의 옷을 입었다. 8건의 도용 가운데 좌임의 선비복이 2건이고, 시리용(6件)이 서역인의 형상일 가능성이 크다. 부장품을 보면, 최앙(崔昂)이 한문화를 유지했지만 주변의 일부 사람들이 의장용으로 상징되는 선비복을 입었으며, 움푹 안으로 들어간 눈과 우뚝 솟은 높은 코를 가진 서역인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은주(殷州) 남조군(南趙郡) 백인현(柏人縣)이 본적이었던 이희종의 무덤에서 선비시리용(鮮卑侍吏俑, 4件), 의장용(20개 가운데 14개가 左衽의 도용), 착수삼(窄袖衫)과 바지를 착용한 고취용(鼓吹俑, 4件), 원령착수좌임포(圓領窄袖左袵袍)의 복역남용(僕役男俑, 1件)과 좌임삼(左衽衫)의 복시녀용(僕侍女俑, 13件), 개마기용(鎧馬騎俑, 3件), 기미고약여용(騎馬鼓樂女俑, 1件), 기미의장용(騎馬儀仗俑, 6件), 기마여용(騎馬女俑, 1件) 등 선비복과 유목민의 풍모를 드러난 도용이 출토되었다.67) 106개의 인물용 가운데 선비복의 대표적인 특징인 좌임을 착용한 도용이 28개(26.4%)였다. 선비복인 착수삼(窄袖衫)과 바지를 착용한 3개의 고취용(鼓吹俑)을 포함하면, 선비복의 특징이 분명한 도용은 32개(30.2%)이다. 그런데 발굴보고서의 복식 설명 중 틀린 부분도 발견된다.
<그림 1>의 시종문용(侍從文俑, 18件)이 좌임이지만 발굴보고서에서 소관을 쓰고, 주홍 혹은 행화색(杏黃色) 옷을 입었다고만 기록하였다.68) 이 누락을 포함하면 좌임의 도용이 46개로 전체 인물도용의 43.4%에 해당한다. 착수의와 바지를 포함한 선비복이 50개이다(47.2%). 따라서 이희종의 무덤에서 출토된 절반에 가까운 인물 도용이 좌임 등 선비복의 색채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Ⅱ식 지순용(持盾俑, 4件)과 시위용(侍衛俑, 10件)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으며(右袒),69) 고취용(4件)이 왼쪽 어깨를 드러냈다(左袒).70) 어깨 등 신체의 일부를 드러낸 옷이 중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옷이며, 인도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보는 주장71)을 받아들인다면, 18개(17%)의 도용이 인도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옷차림을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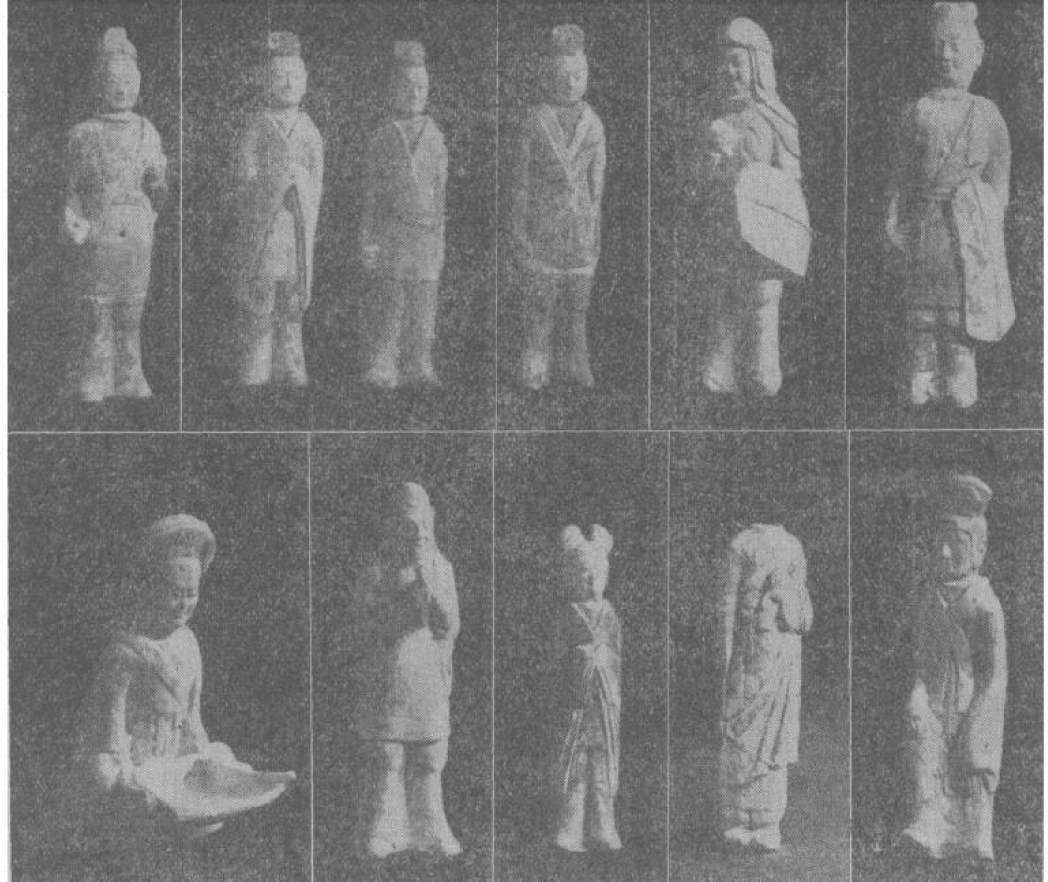
이어서 당시 장락군(長樂郡) 광천현(廣川縣)에 해당하는 현재의 하북성 경현의 고씨묘이다. 천평 4년(537)에 묻힌 고아부부·자녀합장묘(高雅夫婦子女合葬墓)의 61건 인물 도용 가운데 쌍수수직용(雙手垂直俑, 8件)이 소관, 백색홍변관수좌임단삼(白色紅邊寬袖左衽短衫)과 바지, 첨정풍모용(尖頂風帽俑, 6件)이 첨정풍모(尖頂風帽), 착수단삼장고(窄袖短衫長褲)를 각각 착용하였다.73) 14건의 도용이 선비복을 착용했고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고장명묘(高長命墓) 60件의 인물도용 가운데 격고용(擊鼓俑, 13件)이 착수단삼장고를 착용했으며 6건이 소관, 7건이 풍모를 썼다. 호용(胡俑, 3件)이 심목고비의 특징을 지녔다.74) 착수·장고·풍모는 선비복이며 선비복이 11.7%, 소관을 쓴 격고용까지 포함하면 21.7%에 해당한다. 즉 고씨 주변의 일부 사람들이 선비복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발굴보고서와 달리 60점의 인물용 가운데 동위북제 무덤에 가장 유행하는 선비풍의 풍모를 쓴 도용이 한 점도 없다는 주장이 있다. 고장명(高長命)이 고환이 거느린 육진선비과 각을 세운75) 숙부 고앙 아래에서 종군하였다. 고장명도 숙부 고앙처럼 선비 군사와 함께 싸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후에도 선비 복장 혹은 선비인의 도용을 자기 무덤 안에 넣는 것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76) 이 학설이 옳다면, 당시 부장품의 내용과 종류를 무덤 주인이 생전에 결정했거나 유가족이 무덤 주인의 의사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인 무덤마다 선비복 착용 도용의 비율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다음으로 봉씨 무덤이다. 봉씨 무덤에서 발굴된 무용(武俑), 문용(文俑), 투의용(套衣俑), 복용(僕俑), 대사모용(戴紗帽俑), 여용(女俑), 기사용 7종의 인물용 167건 가운데 문용(文俑) 중 일부가 관수좌임의(寬袖左衽衣), 다른 것이 협수절령의(狹袖折領衣)와 양당(裲襠) 등을 착용하였다.77) 좁은 소매(窄袖, 狹袖)와 양당이 선비복의 특징이지만, 조사기의 서술만으로 도용의 선비복 착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대략적으로 봉씨 무덤에서 출토된 도용이 대부분 우임(右衽) 등 한복(漢服)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오교현(당시 발해군 안릉현)의 무덤 4기에서 출토된 도용의 복식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복(漢服)이 광수량당삼피양당피갑(廣袖裲襠衫披裲襠皮甲) 등 7종이며 선비복이 교령좌임광수고습(交領左衽廣袖褲褶) 등 13종이다. 또 종족과 복식에 따라 호족한복(胡族漢服), 호족호복(胡族胡服), 한족호복(漢族胡服), 한족한복(漢族漢服)으로 나뉜다.78) 그러나 좁은 소매(窄袖)가 선비복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착수고습피양당개(窄袖褲褶披裲襠鎧), 착수고습피양당개(窄袖褲褶披裲襠鎧), 교령착수유(交領窄袖襦)도 선비복으로 볼 수 있다. 또 발굴보고서에서 ‘좌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왕민지(王敏之)가 13종의 선비복 가운데 8종이 좌임 복식임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발굴 보고서의 그림을 바탕으로 좌임의 복식을 구별하였다.
발굴보고서에서 좌임의 복식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79) M2의 인물용 23건 가운데 문리용(4件)이, M3의 인물용 164건 가운데 문리용(9件), 지순용(持盾俑, 14件), 무사용(12件), 의장용(18件), 의장용(7件), 여용(2件) 등 62건이 좌임이었다. M2에서 최대 17.4%, M3에서 최대 37.8%의 인물용이 좌임의 선비복을 착용했다고 추산할 수 있다.80) 이밖에 착수·소수(小袖)·고습(褲褶) 등을 포함하면 M2의 Ⅱ식 집사용(執事俑, 1건), Ⅳ식 여용(1건), M3의 풍모용(7건) 등 최소 9건(4.8%)이며, 양자를 합하면 71건(38%)으로 선비복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즉 발해군 안릉현(安陵縣, 현재의 河北省 吳橋縣) 백성들 중 상당수가 선비복을 착용했을 것이다.
현재의 황화현(당시 영주 부양군)에 있는 상문귀묘에서 발굴된 도용이 무사용(2件), 문리용(5件; 風帽, 肥袖長袍), 문리용(4件; 小冠, 廣袖의 長袍), 집순용(4件; 小冠, 短褐, 縛褲), 집사호용(執事胡俑, 5件; 高鼻深目, 尖盔, 短袍, 혁대, 縛褲), 고악용(10件; 小冠, 短袍, 혁대), 여립용(女立俑, 5件; 高髻, 長衫, 窄肩細腰), 여집분용(女執盆俑, 1件; 矮髻), 집기용(執箕俑, 1件), 기타 도용(8件) 등 45건이다.82) 발굴보고서에 좌임과 우임 여부 등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선명하지 못한 사진으로 좌임과 우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도용이 대부분 한복(漢服)을 착용했다고 볼 수 있다.
출토 도용의 복식을 분석하면, 당시 장락군 광천현(廣川縣)에 해당하는 경현의 고씨와 봉씨의 무덤에서 선비복의 도용은 적었다. 고씨 무덤에서 10~20%의 도용이 좌임의 선비복을 착용하였다. 이와 달리 당시 발해군 안릉현(安陵縣)에 해당하는 오교현의 두 무덤에서 약 35.3%의 도용에서 좌임의 선비복이 발견되었다. 반면 당시 영주 부양군에 해당하는 현재의 황화현에서 출토된 상문귀묘에서 선비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세 지역에서 도용의 선비복 착용 비율이 다른데, 이는 세 지역, 혹은 개인별로 선비복으로 상징되는 선비문화의 호불호와 수용 정도가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하북 남쪽인 업의 사주 여양군(黎陽郡)에 해당하는83) 현재의 하남성 복양현에서 이운부부묘(李雲夫婦墓)84)과 이형부부묘(李亨夫婦墓)85)가 발굴되었다. 이운부부묘에서 출토된 도용이 남상(男像)이고 황도주의(黃陶朱衣)와 풍모를 착용하였다.86) 풍모가 유목민의 선비모(鮮卑帽)이지만, 이 무덤에서 선비복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 반면 이형묘의 발굴보고서에 시위용(侍衛俑, 11件; 冠帽, 窄袖交領衫, 雙圓帶, 圓頭鞋), 의장용(35件; 交領寬袖衫, 束帶, 圓頭鞋), 부전복용(負箭箙俑, 21件; 冠帽, 交領寬袖衫, 束帶), 지순용(29件; 翻領短袖衫), 여관용(女官俑, 12件; 元寶型髻, 翻領寬袖衫, 圓頭鞋, 白衣, 束帶), 남관용(男官俑, 24件; 冠帽, 交領寬袖衫, 圓頭鞋), 좌용(坐俑, 2件; 交領長衫)에 좌임이라는 복식 서술이 없으나,87) 그림과 사진을 보면 좌임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호용(8件)만이 원령착수호복(圓領窄袖胡服)을 착용했다고 서술하였다.88) 발굴보고서에서 도용 복식의 ‘좌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왕신성이 기병·전마·지순용, 부전용(負箭俑) 등이 유목민의 특색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여89) 일부 도용이 선비복을 착용했음을 암시하였다. 좌임만을 기준으로 하면 142건, 즉 62.6%가 좌임의 선비복을 착용한 도용이었다. 이밖에 풍모용 A형Ⅰ식(15件; 長圓弧形風帽, 右衽短衫, 白褲, 圓頭鞋),90) A형Ⅱ식(27件; 圓頂風帽, 領口系結套衣, 長袍寬袖),91) B형Ⅰ식(5件; 弧形頂風帽, 窄袖衣, 右衽寬袖衫),92) B형Ⅱ식(1件; 三棱風帽, 圓領窄袖衫)93)에서 ‘우임’이 보이기도 하지만, 풍모, 착수, 원두혜(圓頭鞋) 등 호모(胡帽)와 선비복의 요소가 발견된다. 즉 48건으로 21%에 해당한다. 양자를 합하면, 190건으로 83.7%로 높아진다.
발굴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탁주시박물관(涿州市博物館)에 노예묘(盧譽墓)의 북제채회도용(北齊彩繪陶俑)이 전시되었다. 박물관의 전시안내판에 따르면, 노예묘가 1992년 탁주시(涿州市) 전력국 가속원공지(家屬院工地)에서 발견되었고 주로 채회도용이 발굴되었다. 「노예묘지(盧譽墓誌)」에 따르면 이 무덤에 노예와 아내 범양 조씨(范陽祖氏)가 합장되었다. 노예가 흥화 연간(539~542) 정월에 죽었고 아내 조씨가 하청원년 오월 일일(562. 6. 18) 죽었으며 천통원년 십일월 십구일(565. 12. 26)에 성 동남 7리의 무덤에 묻혔다.94) 전시된 도용이 모두 71개 가운데 안내 푯말이 없지만 망토를 입은 도용(다른 보고서에서는 甲裘俑으로 표기) 11개, 보병용 26개, 문관용 22개, 기마용 1개, 여성용(侍女俑) 6개, 주인 부부로 추정되는 도용 한 쌍 2개가 있다.95)
도용 가운데 서역인의 심목고비 특징을 가진 도용이 11개이며 전체 도용의 15.5%를 차지한다. 이는 당시 범양군 탁현 일대에 서역인이 살았음을 뜻한다. 복식을 보면 좌임의 의복은 남성 도용 5개, 여성 도용 4개이다. 즉 전체의 12.7%의 도용이 선비복의 대표적인 특징인 좌임을 착용하였다. 남성 도용이 군인, 여성 도용이 노예 집안의 하녀로 추정되는데(전시관 푯말에 侍女俑으로 표기), 당시 노예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일부 군인과 하층민들이 좌임의 선비복을 착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망토를 입은 도용의 복식인 망토와 삼각형 모양의 모자가 서역의 복식으로 추정되지만 심목고비의 얼굴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인 또는 선비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역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역의 복식을 착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6국시대부터 오환과 선비의 장속(葬俗)인 제형관(梯形棺)이 하북 지방에서도 발견되었다.96) 당시 은주(殷州) 남조군(南趙郡) 백인현(柏人縣)에 있었던 이희종(李希宗)의 무덤에서 발견된 관이 제형관(梯形棺)이다.97) 제형관이 윗부분이 길고 아래가 짧은 역사다리꼴 모양의 관이고 흉노 또는 선비에서 유행한 관이며 북위평성시대 수도 평성(平城)에서 선비인들의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는 나무로 만든 관이므로98) 이희종이 선비의 장속(葬俗)인 제형관을 사용하여 선비문화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14~2015년 북경시 대흥구(大興區) 황촌진(黃村鎭) 삼합장(三合莊)에서 건설공사 도중 발굴한 동위 한현탁묘(東魏韓顯度墓)에서 소수의 도기 파편과 “원상(元象) 2년 사월 십칠일(539. 5. 21) 낙량(랑)99) 조선현 사람 한현탁(韓顯度)의 명기(銘記)”100)라고 씌어 있는 묘지명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의 관에 장년 남성과 성년 여성의 유골 2구가 있었다. 한현탁묘에서 관의 모양이 주목된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관판(棺板)의 길이가 약 1.8m, 너비가 약 0.42~0.68m, 두께 0.1m이다.101)
<그림 5>에서 관의 모양이 긴 역사다리꼴임을 알 수 있다. 평면이 제형(梯形)인 무덤 형태가 선비 무덤의 특징 중 하나이거나 선비문화의 영향을 받았다.102) 이는 한인 한현탁이 제형관을 비롯한 장례 풍속 등 일부 선비문화를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제형관뿐만 아니라 여성의 말타기에서도 유목문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희종 무덤에서 출토된 여성이 말을 탄 기마고악여용(1件)과 기마여용(1件)104)이 이희종 집안의 여성들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바깥을 돌아다녔고 말타기에 능했던 증거이다. 이는 동위북제시대 여성들이 활발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였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을 것이다.105)
이어서 말 도용이다. 고장명묘에서 도질명기마두(陶質明器馬頭)가 47점 출토되었다.106) 말이 본래 유목민들에게 필수적인 가축인데, 말과 관련된 도용의 다량 출토가 유목민과 관련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장명이 사납고 살인을 좋아하였지만, 전쟁에서 용감했다.107) 따라서 다량의 말 유물 매장이 고장명의 상무 정신과 용맹을 기념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는 발해 고씨의 상무(尙武) 기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건(高乾)·고앙(高昻)·고계식(高季式) 형제가 부곡 천여 인과 말 8백 필을 거느리고 무기를 갖추고 도적과 싸워 대부분 이겼다.108) 고앙(사서에서 ‘高敖曹’이라고도 표기)이 고환의 이주조 공격 때 향인 부곡 3천을 이끌고 출전하여 선비 병사 1천여 인을 더해주겠다는 고환의 말을 거절하고 한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고 할 정도로 투지가 있었다.109) 발해 고씨 이외에 부양군 요안현(饒安縣) 사람 맹화(孟和)가 활과 말을 좋아하였고,110) 안덕군 격현(鬲縣) 사람 동방로(東方老)가 용기와 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111) 요컨대 기주 발해군(고건·고앙·고계식·고장명)과 부양군(맹화), 안덕군(동방로)에 무예에 능하고 용감한 한인들이 있었고 선비문화가 이들의 상무 정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북 지방의 한인(중국인)이 변발을 했음을 보여주는 도용을 살펴보자. 이형부부묘에서 출토된 호용(8件) 가운데 PLZMl∶50附3은 머리는 정부(頂部)에 머리를 묶고 뒷머리에 편발(編髮)을 땋았으며, 원령착수호복(圓領窄袖胡服)을 착용하였다.112) 이는 당시 이형 주변에 변발을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북성 오교현에서 발견된 풍모피의용(風帽被衣俑, 6件)은 사변식 풍모(四辮式風帽)라고 기록되었다.113) 풍모피의용의 사진이나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변(四辮)’이란 표현을 보면 네 갈래로 변발한 도용임을 알 수 있다. 변발이 본래 유목민들의 머리 모양이라 이 도용이 이민족의 모습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선비 등 이민족이 살았음을 밝힌 문헌이 없기 때문에 이민족이라고 보기보다 현지의 한인(중국인)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즉 동위북제 발해군 안릉현에 거주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변발을 했음을 시사한다.
Ⅵ. 서역문화(西域文化)
하북 일대에서 한인의 서역문화를 수용했던 유물이 출토되었다. 하북성 오교현에서 출토된 발해군 출신인 봉씨 가족무덤에서 거꾸로 서 있는 도용과 각종 잡기(雜技), 즉 서역에서 전래된 서커스를 그린 무덤 벽화가 출토되었다.114)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발해군 일대에서 서역의 서커스가 유행했던 증거이다.
이희종묘에서 테오도시우스 2세와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주조된 동로마 금화 3매가 출토되었다. 또 금반지 1매가 무게 11.75g이고 사슴 한 마리가 새겨졌다. 같은 무덤에서 발견된 다른 유금은(鎏金銀) 반지와 다르며, 금화처럼 서방에서 전래되었다.115) 발굴보고서에서 동로마제국의 금화와 금반지가 단순한 부장품이 아니라 이희종의 아내 최씨(崔氏)의 장식품이거나 사용 물건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116) 즉 동로마제국의 금화와 사슴 무늬가 새겨진 금반지가 이희종 일가가 동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얻은 물건이고 최씨가 서방의 이국적인 금화와 금반지를 선호하였다.117)
이희종 부부의 서역 물품 선호가 은완(銀碗)에서도 확인된다. 은완의 완벽(碗壁)에 곡선의 수파문(水波紋)을 새겼고 구연(口緣)의 안쪽 아래에 연주문(連珠紋)을 조각했다. 저부(底部)에 부조풍(浮雕風)으로 6송이의 연화(蓮花)를 조각하였으며, 연화 주위에도 연주문을 2중으로 둘렀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도 소장된 수파문의 은완이 인도 또는 이란 동부에서 4~5세기경 만들어진 기물로 추정된다. 이 두 개의 은완이 양식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제작연대와 제작지도 거의 같으며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 이란 동남부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118) 이희종 부부가 생전에 이 은완을 애용했기 때문에 부부합장묘에 부장되었음이 분명하다. 즉 이들이 서역산 은세공품을 좋아했고 일정 정도 서역문화를 향유했음을 알 수 있다.
서역과의 교역을 상징하는 낙타 도용이 고아묘에서 1건,119) 봉씨 무덤에서 2건,120) 오교현 M2에서 1건,121) M3에서 2건,122) 상문귀묘123)와 동위묘124)에서 1건이 각각 발굴되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낙타를 이용한 교역이 존재했거나, 낙타를 몰고 다니는 서역인들이 교역에 종사했음을 보여준다. 상문귀묘에서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집사호용 5건이 출토되었다.125) 이 지역에도 일부 서역인들이 살았으며, 이들 중 일부가 교역에 종사했을 것이다.
이형묘에서 출토된 타마의 안장 위에 1개 포복(包袱)이 있고 포복 앞 왼쪽에 수관(水罐), 오른쪽에 개가 걸려 있다. 포복 뒤 오른쪽에 수관, 왼쪽에 개가 걸려 있다.126) 낙타가 등에 홍색수낭(紅色垂囊)과 장구(帳構)를 싣고 좌우 주머니 앞 측면에 사물(絲物)·호(壺)·동물 등이 있다.127) 이 밖에 도우(陶牛)와 도모저(陶母猪)와 도모구(陶母狗)도 출토되었다.128) 이러한 유물을 분석하면 이형이 생전에 서역인과 비단을 파는 무역에 직접 종사했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돼지·개 등을 대량으로 길러 육식을 즐겼을 것이다. 다만 한인들이 돼지와 개는 주로 먹었기 때문에 선비의 육식 문화와 다르다.
하북 지방의 서커스 곡예와 서역 상품의 유통, 낙타의 출현은 서역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문귀 무덤에서 출토된 움푹 안으로 들어간 눈과 코가 큰 집사호용(執事胡俑) 5건129)이 이 지역에도 일부 서역인들이 살았거나 교역에 종사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본문에서 하북 지방 한인들의 선비문화와 서역문화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수도 업의 배후 지역인 하북 지역에서 선비문화와 서역문화의 특징이 보이는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선비문화나 서역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 또는 가계가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수용하였다.
사서에서 조영 - 조정 - 조군신, 위수, 평감이 선비 문화나 서역문화를 대폭 수용하였고 이덕림이 선비어를 사용했으며 최계서가 선비복을 착용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사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희종 집안이 고고유물 발굴 결과 선비문화(유목문화)와 서역문화를 가장 많이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조군 이씨(趙郡李氏) 이희종 무덤에서 이희종과 주변 사람들이 유목민의 초원 문화(鮮卑文化) 또는 서역문화를 사용했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예컨대 좌임(左衽) 등 선비복의 특징인 옷이나 오른쪽 어깨나 왼쪽 어깨를 드러낸 옷을 착용한 이희종 무덤의 도용이 이희종 주변에 선비복이나 인도 복식을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증명한다. 동로마의 금화와 금반지가 이희종 일족이 서역 문물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희종이 당대 7성 10가(七姓十家)의 문벌인 조군 이씨(趙郡李氏) 출신이었고 고향인 조국(또는 조군) 백인현(栢仁縣)에 묻혔던130) 사실에 주목하였다. 동위북제의 수도 업의 북쪽에 위치한 조국(또는 조군)에서 유목민의 초원문화와 서역문화, 서역과의 교역을 증명하는 유물이 청제 지역처럼 동위북제시대 선비문화와 서역문화가 수도 업과 태원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되었던 증거였다. 이희종이 조군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고 서·전(書傳)을 섭렵하고 학문의 재능이 있었으며 고환의 대행대낭중(大行臺郎中)과 중외부장사(中外府長史)로 임명되어 고환 밑에서 일했고 흥화(興和) 2년에 40세의 나이로 죽었다.131) 그가 당시 명성이 있어서 특별히 어사(御史)에 뽑힌 40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132) 또 그의 둘째 딸이 고징(고환의 장남)의 아내였다.133) 문헌 기록에서 이희종의 삶에서 선비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고륭지(高隆之)와 고덕정(高德正)이 이희종의 딸 이조아(李祖娥)가 한부인(漢婦人)이라는 이유로 황후 책립을 반대하였으나 양음(楊愔)의 지지 덕분에 결국 문선제의 황후로 책봉되었다.134) 그녀가 낳은 고은(高殷)이 한가 성질(漢家性質)을 지녔다는 이유로 문선제가 태자에서 폐하였다.135) 사서 기록에서 고은의 ‘한가 성질’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조아 역시 아버지 이희종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즉, 사서에서 조군 이씨 이희종 집안이 중국문화를 향유한 전형적인 중국인(한인)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면 이희종 부부가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향유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선비복을 착용하였다.136) 이희종이 속한 조군 이씨가 북제 황실과 10차례 통혼하였다. 조군 이씨 여성 중 6인은 문양제(文襄帝) 고징, 문선제 고양(高洋), 폐제(廢帝) 고은(高殷), 무성제(武成帝) 고담(高湛), 후주 고위(高緯) 등 황제의 후비가 되었고, 4인이 종실 제왕과 결혼하였다. 바꿔 말하면 조군 이씨가 명실상부한 북제의 외척 가문이었다.137) 북제 황실이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향유하고 한문화도 수용했음을 고려하면,138) 한인인 조군 이씨가 북제 황실의 ‘한화(漢化)’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보다 도리어 북제 황실의 선비문화와 서역문화 공존의 영향을 받았음이 이희종묘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실증되었다. 즉 이희종을 대표로 하는 조군 이씨가 북제 황실과 통혼 등 교류를 통해 선비문화 및 서역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들처럼 범양군(范陽郡)의 조영(祖塋) - 조정(祖珽) - 조군신(祖君信) 일족과 평감도 서역문화 또는 유목민의 초원문화를 수용했음이 사서에서 확인된다.
이형(李亨)의 무덤에서 출토된 도용 가운데 142건(62.6%)의 도용이 좌임(左衽)이었고 짧은 소매(窄袖), 바지, 가죽신(靴) 등 선비복의 요소가 들어간 복식의 비율은 더 높았다. 또 물건을 실은 말과 낙타 도용이 이형이 비단의 생산이나 서역인과의 교역에 직접·간접적으로 간여했음을 보여준다. 즉 이형이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깊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발해 고씨와 발해 봉씨, 박릉 최씨(崔昂), 범양 노씨인 노예 등의 무덤에서 무덤 주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비복 또는 서역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선비문화나 서역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아(高雅)와 상문귀의 무덤에서 서역과의 교역을 상징하는 낙타 도용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하북 지방 문벌들의 선비문화나 서역문화의 수용 정도가 개인마다 달랐다. 이형의 친족인 이운(李雲)의 무덤에서 도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선비문화의 특징을 가진 유물이 없었다. 이는 이형과 달리 선비문화나 서역문화를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북경(北京) 서성구(西城區) 왕부창(王府倉)에서 출토된 북제시대 무덤에서 선비문화나 서역문화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139)
요컨대 조영 - 조정 - 조군신 일족과 이희종, 위수, 이형, 평감 등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한인이 있었지만, 한인 지배층 대부분 한문화를 유지하였고 일부 사람들의 무덤에서 낙타 도용이 출토되어 서역과의 교역에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현탁의 무덤에 사용된 제형관이 선비 장례 풍속을 받아들인 한인(중국인)이 존재했던 증거이다. 그리고 좌임 등 선비복을 착용한 도용들이 무덤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북의 토착세력 주변의 군인, 하인 등 일부 하층민들이 선비복을 착용했다고 해석된다. 드물지만 변발의 도용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소수의 한인(漢人)이 변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40) 동위북제의 수도 업 배후지인 하북 지역의 한인(漢人)들은 황실·조정과의 관계에 따라 선비문화와 서역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등 편차가 다양하였다. ‘두 수도’ 업과 태원처럼 선비문화와 서역문화가 하북 지방 전체에 전파되지 않았다. 한인 지배층이 선비어와 제형관, 상무적 기질 등 일부 선비문화와 춤과 음악, 그림 등 서역문화를 주로 수용하고 향유하였다. 반면 한인 하층민들이 선비복 등을 착용하였다. 이처럼 하북 지방 한인들이 계층에 따라 받아들인 선비문화와 서역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랐다. 따라서 한인이 한문화만 묵수하고 외래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민족만 한문화를 수용했다는 한화론이 사실이 아니었다. 문헌과 출토 유물을 종합하면 하북 한인들의 문화적 스펙트럼이 다양했으며 일부가 다문화 공존의 문화적 환경에서 살았다. 이 논문이 동위북제시대 한인(중국인)들이 자기 문화를 유지하고 선비문화나 서역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문헌사학의 한화론(동화론)을 타파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