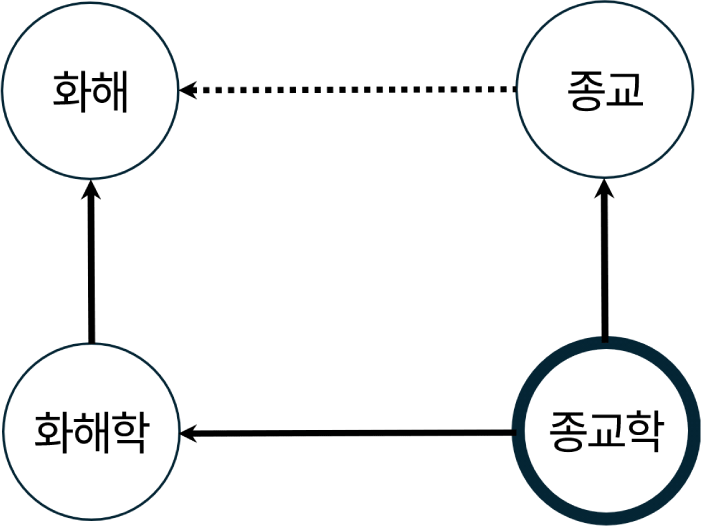연구논문
화해학의 등장과 종교화해학의 가능성
차선근
1
,
*
The Rise of Reconciliation Studies and the Potential of Religious Reconciliation Studies
Seon-keun Cha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
1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Studies, Daejin University
© Copyright 2025,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pr 25, 2025; Revised: Jun 04, 2025; Accepted: Jun 25, 2025
Published Online: Jun 30, 2025
국문요약
오늘날 사회는 심화한 양극화가 만든 혐오와 분열, 갈등과 적대가 일상적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은 점차 학문적 탐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학제 간 학문이 화해학(Reconciliation Studies)이다. 화해학은 화해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갈등·분쟁 당사자들 사이를 연결하여 대화를 촉진하며, 화해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독려함을 목적으로 삼는 학제 간 연구 분야다. 화해학이 말하는 화해는 정의(justice), 용서, 기억, 치유, 정체성 등 다양한 내용과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논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종교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해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종교 전통이 화해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읽으려는 학문적 흐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화해에 있어서 종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역할, 화해의 종교적 차원, 종교와 화해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종교화해학(Religious Reconciliation Studies)’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종교화해학은 종교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의·기억·치유로써 화해를 논의하는 이론과 실천의 틀을 제공하므로, 향후 이 논의의 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Contemporary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 normalization of hatred, division, conflict, and hostility, all of which have been exacerbated by deepening polarization. Increasingly, calls from various sectors to overcome these issues are being transformed into subjects of academic inquiry. Within this context, the interdisciplinary field, Reconciliation Studies, has emerged. Reconciliation Studies seeks to explore the concept of reconciliation, foster dialogue among parties involved in conflicts and disputes, and develop and encourage diverse approaches toward achieving reconciliation. The notion of reconciliation, as understood in this field, encompasses a complex and ongoing process of contestation involving justice, forgiveness, memory, healing, and identity.
Building upon this discourse, this article draws attention to the dual role of religion, which can both incite conflict and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reconciliation. It identifies a growing academic interest in examining the role that religious traditions play in reconciliation processes. Furthermore, it proposes that a body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positive or negative roles of religion in reconciliation, the religious dimensions of reconcili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religion and reconciliation be designated as “Religious Reconciliation Studies.” This emerging field offer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that utilizes religious resources to engage with reconciliation through the lenses of justice, memory, and healing. It is hoped that the scope of this discourse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Keywords: 갈등; 화해; 화해학; 국제화해학회; 종교화해학
Keywords: conflict;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Stud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 Studies; Religious Reconciliation Studies
Ⅰ. 여는 글
2025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는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수도권과 지방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이 뒤를 따랐다(<그림 1>).1)
세대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은 2025년 초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4%에 달한다고 보고했다.2) 갈등이 점증하는 오늘날 사회를 보노라면, ‘분노 사회’나 ‘혐오 사회’라는 말도 과장된 표현은 아닌 듯하다.3) 도를 넘은 경쟁, 취업난, 소득 불평등의 경제적 양극화, 구조조정과 강제 퇴직은 사회를 원망하고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게 한다. 심화한 정치 양극화도 소통과 타협 대신 서로를 박멸 대상으로 여기는 극단적 대립을 부추긴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불안감이 만드는 강한 스트레스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장애인, 성소수자 같은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는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노 표출과 혐오 표현은 익명성이 보장된 디지털 가상 공간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 혐오·미움·분노·갈등·다툼은 줄어들지 않고 더 커지고 있음은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다. 건전한 사회의 지속을 위하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화해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는 주장들도 있다. 화해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화해 강요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화해가 말하는 회복과 복원 상태라는 게 애초에 실재하지 않았다거나, 국가 또는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화해가 강요된다거나, 화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다.4) 그러나 인간 역사에서 화해가 불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며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화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주지해야 할 점은 화해가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보스니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콜롬비아,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여러 나라가 각국의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치유하는 진실·화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지만, 당사자들의 실제 화해까지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5)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화해를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옮겨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화해학(和解學, Reconciliation Studies)’이다. 화해학은 화해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갈등·분쟁 당사자들 사이를 연결하여 대화를 촉진하며, 화해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독려함을 목적으로 삼는 학제 간 연구 분야다.6) 이 논의에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종교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해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화해학의 흐름 속에 종교 전통이 화해 과정에 수행하는 역할을 읽으려는 움직임을 ‘종교화해학(宗敎和解學, Religious Reconciliation Studies)’으로 명명하고, 그 전망과 향후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Ⅱ. 화해 개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화해의 개념부터 정리하자. 『설문해자』에 의하면 ‘화(和:  )’는 ‘서로 응한다’라는 뜻이다. 이 글자의 의미는 ‘구(口)’이고, 발음은 ‘화(禾)’이다.7) ‘구’는 다관(多管) 피리를 입으로 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화롭다, 화합하다, 화목하다, 강화를 맺다, 섞다 등의 뜻이 나왔다고 한다.8) ‘해(解,
)’는 ‘서로 응한다’라는 뜻이다. 이 글자의 의미는 ‘구(口)’이고, 발음은 ‘화(禾)’이다.7) ‘구’는 다관(多管) 피리를 입으로 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화롭다, 화합하다, 화목하다, 강화를 맺다, 섞다 등의 뜻이 나왔다고 한다.8) ‘해(解,  )’는 ‘분해한다’라는 뜻으로서, 칼[刀]로 소의 뿔[牛角]을 분해하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9)
)’는 ‘분해한다’라는 뜻으로서, 칼[刀]로 소의 뿔[牛角]을 분해하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9)
‘화(和)’와 ‘해(解)’를 합친 ‘화해(和解)’라는 용어의 최초 쓰임은 서기전 3세기 무렵 간행된 『순자(荀子)』에서 찾을 수 있다.
凡聽, 威嚴猛厲, 而不好假道人, 則下畏恐而不親, 周閉而不竭. 若是, 則大事殆乎弛, 小事殆乎遂. 和解調通, 好假道人, 而無所凝止之, 則姦言並至, 嘗試之說鋒起, 若是, 則聽大事煩, 是又傷之也.10)
무릇 일을 처리할 때, 자세가 위압적이고 엄격하여 사람을 너그럽게 인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랫사람이 두려워하여 가까이하지 않고 본심을 깊이 숨겨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다면, 큰일이 폐기되고 작은 일도 허사가 된다. 화해조통(和解調通)하여 사람을 인도하기 좋아하고 그 옳지 않은 점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간악한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시험 삼아 떠보자는 논의가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
순자는 올바른 정치제도의 확립 조건 가운데 하나로 군주의 화해조통(和解調通)을 ‘경고’한다. 화해조통을 직역하면 ‘화합하여[和] 풀고[解], 조정하여[調] 통하게 하다[通]’는 뜻인데, 이 문맥에서는 군주가 신하를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모두 들어줌을 의미한다. 순자는 화해조통만 하고 적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온갖 말들이 다 터져 나와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순자』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화해’는 너그럽게 용납하고 무조건 받아준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말이었다. 하지만 화해의 최초 용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화해는 다툼을 그치고 불화하지 않으며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긍정적 뉘앙스로 이해되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11)
서구의 경우를 보자. ‘화해’의 영어 표현은 reconciliation이며, 그 어원은 라틴어 동사인 ‘reconciliare(레콘킬리아레)’이다. ‘re(다시)’, ‘con(함께)’, ‘ciliare(친근해지다)’가 합쳐진 말이므로 ‘다시 함께 친근해지다’라는 게 원래의 뜻이다. ‘re(다시, 되돌아가는)’는 화해 이전에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며, ‘con(함께)’은 양쪽이 화해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했을 때라야 ‘re(다시)’-‘con(함께)’-‘ciliare(친근해지다)’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도 화해는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극복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재정립/정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동아시아든 서구든 간에 화해-reconciliation의 의미는 유사하기에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예를 들어 화해란 ‘갈등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과거를 바르게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치유와 보상을 제공하고, 비폭력적인 관계를 형성 또는 재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12) 또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고, 비폭력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형성된 적대적 감정을 극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당면한 대립적 갈등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소통·협력하려는 태도와 가치’라고 적을 수 있다.13)
그러나 화해는 사전적 정의로만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화해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즉 국가 폭력에 희생된 국민이 국가와 하는 화해인지, 국가와 국가의 분쟁 속에서 상처받은 개인이 추구하는 화해인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관계의 화해인지, 부부 사이의 화해인지, 또는 기독교적인 신과 인간의 화해(구원)인지에 따라 화해는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정치나 경제 혹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화해는 과정·목표·결과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화해’가 다양한 의미로 다르게 주장된다면, 누구나 화해를 추구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각자가 생각하는 화해가 같지 않기에 정작 화해는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정치철학자 앤드류 샤프(Andrew Schaap)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화해 개념이 모호한 것은 화해에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다. 화해 개념을 너무 강하게 설정하면(over-determined)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갈등 당사자들이 규범적인 행동과 태도를 강요받게 되어 화해를 위한 여정은 출발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해 개념이 모호하다면, 화해는 처음부터 논쟁적인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지므로 갈등 당사자들의 화해 협의 시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화해 개념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두어야, 갈등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그들 사이의 화해를 정립해 나갈 수 있다.14)
둘째, 화해의 ‘개념(concept)’과 ‘개념화(conceptions)’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화해 개념이 사전에 등록되어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진정성 문제 또는 화해에 도달하는 방법 등의 여러 논쟁을 통한 다양한 개념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화해는 본질적으로 논쟁적 개념(essentially contestable concept)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15)
정리하자면, 화해를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글자 어원을 활용한 뜻풀이, 용례 등 다양한 접근 경로로 화해를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천과 달성은 매우 어렵다. 그 때문에 현실에서는 피해자·가해자에 따라, 또 지역·역사·정치·외교 등 여러 맥락에 따라 화해의 실천 과정 및 도달 목표를 제각각 다르게 설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진실 규명(truth telling), 사죄(apology), 처벌(punishment), 용서(forgiveness), 사면(amnesty), 배상(reparation), 정의(justice), 기억(memory) 등 다양한 논쟁이 들끓는다.16) 화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Ⅲ. 화해학의 전개
1. 국제화해학회(IARS) 설립과 활동
학자들이 화해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극복하면서 화해를 강조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17) 오랜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의 수장이었던 데즈먼드 투투(Desmond Tutu, 1931~2021) 성공회 대주교는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나는 우리가 있으므로 존재한다’라는 우분투(ubuntu) 철학을 핵심으로 화해를 추진했다. 그러나 우분투 기반 화해가 타당한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번졌다.18) 그 결과 화해를 본격적인 학문 영역으로 밀어 넣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화해 논의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로는 앤드류 샤프 외에, 노르웨이 사회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 1930~2024), 미국 사회윤리학자 허버트 켈만(Herbert C. Kelman, 1927~2022),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 데이비드 블룸필드(David Bloomfield)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의 노력 속에 21세기 접어들면서 화해는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그 주축 기관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모교였던 독일 예나 프리드리히 쉴러 대학의 ‘화해학 예나 센터(JCRS, Jena Center for Reconciliation Studies)’,19) 그리고 일본 와세다대학의 ‘국제 화해학 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Studies)’20)였다.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가해자라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 국가들에서 화해학이 출범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공공정책과 경제학 분야 연구로 이름이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평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카터 스쿨’(The Carter School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21)도 가세하여 화해학을 이끌고 있다.
화해학을 학문 영역으로 이끈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예나 프리드리히 쉴러 대학 신학부의 체계신학/윤리학 석좌교수이자 개신교 신학자인 마틴 라이너(Martin Leiner)였다. 그는 JCRS의 설립자이자, 2020년 독일에서 설립된 국제화해학회(IAR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 Studies)의 초대 회장이었다.
IARS의 출범으로 화해 연구는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학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IARS는 홈페이지에서 학회의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2)
국제화해학회는 2020년에 설립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화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걸쳐 다리를 놓고 대화를 촉진하며,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화해 과정은 갈등에 놓인 관계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폭력의 사이클을 끊어낼 것이며, 경계들 안에서 그리고 경계를 가로질러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ARS 회원들은 화해가 폭력과 적대를 중단시키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이상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회 내에서 협력과 평화 공존이 작동 규범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IARS는 분열된 사회와 개인 간, 집단 간,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화해에 초점을 맞추며, 정의·배상·자비·사과·용서·공유된 정체성을 다루는 복잡하고 이론에 기반하며 토착적이고 신앙에 기반한(faith-based) 접근법을 장려한다. IARS는 화해 과정의 설계와 실행을 장려하기 위해 화해의 상상력과 성취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탐색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며 실천으로 연결한다.
또한 우리는 IARS가 전통적으로 정치·권력·관심·국제법 같은 근본 요소들을 넘어서, 갈등이나 화해를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 인간의 기억·감정·가치·도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권을 지속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에 국가 간 상호 존중에 공헌함으로써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화해학(Reconciliation Studies)을 향한 우리의 집단적 접근이 전 세계의 공동 시민권에 대한 협력적 문화 및 교육 정책의 기초를 만들기 희망한다. 이것은 환경·전염병·빈곤과 같은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만들기 위한 접근 방식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IARS의 취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화해는 갈등에 놓인 관계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면서, 폭력의 사이클을 끊어내고,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ARS의 목표는 화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화해를 향한 다양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지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IARS는 화해 과정의 설계와 실행 촉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탐색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며, 문화/교육 정책의 기초도 만든다. ▲특히, 이론적 근거가 있고, 현지 토착적이며, 신앙에 기반한 접근법을 개발함으로써, 정의·배상·자비·사과·용서·공유된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
IARS는 다음과 같은 7대 목표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23)
-
1) 화해 연구 분야의 다양한 학문 분야 간 전 세계적인 교류 구축
-
2) 실무자, 정치인, 화해 연구자 간의 교류 강화
-
3) 집단 및 개별 연구 프로젝트의 확인 및 촉진
-
4) 화해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료 제공
-
5) 화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학술회의 및 워크숍 조직
-
6) 화해 연구 교육 프로그램(예: 교과과정)의 개발 및 품질 보증
-
7) 공동 이해 달성을 위한 학문 커뮤니티 간 협력 강화
그러니까 ▲연구자/정치인/실무자 모임을 추진하며, ▲다양한 화해 실천과 사례를 수집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학제 간 연구와 협업을 통해 화해 이론을 개발하고, ▲화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IARS는 2020년 9월 첫 콘퍼런스 개최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매년 1회의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표 1.
IARS의 연례 학술대회 현황
| 회차 |
개최 시기 |
개최 장소 |
주요 논제 |
발표 |
| 1 |
2020. 9 |
독일 예나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무력 충돌과 화해 |
11편 |
| 2 |
2021. 8 |
일본 도쿄 |
(도쿄올림픽 기념) 동아시아 화해를 비롯한 여러 화해 이슈 논의 |
20편 |
| 3 |
2022. 8 |
미국 워싱턴 D.C. (온라인) |
화해 이론과 실천 논의, 종교와 화해 분야 논의 시작 |
39편 |
| 4 |
2023. 9 |
르완다 키부에 |
아프리카 지역 화해 문제 |
44편 |
| 5 |
2024. 7 |
이탈리아 아시시 |
화해와 사회정의 |
54편 |
| 6 |
2025. 7 |
한국 서울 |
분열을 넘어 :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 극복 |
|
Download Excel Table
화해학의 전개를 조망하려면, 각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주제들과 그 특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
□ 기간 : 2020. 9. 28~29
-
□ 장소 : Germany, Jena
예나 프리드리히 쉴러 대학 주최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개최된 첫 학술대회 주제는 ‘우크라이나 화해를 위한 국제 온라인 콘퍼런스(The International Web-Conference on Reconciliation Ukraine)’였다. 2022년 2월 전면전 이전인 2020년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가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의 무력 분쟁이 2014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그 결과 17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있었다. IARS는 이 문제를 학문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해로 향하는 길을 논의했다. 첫 콘퍼런스였던 만큼 세션 구분이 없이 발표문의 숫자는 11편에 그쳤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20년 독일 예나 IARS 창립 학술대회 발표문 목록
| 1 |
Tatiana Kyselova : “Dialogue Inclusion Dilemma in Ukraine” 우크라이나의 대화 포용 딜레마 |
| 2 |
Vladislav Dimitrov : “Religion stra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process using European and post-soviet countries experience” 유럽과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의 경험을 이용한 종교 계층화와 화해 과정 |
| 3 |
Olga Filippova and Oleksandra Deineko : “Between ‘Being Home’ and ‘Feeling Home’: Reconciliation Perspective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Ukraine” ‘고향 되기’와 ‘고향 느끼기’의 사이에서 :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의 화해 관점 |
| 4 |
Luis Pena : “Multilayered Conflict. Multilayered Reconciliation Challenges. Reflecting from Colombian Case” 다층적 분쟁, 다층적 화해 도전하기 : 콜롬비아 사례 고찰 |
| 5 |
Binaymin Gurstein : “Psychological Explanation of Conflict” 분쟁의 심리학적 설명 |
| 6 |
Olesya Geraschenko : ““So What do you See?” Visual Art in 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in Ukraine”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화해를 위한 시각 예술 |
| 7 |
Kenneth Sorens : “Psychosynthesis as a Pathway to Peace” 평화로 가는 통로로서의 심리 통합 |
| 8 |
Richard Rubenstein : “Sources of the New Tribalism: Can Human Solidarity Overcome Structural Violence?” 새로운 부족주의의 원천 : 인간의 연대가 구조적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가? |
| 9 |
Daniel Rothbart : “Power, Emotions, and Violent Conflicts” 권력, 감정, 폭력적 갈등 |
| 10 |
Karina Korostelina : “Identity-based approach to reconciliation in Ukraine” 우크라이나의 화해를 위한 정체성 기반 접근법 |
| 11 |
Antti Pentikainen : “How to improve impact of reconciliation processes? Learning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화해 과정의 영향력 제고 방안은? 국제 경험을 통해 배우기 |
Download Excel Table
-
□ 기간 : 2021. 8. 5~7
-
□ 장소 : Japan, Tokyo
IARS의 두 번째 콘퍼런스는 2020 일본 도쿄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개최되었다. COVID-19 대유행으로 1년 연기되어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이 올림픽의 슬로건은 ‘감동으로 하나가 되다(United by Emotion)’였다. IARS는 5개 대륙이 하나로 모인다는 올림픽의 취지에 편승하면서, ‘하나 됨’에 방해되는 이해 부족·분노·불평등·불의·폭력을 극복하고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전쟁·대량학살·잔학행위·강제퇴거·독재·억압, 그리고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평등 예방에 공헌함을 콘퍼런스의 목적으로 밝혔다.
2021 IARS 콘퍼런스부터는 발표문 숫자도 늘어나고 세션 구분도 시작되었다. 6개의 세션에서 총 20편의 발표문이 선보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2021년 일본 도쿄 IARS 학술대회 발표문 목록
|
Panel 1: Historical Origin of Reconciliation
|
| 1 |
Atsuko Kawakita : “Repatriation of German People from Eastern Europe and Reconciliation within Europe” 동유럽의 독일인 송환과 유럽 내 화해 |
| 2 |
Toyomi Asano : “Repatriation of Japanese from Asia and Reconciliation with Asia” 아시아의 일본인 송환과 아시아와의 화해 |
| 3 |
Kijong Nam : “Post-war South Korea and Post-war Japan” 전후 한국과 전후 일본 |
|
Panel 2: Trauma and Healing, From Theory and Practice
|
| 4 |
Francesco Ferrari : “The Irrevocable as Cultural Trauma - and its Impact on Reconciliation” 문화적 트라우마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리고 화해에 미치는 영향 |
| 5 |
Juditta Ben-David : “Scare to approach: Mindfulness and Trauma healing in reconciliation processes” 접근에 대한 두려움 : 마음 챙김과 화해 과정에서 트라우마 치유 |
| 6 |
Luis Pena : “Ecology and Spatiality of Reconciliation: the territorialization of life” 화해의 생태와 공간성 : 생명의 영역화 |
|
Panel 3: Contemporary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lobal context
|
| 7 |
Chung-Hyun Baik : “A Touchstone f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wo Koreas: Mutual Understanding and Embrace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s”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시금석 : 상호이해와 북한이탈 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의 포용 |
| 8 |
Miae Yoo : “Challenges of Psychologic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적 통합의 과제 : 남북 화해를 위한 시사점 |
| 9 |
Satoru Miyamoto : “North Korea’s Worldwide Participation in Wars: Is it possible for North Korea to Reconcile with the US and its ally?” 북한의 전 세계적 전쟁 개입 : 북한이 미국 및 그 동맹국과 화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
|
Panel 4: Reconciliation in Societies with Difficult Past
|
| 10 |
Karina Korostelina : “Identity-based Approach to Reconciliation” 화해를 위한 정체성 기반 접근법 |
| 11 |
Francesco Tamburini : “Through Manipulation: How Algeria Used Monopoly on History to Survive to the Civil War?” 조작을 통해 : 알제리는 역사 독점을 이용하여 내전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나? |
| 12 |
Abderrazak MESSAOUD : “Factors Affecting Moroccan Reconciliation Initiative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모로코의 화해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탐색적 조사 |
| 13 |
Abdulrahman Saeed Alkuwari : “Examine the importance of Turkey’s intervention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team to resolve the Azerbaijan-Armenian conflict”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협상팀의 일원으로서 튀르키예의 개입 중요성 분석 |
|
Panel 5: Role of Institution in Reconciliation
|
| 14 |
Attila Nagy : “Reconciliation as a way to bring justice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EU neighbourhood such as Bosnia and Herzegovina, Kosovo, Ukraine and Nagorno-Karabakh”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우크라이나, 나고르노카라바흐 등 EU 인접 지역에서 미래 세대에 정의를 가져다주는 방안으로서의 화해 |
| 15 |
Vladislav Dimitrov : “Post-Soviet Union church separation and reconciliation: Modern Ukrainian state aspect” 소비에트 연방 이후의 교회 분리와 화해 : 우크라이나의 근대국가 양상 |
| 16 |
Naoko Kumagai : “Reconciliation with Oneself: Process of Self-Reflection in the Controversy over Yasukuni in Postwar Japan” 자신과의 화해 : 전후 일본 야스쿠니 논란에 대한 반성의 과정 |
| 17 |
Engy Mohamed Ibrahim Said : “Identity Between Division and Citizenship: The Role of Institutions in Service Provision in Divided Societies” 분단과 시민성 사이의 정체성 : 분단 사회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의 역할 |
|
Panel 6: Reconciliation over Gender and Youth
|
| 18 |
Abdelghani Mohamed Abdelghani Elhusseini : “Women as Reconciliation Actors: Religion Intersecting Hölderlin Perspective” 화해 행위자로서의 여성들 : 휄덜린 관점을 통한 종교의 교차 |
| 19 |
Charalampos (Babis) Karpouchtsis : “Germany’s foreign policy of reconciliation: the new and unknown case of Greece” 독일의 화해 외교정책 : 그리스의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사례 |
| 20 |
Natia Chankvetadze : “Youth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분쟁에 영향을 받는 사회의 청소년들 |
Download Excel Table
목록에서 확인되듯, 학술대회가 일본에서 열린 만큼 제국주의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야스쿠니 문제, 북한 문제가 갈등-화해 논의에 등장하였다. 아울러 알제리, 모로코, 독일, 동유럽 국가들의 집단 화해와 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생태·여성·청소년 화해, 트라우마 치료의 심리학적 접근도 다루어졌다.
IARS의 세 번째 콘퍼런스는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IARS는 이 콘퍼런스의 취지를 “화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다른 화해 과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며,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기 위해 다리를 놓고, 화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소개했다. 이때 다음과 같은 9개의 논의 영역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화해학의 논의 방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었다.
-
Theories of Reconciliation (화해 이론)
-
Reconciliation in Religion and Philosophy (종교와 철학 속의 화해)
-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화해와 국제정치)
-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분열된 사회의 화해)
-
Reconciliation and Justice (화해와 정의)
-
Indigenous Approaches to Reconciliation (화해를 향한 토착민의 접근법)
-
Reconciliation and Historical Memories (화해와 역사적 기억)
-
A Panel of Activists, Media,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활동가,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원회)
-
Issues of Reconciliation in the US (미국의 화해 문제)
이것은 화해학 분야의 논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체로 보면 이론과 실천으로 나뉘는데, 이론 분야에는 화해 과정과 정의 문제 등을 망라하는 논의가 있고, 실천 분야에는 사회·정치·역사 속 분쟁 해결의 접근 논의가 있다.
2022 콘퍼런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8개 패널이 구성되었고, 39편의 발표문이 선보였다. 주목할 사실은 화해와 종교의 접점을 논하는 ‘종교와 화해(Religion and Reconciliation)’ 패널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이다. 주최 측에서 처음 정했던 9개 화해학 논의 방향에서는 종교가 제외되었으나, 실제 패널 구성에 ‘종교-화해’가 등장했던 것은, 그것도 첫 패널(Panel 1)이었다는 것은 화해에 있어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한다. 이 패널에는 5편의 발표가 있었으니 기독교 화해 3편, 이슬람 화해 1편, 힌두교 화해 1편이었다.
표 4.
2022년 미국 워싱턴 D.C. IARS 학술대회 발표문 목록
|
Panel 1: Religion and Reconciliation
|
| 1 |
Maximilian Schell : “Wrath as a Virtue, Wrath as a Sin? - The Appreciation of Aggressive Emotions as Challenge and Chance of Theological Reconciliation” 미덕으로서의 분노? 죄로서의 분노? : 신학적 화해의 도전과 기회로서 공격적 감정 감상 |
| 2 |
Arunjana Das : “Śakti & Satyagraha: Hindutva and Contested Theologies Around Śakti, Truth, and Nation in Modern India” 샥티와 사티아그라하 : 현대 인도에서 샥티, 진리,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힌두뜨바와 논쟁적인 신학 |
| 3 |
Merisa K. Mattix : “Political Polarization of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Evangelical Churches: A Comparative Case Study within Lake Charles, LA” 진보·보수 복음주의 교회의 정치적 양극화 : LA의 레이크찰스 사례 비교연구 |
| 4 |
Laura Villanueva & Abdelghani El-Husseini : “Women as Reconciliation Actors: The Case of Umm Salama’s Consultation as an Event in the Nascent Reconciliation Processes in Early Islamic Society” 화해의 주체로서의 여성 : 초기 이슬람 사회의 형성기 화해 과정에서 움 살라마의 조언 사건 사례 분석 |
| 5 |
Pedro Salgado : “Growth of Evangelical Protestantism in Brazil: Critical Perspective and Prospects for Reconciliation” 브라질에서의 복음주의 개신교 성장 : 비판적 관점과 화해의 전망 |
|
Panel 2: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
| 6 |
María Cecilia Plested Alvarez & Nathalie Manco-Villa : “Internal Socio-Economic War and Reconciliation in Colombia” 콜롬비아의 내부 사회경제적 갈등과 화해 |
| 7 |
Maria Elisa Pinto-Garcia : “Foster Reconciliation in Colombia” 콜롬비아에서 화해의 증진 |
| 8 |
Mohammed Abu-Nimer : “Educating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Arab and Muslim contexts” 아랍 및 이슬람 사회에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교육 |
| 9 |
Mirza Asmer Beg : “Reconciliation in a Divided India” 분단된 인도의 화해 |
| 10 |
Ofer Gat : “Action Research - Workshop for Ambassadors of Education for Coexistence: Bedouin and Jews Students at the Kaye Academic College of Education in the South Region of Israel” 실천 연구 - 공존을 위한 교육 대사 워크숍 : 이스라엘 남부 지역 카예 교육대학교에서의 베두인 및 유대인 학생들 |
| 11 |
Maria Elisa Pinto-Garcia : “Reconciliation in Colombia” 콜롬비아의 화해 |
|
Panel 3: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 Ukraine
|
| 12 |
Tetiana Kovalova : “Modern Ukrainian Science: Challenges of Wartime” 현대 우크라이나 과학 : 전시 상황에서의 도전 과제 |
| 13 |
Vladislav Dimitrov : “Post-Soviet Union Church Separation and Reconciliation” 소련 이후의 교회 분리와 화해 |
| 14 |
Yegor Kucherenko : “Project: Challenges of Psychological Recovery through Psychosintesis in Wartime” 프로젝트 : 전시 심리학을 통한 심리 회복의 과제 |
|
Panel 4: Theories of Reconciliation
|
| 15 |
Francesco Ferrari : “The Ambiguities of Agency in Reconciliation Processes. Reflections in Dialogue with Hannah Arendt” 화해 과정에서 대리인의 모호성. 한나 아렌트와의 대화에서의 성찰 |
| 16 |
Daniel Rothbart : “The Emotional Life of Conflict Actors: Compassion in Peacebuilding” 갈등 행위자들의 감정적 삶 : 평화 구축에서의 연민 |
| 17 |
Iyad al-Dajani : “Applied Ethics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in the Middle of Conflict” 분쟁 한복판에 놓인 화해 과정에서의 적용 윤리 |
| 18 |
Luis Peña : “Discussing Interdependence from Ecology Epistemologies. An Agenda for the Ecology of Reconciliation” 생태학적 인식론에서의 상호의존성 논의 : 화해 생태학을 위한 의제 |
| 19 |
Martin Leiner : “The Hölderlin Perspective and Refugees: Need for Reconciliation” 휄덜린의 관점과 난민 : 화해의 필요성 |
| 20 |
Davide Tacchini : “Human Mobility, Forced Migration and Reconciliation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인간 이동, 강제 이주와 화해 |
| 21 |
Jonghyuk Chang & Jeongmin Lee : “Collective Memory Under Anticommunist Regime in South Korea” 대한민국 반공 체제 아래 집단기억 |
| 22 |
Güneś Dasli : “Localizing Reconciliation in the Context of Turkey’s Kurdish Conflict” 튀르키예 쿠르드 분쟁 상황에서 화해의 현지화 |
| 23 |
Attila Nagy : “Reconciliation as a Way to Bring Justice to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에 정의를 가져오는 방법으로서의 화해 |
|
Panel 5: Reconciliation, Diversity and Identity
|
| 24 |
Leo Lefebure : “Slavery, Memory and Reconciliation - Historical Efforts Toward Reconciliation by Transforming the Memory of the Georgetown University Community Through Narratives of What Happened to Enslaved Persons” 노예제, 기억, 그리고 화해 - 조지타운 대학교 공동체의 기억 변화로써 화해를 위한 역사적 노력 : 노예가 된 이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
| 25 |
Fanie du Toit : “Why Interdependence as a Key Designator for Reconciliation Makes Increasing Sense in our Changing World. Some Interdisciplinary Reflections” 왜 상호의존성이 화해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점점 더 타당성을 갖는가 : 몇 가지 학제적 성찰 |
| 26 |
Manar Faraj : “The Role of Palestinian Women in “Indigenous” Reconciliation Practices” ‘토착적’ 화해 실천에서 팔레스타인 여성의 역할 |
| 27 |
Zahra’ Langhi : “Women Mediators as Disruptors of Patraichy & Status Quo” 가부장제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여성 중재자의 역할 |
| 28 |
Oakley Thomas Hill : “From Love in Their Sameness to Love in Their Difference: Reconciliation after Deconversion” 동일성 속의 사랑에서 차이 속의 사랑으로 : 신앙 이탈 후의 화해 |
| 29 |
Juditta Ben David : “A Regional Story of Reconciliation. The Backstage of a Mindfulness Program for Refugees, in Arabic Notes of Human Stress and Inspiration” 지역적 화해 이야기 : 난민을 위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의 이면, 아랍어로 기록된 인간의 스트레스와 영감 |
| 30 |
Mathieu Bere : “Fighting Terrorism in the Sahel: Challenges for Dialogue and Reconciliation with Terrorists.” 사헬 지역의 테러 대응 : 테러리스트와의 대화 및 화해를 위한 도전 과제 |
|
Panel 6: Round Table : Cultivating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of Peace-Builders
|
| Q/A |
|
Panel 7: Reconciliation Case Studies
|
| 31 |
LI Enmin : “Post-World War II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Impact of the Hanaoka Settlemen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화해 : 하나오카 합의의 영향 |
| 32 |
Mika An : “How Can Reconciliation Contribute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econciliation” 화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화해에서 시민사회 단체 역할 |
| 33 |
Miae Yoo & Kwang-Ho Kim : “North Korean Refugee Diaspora and the Reconciliation Process: A Case Study of North Korean Church in South Korea” 북한 난민 디아스포라와 화해 과정 : 남한의 북한 교회 사례연구 |
| 34 |
Charalampos (Babis) Karpouchtsis : “Out of the Blue: a German Bird in Crete - Between Revisionism and False Reconciliation - Monuments and Memorials and Their Diverging Roles for GermanGreek Reconciliation” 뜻밖의 사건 : 크레타섬의 독일 새 - 수정주의와 허위 화해 사이에서 - 독일과 그리스의 화해 기념비와 추모비의 상반된 역할 |
| 35 |
Rev. Ralf Häußler :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ructures for Protecting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Defenders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 Steps to Defend, Develop and Heal in Midst of Violence and Exploitation” 토착민과 그들의 인권 수호자 및 환경 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구조 : 폭력과 착취 속에서 방어하고, 발전시키며, 치유하기 위한 방안 |
|
Panel 8: Round Table: Factors of Successful Peace
|
| 36 |
Engy Said : “State Institutions and Identity in Lebanon: Implications for Peacebuilding” 레바논의 국가기관과 정체성 : 평화 구축에 대한 함의 |
| 37 |
Michael Sweigart : “National Leaders as Identity Entrepreneurs in Reconciliation Processes: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bia and Montenegro” 화해 과정에서 정체성 기업가로서의 국가 지도자들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비교 분석 |
| 38 |
Natia Chankvetadze : “How Local Peacebuilders Respond to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War in Ukraine: A Focus on Socio-Psychological Dynamics”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역 평화 구축자들의 대응 : 사회심리적 역학을 중심으로 |
| 39 |
Toni Farris :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Police Neutrality in Conflict and Post Conflict Settings through Analysis of Identity Based Empathetic and Counter Empathetic Responses in Peace Officers”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 경찰의 중립성 중요성 이해 : 평화 유지 경찰의 정체성 기반 공감 및 반공감 반응 분석 |
Download Excel Table
-
□ 기간 : 2023. 8. 1~5
-
□ 장소 : Rwanda, Kibuye
네 번째 IARS 콘퍼런스는 2023년 8월 아프리카 르완다 키부예에서 개최되었다. 르완다는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후투족이 투치족 80만 명을 집단 학살하는 참사가 있었던 나라다. 이웃이 이웃을, 학교 선생이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참혹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로마 가톨릭 사제와 수녀들도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 직접 르완다를 방문해 사과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식민지 후유증으로 분쟁이 많은 아프리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르완다는 20세기 후반 인류 최악의 비극을 겪은 곳으로 손꼽힌다. 참사 발생 후 29년이 흘렀고 상처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곳에서 IARS가 열렸던 일은 비록 그 사회적 파급력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나름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 콘퍼런스에는 르완다 외에도 모잠비크, 짐바브웨, 콩고, 케냐, 우간다,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지역, 동아시아, 네팔, 우크라이나, 키프로스의 화해 논의도 있었다. 작년 콘퍼런스에 등장했던 기독교 관련 화해 논의가 8개로 더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발표문은 44편이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기간 : 2024. 7. 1~4
-
□ 장소 : Italy, Assisi
다섯 번째 IARS 콘퍼런스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화해와 (사회) 정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아시시는 가톨릭의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 of Assisi, 1181/82~1226)가 출생하고 활동한 지역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중세 가톨릭을 지탱했던 성직자로서 이슬람과의 종교 간 대화, 사회적 약자 돌봄, 자연과의 화합을 추구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아시시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시로 유명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2024 콘퍼런스에서는 화해를 위한 심리적 접근, 전쟁과 성폭력 및 종교가 만드는 피해와 분쟁 문제, 이주민 이슈와 사회 불평등의 갈등 문제, 사회적 정의와 기억 및 용서 문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의 여러 사례연구 등 다양한 화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문 숫자는 54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더 늘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
2023년 르완다 키부에 IARS 학술대회 발표문 목록
|
Keynote
|
| 1 |
Martin Leiner & Laura Villanueva : “The Hölderlin model for holistic reconciliation in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에서의 총체적 화해를 위한 횔덜린 모델 |
|
Panel : Reconciliation Studies On and In Africa I
|
| 2 |
Egna Sidumo : “Reconciliation and (ir)reconciliation in Africa: How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influence in Conflict repetitions circles? The Case of Mozambique” 아프리카에서 화해와 (비)화해 : 분쟁 해결 과정이 분쟁 반복의 순환에 미치는 영향 - 모잠비크 사례 연구 |
| 3 |
Emmanuel Ufuoma Tonukari : “Tolerance, conflict management, reconciliation as a roadmap for peace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관용, 분쟁 관리, 화해 |
| 4 |
Susan Wyatt : “Decoloniality in healing centred peace building. A Zimbabwean made, community based, survivor-led trauma healing program” 치유 중심 평화 구축에서의 탈식민성 : 짐바브웨에서 개발된 지역 사회 기반 생존자 주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
|
Panel : Contextual Perspectives at the Great Lakes Region and Beyond
|
| 5 |
Elias Muhongya : “Abstaining from retaliation: a story of restoration Ministry-OEIL in Eastern Congo” 보복 자제하기 : 동부 콩고의 회복 사역(OEIL) 이야기 |
| 6 |
Edouard Ade : “Slave trade: a memory to be reconciled” 노예 거래 : 화해해야 할 기억 |
| 7 |
Vincent Muderhwa : “In search of Peacebuilding in the Great Lakes Sub-Region. Some sources of conflict and ways out for living and working together” 대호수 하위 지역의 평화 구축 모색 : 분쟁의 주요 원인과 공존 및 협력을 위한 해결 방안 |
|
Panel : Justice and Reconciliation in the Great Lakes Region: Congolese and Rwandan Perspectives
|
| 8 |
Adrien Mutabesha : “Neocolonialism and Wounded Memories: The failure of African Protestant Churches in reconciliation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in the province of South Kivu” 신식민주의와 상처받은 기억 : 탈식민 시대 남키부 주에서 아프리카 개신교 교회의 화해 실패 |
| 9 |
Denis Bikesha : “Dispensing criminal justice in Rwanda: the role of Gacaca Courts” 르완다의 형사 사법 집행 : 가차차 법정의 역할 |
| 10 |
Félécite Mugombozi : “Reparation for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A Condition for Effective Reconciliation in Eastern DR Congo”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 동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효과적인 화해를 위한 조건 |
| 11 |
Emmanuel Muhozi : “Exploring the impact and legacy of German and Belgian colonization and reconciliation in Rwanda” 독일과 벨기에 식민 지배의 영향과 유산, 그리고 르완다에서 화해 탐색 |
|
Panel : Reconciliation Studies On and In Africa II
|
| 12 |
Merisa Mattix : “Identity after violence: Reconciliation approaches changing the basis of identity in Mt. Elgon, Kenya” 폭력 이후의 정체성 : 케냐 엘곤산에서 정체성의 기반을 변화시키는 화해 접근법 |
| 13 |
Sung Jin Park : “The ‘Victim Image’ and its Impact on Child Soldier Reintegration: Evidence from Sierra Leone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Campaign” ‘피해자 이미지’와 아동 병사의 재통합에 대한 영향 : 시에라리온의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DDR) 캠페인 사례 분석 |
|
Panel : Contextual Perspectives and Case-Studies II
|
| 14 |
Kijeong Nam : “The Painful Journey of Reconcili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한일 간 화해의 고통스러운 여정 :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
| 15 |
Ramkanta Tiwari : “Timing and reconciliation: Experiences from transitional justice in Nepal” 시기와 화해 : 네팔의 과도기적 정의 경험 |
|
Panel : Theories of Reconciliation
|
| 16 |
Adrian Needs : “Reconciliation as Transition: A view from Dynamical Systems and Forensic Psychology” 전환으로서의 화해 : 동적 시스템과 법의학적 심리학에서 본 관점 |
| 17 |
Davide Tacchini : “The Most Difficult Application of Reconciliations Studies? Reconciliation with Yourself” 화해 연구의 가장 어려운 적용? 자신과의 화해 |
| 18 |
Maximilian Schel : “The dark side of reconcil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nciliation and violence” 화해의 어두운 면? 화해와 폭력의 관계에 관하여 |
|
Panel : Theologies and Church and Church Practices of Reconciliation in Rwanda
|
| 19 |
Jered Kalimba :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from a Rwandan perspective” 르완다 관점의 화해 신학 |
| 20 |
Julie Kandema : “The rol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Rwanda after the 1994 genocide against the Tutsi” 1994년 투치족 집단학살 이후 르완다에서 장로교회의 역할 |
| 21 |
Donata Uwimanimpaye : “Rehabilitation of victims and offenders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in Rwanda” 르완다 화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 |
|
Panel : Theologies of Reconciliation
|
| 22 |
Günter Thomas : “The Risk of Lament” 비탄의 위험 |
| 23 |
Christine Schliesser : “The road to reconciliation: insights from Christian Public Theology” 화해로 가는 길 : 기독교 공공신학의 통찰 |
| 24 |
Jean-Paul Niyigena : “Christian theology: a paradigm of reconciliation” 기독교 신학 : 화해 패러다임 |
|
Panel : Reconciliation in Rwanda I
|
| 25 |
Olivier Munyangsanga : “Opposing the official law for saving lives, similarities between Dietrich Bonhoeffer and ‘Umurinzi w’igihango’ in Rwanda”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식 법에 저항하다 : 디트리히 본회퍼와 르완다의 ‘우무린지 우이기항고’의 유사점 |
| 26 |
Elisée Rutagambwa : “Identity reconstruction in post-genocide Rwanda” 집단학살 이후 르완다에서의 정체성 재구성 |
| 27 |
Jörg Zimmermann : “Listen to each other! - Say what’s on your mind! - Stand in the gap! - Elements of the Confession of Detmold as a contribution to reconciliation in Rwanda and elsewhere” 서로 경청하라! - 마음속 생각을 말하라! - 갈등의 틈을 메우라! - 르완다 및 기타 지역의 화해를 위한 데트몰트 고백의 요소들 |
|
Panel : Contextual and Case Studies III
|
| 28 |
Karina Korostelina : “Reconciliation in the midst of war: Public support for peace and war in the Ukraine” 전쟁 속 화해 :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와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 |
| 29 |
Toyomi Asano : “Split of cultural memories within and between nations: Transitional justice in East Asia” 국내 및 국가 간 문화적 기억의 분열 : 동아시아의 과도기적 정의 |
|
Panel : Ecology and Reconciliation
|
| 30 |
Colleen Alena O’Brien : “The role of the environment in the Colombian conflict and peace process” 콜롬비아 분쟁과 평화 과정에서 환경의 역할 |
| 31 |
Julian Zeyher-Quattlender : “Ecology as dominium terrae or imperium terrae? The Extremism of Normality and its Overcoming as a daily Task. Theological impulses” 지구에 대한 지배인가, 지구의 제국인가? 정상성의 극단성과 그 극복을 위한 일상의 과제 : 신학적 통찰 |
|
Panel : Reconciliation in Rwanda II
|
| 32 |
Narcisse Ntawigenera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omestic violence. Challenge for unity and reconciliation proces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가정 폭력. 통합과 화해 과정에 대한 도전 |
| 33 |
Marcel Uwineza : “Healing a wounded society: Challenges, reconciliation, and hope in Rwanda” 상처받은 사회의 치유 : 르완다의 도전, 화해, 그리고 희망 |
|
International Zoom Panel I
|
| 34 |
Nicolas Koj : “On The Relation between Forgiveness and Justice” 용서와 정의의 관계에 대하여 |
| 35 |
Mika An : “How c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tribute to the reconciliation process ? The role of Korean NGOs in Ethiopian ethnic conflict” 시민사회단체는 화해 과정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 에티오피아 민족 분쟁에서 한국 NGO의 역할 |
| 36 |
Hannah Adamson : “Beyond a binary: Investigating criteria of insiderness in peacebuilding” 이분법을 넘어서 : 평화 구축에서 내면 자성의 기준 탐구 |
| 37 |
Sarah Ohiembor & Kenney Ota : “Peac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and the imperative to erect a legal framework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 인도적 개입, 재건 및 화해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의 필요성 |
|
Reconciliation from Historical Perspective in Japan
|
| 38 |
Shukuko Koyama : “The Potential of Transnational History Education: Attempts at University Teaching Practice in East Asia” 초국가적 역사 교육의 가능성 : 동아시아 대학 교육 실천 시도 |
| 39 |
Hiroko Kawaguchi : “Silent Reconciliation in Northern Uganda: Towards Comparative studies of Transitional Justice in Africa and Asia” 우간다 북부의 조용한 화해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과도기적 정의 비교 연구를 향해서 |
| 40 |
Miyoko Taniguchi : “The Evolution of Japan’s Peace Diplomacy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ase Study of ODA to the Philippines” 탈냉전 시대 일본의 평화 외교 발전 : 필리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례 연구 |
|
International Zoom Panel II
|
| 41 |
Daniel Rothbart : “The social psychology of right-wing extremistgroups: On the salience of collective threat narcissism” 우익 극단주의 집단의 사회심리학 : 집단적 위협 나르시시즘의 두드러진 영향 |
| 42 |
William Saa & Rebecca Nicholson : “What lessons can be learned from comparing the conflicting paradigms of Western funding practices against a Traditional Indigenous Practice of Healing and Restoration?” 서구의 자금 지원 방식과 전통적 토착 치유 및 회복 실천의 상충하는 패러다임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43 |
Gul Gur : “Intersectionality Approach in Understanding Women and Young Girls’ Experiences in Conflict and Responses to Reconciliation: The case of Cyprus Conflict” 교차성 접근법을 통한 분쟁 속 여성과 소녀들의 경험 및 화해에 대한 대응 이해 : 키프로스 분쟁 사례연구 |
| 44 |
Luis Berneth Peña : “Many paths of territorialization of reconciliation in Colombia. Towards a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to reconciliations” 콜롬비아에서 화해의 많은 영토화 경로 : 전략적 관계적 접근을 향하여 |
Download Excel Table
표 6.
2024년 이탈리아 아시시 IARS 학술대회 발표문 목록
|
Panel : Psychological Approaches
|
| 1 |
Adrian Needs : “Implications for Addressing Collective Trauma of Moral Injury and Enactive, Embedded, Embodied and Extended Cognition” 도덕적 손상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 및 작용적·내재적·체화적·확장적 인지 |
| 2 |
Ewelina Berdowicz : “Reconciling the past to appreciate the present. Cognitive restructuring in a religious setting” 현재를 긍정하기 위한 과거의 화해 : 종교적 환경에서의 인지 재구성 |
| 3 |
Rebecca Nicholson : “Moral Injury: Adapting Cross-Cultural Practices to Heal the Psycho-Spiritual Scars of War” 도덕적 손상 : 전쟁으로 인한 정신-영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문화 간 실천의 적용 |
|
Panel : Reconciliation and Social Justice
|
| 4 |
Francesco Valacchi : “The challenge of Social Justice related to migration in an area with scarce economic sources: the Afghan-Pakistani case”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주와 관련된 사회정의의 과제 :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사례 |
| 5 |
Teshome Mengesha Marra : “Unraveling the Performativity of Non-Judicial Institutions in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within a Divided Society in Ethiopia” 분열된 에티오피아 사회에서 사회정의 추구와 비사법적 기관의 수행성 해결하기 |
| 6 |
Philipp Kurowski : “Epistemic injustice as an ethical challenge for Social Justice and Reconciliation” 사회정의와 화해를 위한 윤리적 도전 과제로서의 인식적 불의 |
|
Keynote
|
| 7 |
Cesare Zucconi : “Religions and Reconciliation in a time of War” 전쟁시대의 종교와 화해 |
|
Panel : Memory
|
| 8 |
Sung Jin Park : “Politics of memory in post-conflict societies” 분쟁 후 사회에서 기억의 정치 |
| 9 |
Craig A. Phillips : “Strategic Remembrance and Forgetting: Navigating Memory and Amnesty on the Path toward Reconciliation and Justice” 전략적 기억과 망각하기 : 화해와 정의를 향한 길에서의 기억과 사면 탐색하기 |
| 10 |
Maumita Banerjee : “Curating for Social Justice: Discussing Small Private Museums in Japan” 사회 정의를 위한 전시 기획 : 일본의 소규모 사립 박물관 논의 |
|
Panel : Multicultural and Pluralistic Approaches to Reconciliation
|
| 11 |
Nathalie Manco Villa : “School as a Space for Cultivating Multicultural Societies: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Reconciliation at Institución San Francisco de Asís in Medellín” 다문화사회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학교 : 메데인 소재 산 프란시스코 데 아시스 기관의 화해 인식 탐구 |
| 12 |
Julie Pelletier : “Seeking Reconciliation: Indigenous Faculty’s Lived Experiences” 화해 찾기 : 원주민 교수진의 살아있는 경험 |
| 13 |
Kayla Owens : “Womanism: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Reconciliation” 우머니즘 : 화해를 위한 학제적 접근 |
|
Keynote
|
| 14 |
Pedro Valenzuela : “Rituals in Reconciliation Processes” 화해 과정에서의 의례들 |
|
Panel : Interstate Reconciliation
|
| 15 |
Ekavi Athanassopoulou : “No reconciliation, no stable peace: the case of Greece and Turkey” 화해 없이 안정적 평화도 없다 : 그리스와 터키 사례 |
| 16 |
Gul M. Gur : “Insider Reconcilers in Cyprus: Navigating the Path to Peace in a State of Non-Resolution” 키프로스의 내부 화해 주체들 : 미해결 상태에서 평화로 가는 길 탐색 |
| 17 |
Moonyoung Lee : “Unification Perception of South Koreans in 2023: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 the Era of New Cold War” 2023년 한국인의 통일 인식 : 신냉전 시대 남북 화해의 가능성 |
|
Panel : Reconciliation, Forgiveness and Justice
|
| 18 |
Déogratias Maruhukiro : “Yes, to forgiveness, but first Justice” 용서는 필요하지만, 정의가 먼저다 |
| 19 |
Hans Vium Mikkelsen : “Forgiveness and justice as part of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화해 과정 일부로서의 용서와 정의 |
| 20 |
Francesco Ferrari : “Derrida and the Advent of the Reconciliation Paradigm from the Globalization of Avowal” 데리다와 공개 선언의 세계화로부터 등장한 화해 패러다임 |
|
Panel : Approaches to Reconciliation Studies
|
| 21 |
Davide Tacchini : “The Hölderlin Perspective: a Critical Approach” 회델린 관점 : 비판적 접근 |
| 22 |
Colleen Alena O’Brien : “A linguistic approach to Reconciliation Studies” 화해 연구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
| 23 |
Charles Davidson :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Community-Based Peacemaking” 공동체 기반 평화 구축에서의 용서와 화해 |
|
Case Studies
|
| 24 |
Leyla Radjai : “European efforts in reconciliation through education and developing regional identity” 교육과 지역 정체성 형성을 통한 유럽의 화해 노력 |
| 25 |
Eiichi Nojiri : “Reconciliation after the 20th Century Nation-States: Japanese Case An Approach from Philosophical Psychology” 20세기 국민국가 이후의 화해 : 일본 사례의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 |
| 26 |
Pau Sian Lian : “Analyzing Myanmar’s Post-Revolution Transitional Justice Policy” 미얀마 혁명 이후 과도기적 정의 정책 분석 |
| 27 |
Naoyuki Umemori : “Comparative Analyses of War Responsibility Issues: Japan and Germany”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한 비교 분석 : 일본과 독일 |
|
Panel : Law and Governance
|
| 28 |
Noah Vardi : “Civil Litigation and private law remedies within the paradigm of Reconciliation: the role of restorative justice” 화해 패러다임 내에서의 민사 소송과 사법적 구제 : 회복적 정의의 역할 |
| 29 |
Gloria Yayra A. Ayee : “Reconciling Divided Societies: Leveraging Good Governance for Healing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분열된 사회 화해하기 : 치유와 제도적 변화를 위한 굿 거버넌스 활용 |
| 30 |
Greta Lüking : “Reconciliation between the police and a pluralistic society: Historical-political education as a contribution to a police force of social justice?” 경찰과 다원 사회 간의 화해 : 사회정의를 위한 경찰 조직에 대한 역사-정치 교육의 기여? |
|
Panel : Religion, Spirituality, and Reconciliation
|
| 31 |
Shimo Sraman and Sunil Yadav : “Mindfulness and Its Relation to Self-Transformation and Evolving Inspiration in Society” 마음 챙김과 자기 변혁 및 사회적 영감의 발전 간의 관계 |
| 32 |
Josh Underwood, Ryan Goeckner, and Korie Little Edwards : “Race and Diversity Talk of Racially Diverse Congreg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Reconciliation” 인종적으로 다양한 신앙 공동체에서의 인종 및 다양성 담론과 화해에 대한 함의 |
| 33 |
Claudio Lasperanza : “Decolonization, Reconciliation and Justice.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Louis Massignon and Martin Buber” 탈식민화, 화해, 그리고 정의 : 루이 마시뇽과 마르틴 부버의 서신 교류에 대하여 |
|
Panel : Waseda Panel 1
|
| 34 |
Upalat Korwatanasakul : “Towards a Future of Reconciliation: Understanding Conflict and Injustice in Shaping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among 15-Year-Olds” 화해의 미래를 향하여 : 15세 청소년들의 협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갈등과 불의 이해하기 |
| 35 |
Rita Z. Nazeer-Ikeda : “Reconciling fragments of a nation’s past through education: Examining policies in Singapore” 교육을 통한 국가 과거의 단편적 기억 화해 : 싱가포르의 정책 분석 |
| 36 |
JungHyun Jasmine Ryu : “Conceptualization of Reconciliation within Peace Studies: Narratives and Perspectives in the ASEAN Context” 평화학에서 화해의 개념화 : 아세안 맥락에서의 서사와 관점 |
|
Keynote
|
| 37 |
Karina Korostelina : “Just peace and reconciliation: bridging framework” 정의로운 평화와 화해 : 연결 짓는 틀 |
|
Panel : Great Lakes Region
|
| 38 |
Félicité Mugombozi : “The status of foreigners and the need for reconciliation in the Great Lakes region of Africa”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에서 외국인의 지위와 화해의 필요성 |
| 39 |
Dawid Stelmach : “Analogy between Rwanda and Poland: countries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르완다와 폴란드의 유사성 : 화해 과정에 있는 국가들 |
| 40 |
Concilie Nduwimana and Ishimwe Ange Rosine : “New Media Education Strategies: action research between Burundi and Rwanda” 뉴미디어 교육 전략 : 부룬디와 르완다 간의 실천 연구 |
|
Applied Approaches to Reconciliation
|
| 41 |
Jennifer Van de Pol : “Social Justice: Reconciling through the body” 사회 정의 : 몸을 통한 화해 |
| 42 |
Johanna Amaya-Panche & Malte Jauch : “Building Bridges: Satisfaction with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in Foreign Aid for Peacebuilding” 다리 놓기 :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국 원조에서의 상향식 및 하향식 접근법에 대한 만족도 |
| 43 |
Zeina Barakat and Ralf Wüstenberg : “Reconciliation and justice in South Africa: Comparative aspects from the country cases of Germany and Palestin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화해와 정의 : 독일과 팔레스타인 사례 비교 양상들 |
|
Panel : Reconciliation and Victims
|
| 44 |
Shahira Fakher : “Advancing Reconciliation: Unraveling Collective Trauma, Masculinity,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Jaffa” 화해의 진전 : 야파의 집단적 트라우마, 남성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해명하기 |
| 45 |
Charalampos “Babis” Karpouchtsis : “Sexualized Violence during Conflict: Betwee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Identities” 분쟁 중 성폭력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정체성 사이에서 |
| 46 |
Kijeong Nam : “The realm of reconciliation: between victim-centered approach and political realism” 화해의 영역 : 피해자 중심 접근과 정치적 현실주의 사이에서 |
|
Panel : Transitional Justice,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
|
| 47 |
Megumi Ochi : “The Temporal Scope of Har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Reparation Orders: Trans-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Perspectives” 국제형사재판소의 배상 명령에서 피해의 시간적 범위 : 세대 간 및 초세대적 정의 관점 |
| 48 |
Hiroko Kawaguchi : “Reparative Design for Creating the Future from the Present of Post-war Society: Towards Transformative Justice Linking the Global and the Local” 전후 사회의 현재로부터 미래를 창조하는 회복적 디자인 : 글로벌과 지역을 연결하는 변혁적 정의를 향하여 |
| 49 |
Yukiko Kondo : “Bringing the Female Peasants Back In: Experiences of Violence during the Rwandan Genocide and Thereafter from a Gender Perspective” 농촌 여성들을 역사 속으로 다시 포함하기 : 르완다 제노사이드와 그 이후의 폭력 경험에 대한 젠더적 관점 |
| 50 |
Natsuki Katayama : “Transitional Justice after Rwandan genocide: Dialogue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for compensation ordered by the Gacaca Courts”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후의 과도기 정의 : 가차차 법정이 명령한 배상을 둘러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 |
|
Reconciliation in East Asia
|
| 51 |
Hajime Onozaka : “Reconstruction and Resistance: China YWC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Wartime Assembl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재건과 저항 : 중일전쟁 기간 중국 YWCA와 국제기구의 전쟁 회의 |
| 52 |
Qu Yang : “Propaganda, Literature and Nostalgi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중일전쟁 기간의 프로파간다, 문학, 그리고 향수 |
| 53 |
Kazuo Kuroda :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육 분야 국제 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54 |
Minjeong Lee : “How Colonial Context Shapes Discrepancies in Justice and Reconciliation? The Korean Scholarship as “Responsibility Studies” and Korean Leaderships’ Diverg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ism” 식민지 맥락은 정의와 화해를 어떻게 불일치시키는가? : “책임 연구”로서의 한국 학문과 한국 지도자들의 세계주의에 대한 갈라진 접근들 |
Download Excel Table
-
□ 기간 : 2025. 7. 14~18
-
□ 장소 : Korea, Seoul
여섯 번째 IARS 콘퍼런스는 한국의 서울에서 ‘분열을 넘어 : 우리를 가르는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회 초청 안내문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세기 동안 일본 식민 지배, 남북 분단이 만든 내부 분열,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았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분열을 겪어야 했다. 거기에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 간의 수많은 분열까지 일어났으므로, 한국은 ‘분열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 없이는 화해를 논의할 수 없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으므로 화해는 어렵다. 이에 더 적극적으로 화해를 논의해야 한다.
2025 서울 IARS 콘퍼런스 운영진이 제시한 세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 발표문 목록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2025년 4월 24일 밤까지 서울 IARS 콘퍼런스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다. 콘퍼런스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프로그램 공개는 불가하다고 한다.
7) Journal of Reconciliation Studies
30)지난 IARS의 콘퍼런스 발표문들은 화해 사례연구와 화해 이론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화해 이론은 현실의 복잡한 분쟁을 실제 화해로 유도하기 위한 상황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IARS의 축적된 콘퍼런스 발표문들은 화해학 저널 발간의 토대가 된다. IARS가 제시한 이 저널의 이름은 Journal of Reconciliation Studies이며, 화해학 분야의 최초 학술지로서 2025년 봄 현재 발간 준비 중이라고 한다.
IARS가 저널 발간에서 제시하는 화해학 논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화해 이론 (Theories of Reconciliation)
-
■ 종교와 철학에서 화해 (Reconciliation in Religion and Philosophy)
-
■ 국제정치에서 화해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
■ 분열된 사회에서 화해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
■ 화해와 정의 (Reconciliation and Justice)
-
■ 화해에 대한 토착적 접근들 (Indigenous Approaches to Reconciliation)
-
■ 화해와 역사적 기억 (Reconciliation and Historical Memories)
-
■ 화해와 환경 (Reconciliation and the Environment)
곧 발간될 이 저널의 편집장은 예나 프리드리히 쉴러 대학의 콜린 알레나 오브라이언(Colleen Alena O’Brien)과 다비드 타치니(Davide Tacchini)이며, 프란체스코 페라리(Francesco Ferrari)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7.
IARS 자문위원회 구성
| 독일 |
4명 |
Martin Leiner, Binyamin Gurstein, Luis Pena (예나 프리드리히 쉴러 대학) Maximilian Schell (보훔 루르 대학) |
| 미국 |
3명 |
Karina Korostelina, Daniel Rothbart, Marc Gopin (조지 메이슨 대학) |
| 일본 |
3명 |
Toyomi Asano, Taihei Okada (와세다 대학)
Naoko Kumagai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
| 이스 라엘 |
1명 |
Arie Nadler (텔 아비비 대학) |
| 대만 |
1명 |
許家馨, Jimmy Chia-Shin Hsu (타이베이 국립중앙연구원) |
| 한국 |
1명 |
남기정 (서울대학) |
Download Excel Table
2. 와세다대학의 ‘화해학 총서’
화해학의 현황을 살피게 하는 또 다른 사례는 이웃 일본에 있다. 국제정치학자 아사노 도요미(浅野豊美)와 우메모리 나오유키(梅森直之) 등이 발간한 총 6권 분량의 ‘화해학 총서’가 바로 그것이다. 총서 서문은 일본 화해학의 정의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 총서는 ‘화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가 되고자 한다. ‘분쟁’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숙명인 한, ‘화해’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의 일부다. 그러나 화해는 항상 일정한 역사적·문화적 각인을 지닌 채 나타난다. 그 이유는 분쟁을 발생시키는 사회의 구조가 다양하며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의 불안정 지역을 둘러싼 민족·종교분쟁이 ‘분쟁해결학(紛争解決学)’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면, ‘화해학’은 동아시아에서의 고유한 경험에 내재하면서 현재 세계 각지의 분쟁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화해학은 ‘동아시아발 분쟁해결학(東アジア発の紛争解決学)’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20세기 전후로 침략자이자 식민지 지배자가 된 일본과, 이에 저항한 중국·조선·대만의 역사 인식이 크게 다른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것이다. 과거에서 기인한 이러한 적대적 기억은 경제적·문화적 상호 의존이 심화한 오늘날에도 동아시아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 지금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전쟁과 식민 지배에 관한 ‘기억’과 현대의 경제적 상호작용 및 국제정치라는 ‘현실’의 틈에서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것이다. 화해학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다.
동아시아의 분쟁은 서로 다른 ‘기억’의 단절로써 구성된 ‘국민’ 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을 단일한 규범으로 조정하는 것은 일신교적 전통이 없는 동아시아에서 절대 쉽지 않다.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도, 연대와 발전에 대한 열망이라는 동아시아의 공통 가치관도, 그 자체로 화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동아시아에서 국민별로 형성된 기억과 가치 체제(regime)는 국익과 권력을 둘러싼 국민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얽히면서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분쟁을 일으킨다. 이는 ‘동아시아의 기억 체제(東アジアの記憶レジム)’라고 부를 만한 견고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화해학의 목적은 이러한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역사 공간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화해’의 구상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다.31)
이에 의하면 일본이 추구하는 화해학은 ‘동아시아발 분쟁해결학’이다.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그렇기에 단절되고 적대적인 ‘기억’과 가치 체제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IARS도 화해에 개인 치유를 포함하므로 심리학적 접근까지 강조하는 편이지만, 일본 화해학 총서는 그보다 국가 집단 갈등에 초점을 맞춘 화해 논의를 펼치면서 ‘기억’과 역사 기록 및 해석, 국가 간 관계 변화에 집중하는 역사학적 접근 방법에 더 주목한다. 아울러 전후 보상 문제 등의 정부 차원 화해, 시민사회 운동과 법적 대응, 교육 문제도 이야기한다. 다음 도표는 6권 총서에 실린 총 60편의 글 목록들이다.
표 8.
와세다대학의 ‘화해학 총서’ 목록들
총서① 『和解學の試み――記憶·感情·価値』 (東京: 明石書店, 2021)
(화해학 시도 : 기억·감정·가치)
|
| 1 |
梅森直之 : 方法としての「和解学」—紛争解決学の東アジア的基礎
방법으로서의 ‘화해학’ : 분쟁해결학의 동아시아적 기초 |
| 2 |
劉傑 : 「和解学」に貢献する「新たな歴史学」を目指して
‘화해학’에 공헌하는 ‘새로운 역사학’을 목표로 |
| 3 |
土屋礼子 : アジアにおけるメディアと和解—争と植民地の記憶をめぐって
동아시아의 미디어와 화해 : 전쟁과 식민지의 기억을 둘러싸고 |
| 4 |
波多野澄 : 「政府間和解」の射程と変容—戦後処理から戦後補償へ
‘정부간 화해’의 사정과 변용 : 전후 처리에서 전후 보상 |
| 5 |
外村大 : 歴史問題における和解と市民運動—その研究の課題と展望
역사 문제에 있어서 화해와 시민운동 : 연구 과제와 전망 |
| 6 |
新井立志 : 東アジアにおける紛争解決と歴史和解—中台青年対話を事例として
동아시아의 분쟁 해결과 역사 화해 : 중국과 대만 청년의 대화 사례 |
| 7 |
バラク・クシュナー : ヨーロッパからみた東アジア歴史問題の起
유럽에서 본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기원 |
| 8 |
木宮正史 : 現代日韓関係における和解と正義—日韓関係の事例をふまえて
현대 한일 관계에서 화해와 정의 : 한일 관계 사례를 근거로 |
| 9 |
浅野豊美 : 韓の国民形成の断層と和解学—価値と記憶の融合をめぐる内外政治の共振 한일의 국민 형성의 단층과 화해학 : 동아시아에서 국민 감정의 악화 |
총서② 『アポリアとしての和解と正義――歴史・理論・構想』 (東京: 明石書店, 2023)
(아포리아로서의 화해와 정의 : 역사·이론·구상)
|
| 1 |
野尻英一 : 記憶の器としての<私>、歴史の器としての<国家>を超えて――和解学のための詩学とマイクロポリティクスへ 기억의 그릇으로서의 <나>, 역사의 그릇으로서의 <국가>를 넘어 : 화해학을 위한 시학과 마이크로 폴리틱스 |
| 2 |
小山淑子 : 和解学の教育手法――キャンパス・アジアENGAGEの教育実践からの考察 화해학의 교육 방법 : 캠퍼스 아시아의 교육 관행의 고려 사항 |
| 3 |
土佐弘之 : 和解の困難さについて――南アフリカから東南アジアへ、彷徨う移行期正義との関連で 화해의 어려움에 대하여 : 남아공에서 동남아시아로, 방황하는 이행기 정의 |
| 4 |
上杉勇司 : 「想像の共同体」の和解をめぐる忘却と諦観――歴史の他者化と争点の伏流化 ‘상상된 공동체’의 화해를 둘러싼 망각과 체관 : 역사의 타자화와 쟁점 |
| 5 |
齋藤純一 : 動態的プロセスとしての和解――過去の不正への対応 동태적 프로세스로서의 화해 : 과거의 부정에 대한 대응 |
| 6 |
澤井啓一 : 東アジアにおける歴史と正義――東アジアの歴史生産における似て非なるハビトゥス 동아시아의 역사와 정의 : 동아시아 역사 생산에 있어서 비슷한 아비투스 |
| 7 |
小倉紀蔵 : 歴史認識と非認知的和解――戦後日韓関係に関する一解釈 역사 인식과 비인지적 화해 : 전후 한일관계에 관한 일본의 해석 |
| 8 |
郭峻赫 : 被害者意識の克服――未来志向の謝罪と相互的な非支配 피해의식 극복 : 미래지향적 사죄와 상호적 비지배 |
| 9 |
小林聡明 : 日韓関係に絡みつく感情を解きほぐすために――ある日本人外交官の問いを手がかりとして 한일관계에 얽힌 감정을 풀기 위해 : 한 일본인 외교관의 물음을 단서로 |
| 10 |
松谷基和 : 「神なき」アジアにおける「神ある」和解の試み――戦後日韓キリスト教会間の「和解」運動再考 ‘신 없는’ 아시아에서 ‘신 있는’ 화해 시도 : 전후 한일 기독교회 간 ‘화해’ 운동 |
총서③ 『国家間和解の揺らぎと深化――講和体制から深い和解へ』 (東京: 明石書店, 2022)
(국가간 화해의 흔들림과 심화 : 강화 체제에서 깊은 화해로)
|
| 1 |
波多野澄雄 : 「政府間和解」の陥穽――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体制における「植民地主義」の位相 정부간 화해의 함정 : 샌프란시스코 강화 체제에서의 ‘식민지주의’의 위상 |
| 2 |
神田豊隆 : 日本社会党と戦後和解――村山談話の「社会党らしさ」 일본 사회당과 전후 화해 : 무라야마 담화의 ‘사회당다움’ |
| 3 |
佐藤晋 : 「戦後和解」における政治的要因――日本と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関係を中心に 전후 화해에서 정치적 요인 : 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 관계를 중심으로 |
| 4 |
宮本悟 : 日朝和解の困難――北朝鮮における対日認識 북일 화해의 어려움 : 북한의 대일 인식 |
| 5 |
川喜田敦子 : ドイツ=ポーランド間の「和解」のはじまり――一九六〇年代の教会の動きを中心に 독일-폴란드 간 ‘화해’의 시작 : 1960년대 교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
| 6 |
半澤朝彦 : アイルランドと朝鮮半島――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からの観点 아일랜드와 한반도 : 글로벌 히스토리의 관점 |
| 7 |
東郷和彦 : 和解学のもう一つの視点――ソ連との和解を中心に 화해학의 또 하나의 관점 : 소련과의 화해를 중심으로 |
| 8 |
谷野作太郎 : 東アジアにおける「戦後の和解問題」を考える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후의 화해 문제’를 생각하며 |
총서④ 『和解をめぐる市民運動の取り組み――その意義と課題』 (東京: 明石書店, 2022)
(화해를 둘러싼 시민운동의 대처 : 그 의의와 과제)
|
| 1 |
宮本正明 : 在日朝鮮人帰国協力会と〝日朝友好親善〟活動――「在日朝鮮人帰国協力日本国民使節」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訪問(一九六〇年三月)を中心に
재일 조선인 귀국 협력회와 ‘북일 우호친선’ 활동 : ‘재일 조선인 귀국 협력 일본 국민 사절’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문(1960년 3월)을 중심으로 |
| 2 |
中山大将 : 樺太旧住民の戦後市民運動――戦災・引揚げ・抑留・残留・帰国 사할린 주민의 전후 시민운동 : 전쟁 피해·인양·억류·잔류·귀국 |
| 3 |
松田ヒロ子 : 台湾人元日本兵の戦後補償請求運動(一九七五〜一九九二年)の検討 대만인 일본군의 전후 보상 청구 운동(1975~1992년) 검토 |
| 4 |
坂田美奈子 : 日本の先住民族問題における和解にむけて――アイヌ遺骨地域返還運動を事例として 일본 원주민 문제의 화해를 위해서 : 아이누 유골 반환 운동 사례 |
| 5 |
加藤恵美 : 在日コリアンをめぐる歴史問題と和解――「民族差別と闘う連絡協議会」の運動と「在日旧植民地出身者に関する戦後補償及び人権保障法草案」の検討
재일교포를 둘러싼 역사 문제와 화해 : ‘민족 차별과 투쟁하는 연락 협의회’ 운동과 ‘재일 구 식민지 출신자에 관한 전후 보상 및 인권보장법 초안’ 검토 |
| 6 |
菅野敦志 : 「現実的理想主義者」と二・二八事件をめぐる和解の試み――林宗義・蘇南洲の役割に着目して ‘현실적 이상주의자’와 2·28 사건을 둘러싼 화해 시도 : 임종의·소난주의 역할에 착안하여 |
| 7 |
伊地知紀子 : 済州四・三と市民運動――ローカルな和解実践 제주 4·3사건과 시민 운동 : 지역의 화해 실천 |
| 8 |
岡田泰平 : フィリピン「慰安婦」運動の軌跡――その初期に注目して 필리핀 ‘위안부’ 운동의 궤적 : 그 초기에 주목해서 |
| 9 |
浅野慎一 : 中国残留日本人孤児にみる歴史問題の和解と市民運動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로 보는 역사 문제의 화해와 시민 운동 : 역사 문제로서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 |
총서⑤ 『和解のための新たな歴史学――方法と構想』 (東京: 明石書店, 2022)
(화해를 위한 새로운 역사학 : 방법과 구상)
|
| 1 |
澁谷由里 : 中国前近代史にみる「和解」と「融和」
중국 전근대사로 보는 ‘화해’와 ‘융화’ |
| 2 |
桑原太朗 : 日中の「対支文化事業」言説からみる「和解」の可能性と限界――日中「共同」事業摸索をめぐって
중일의 ‘대지 문화사업’ 언설로 보는 ‘화해’ 가능성과 한계 : 중일 ‘공동’ 사업 모색을 둘러싸고 |
| 3 |
矢野真太郎 : 日中「経済提携」と和解――一九三〇年代における関係改善の模索
중일 ‘경제 제휴’와 화해 : 1930년대의 관계 개선 모색 |
| 4 |
城山英巳 : 天皇訪中と「和解」の限界――封じ込められた反日感情
일왕 방중과 ‘화해’의 한계 : 봉쇄된 반일감정 |
| 5 |
タンシンマンコン・パッタジット : 和解における「人間」の回復――タイ中・タイ日関係にみる「妥協」の役割
화해에서 ‘인간’의 회복 : 중국·태국 관계로 보는 ‘타협’의 역할 |
| 6 |
黄斌 : 李大釗と日中間の知識人ネットワーク――清末民初日中間の知の交流と和解に対する一考察
리다자오와 중일 간 지식인 네트워크 : 청말 민국 초기, 중일 간 지식의 교류와 화해에 대한 한 고찰 |
| 7 |
駱豊 : 日中歴史家ネットワークの端緒――一九五〇年代から国交回復までの歴史家交流を中心に
중일 역사가 네트워크의 단서 : 1950년대부터 국교회복까지의 역사가 교류 |
| 8 |
野口真広 : 歴史教育政策に関する日本と台湾との比較――日本の学習指導要領と台湾の国民基本教育課程綱要を中心に
역사 교육 정책에 관한 일본과 대만의 비교 :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대만의 국민기본교육과정 강요를 중심으로 |
| 9 |
鄭成 : 心の和解における中国の歴史家の役割――中露両国を事例として
마음의 화해에 있어서 중국 역사가의 역할 : 중러 양국을 사례로 |
| 10 |
段瑞聡 : 「蔣介石日記」と民国史研究者ネットワークの検証
‘장개석 일기’와 민국사 연구자 네트워크의 검증 |
| 11 |
馬暁華 : 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和解構築の課題と挑戦――日中両国の博物館の戦争展示を通じて考える
세계화 시대에 화해 구축의 과제와 도전 : 중일 양국 박물관의 전쟁 전시를 통해서 |
| 12 |
木宮正史 : 日韓歴史和解をめぐる政治学――歴史葛藤の抑制メカニズムとその機能不全
한일 역사 화해를 둘러싼 정치학 : 역사 갈등의 억제 메커니즘과 그 기능의 불완전 |
| 13 |
前嶋和弘 : 奴隷制というアメリカの「原罪」をめぐる和解の難しさ―「一六一九プロジェクト」の動きを中心に
노예제라는 미국의 ‘원죄’를 둘러싼 화해의 어려움 : ‘1619 프로젝트’ 움직임을 중심으로 |
총서⑥ 『想起する文化をめぐる記憶の軋轢――欧州・アジアのメディア比較と歴史的考察』 (東京: 明石書店, 2023)
(상기(想起)하는 문화를 둘러싼 기억의 알력 : 유럽·아시아의 미디어 비교와 역사적 고찰)
|
| 1 |
浅野豊美 : 戦後日本の対外文化交流政策理念の模索と歴史認識問題の起源
전후 일본의 대외 문화교류 정책 이념 모색과 역사 인식 문제의 기원 |
| 2 |
丁智恵 : 歴史の忘却と抵抗の痕――一九六〇年代社会派ドラマの放送中止事件から
역사 망각과 저항의 흔적 : 1960년대 사회파(社会派) 드라마 방송 중지 사건 |
| 3 |
金泰植 : 韓国映画における「総聯系」在日朝鮮人表象と和解
한국 영화의 ‘총련계’ 재일교포 표상과 화해 |
| 4 |
李海燕 : 映画にみる日中戦争の記憶イメージとその可能性――国際受賞作への分析を中心に
영화로 보는 중일전쟁의 기억 이미지와 그 가능성 : 국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
| 5 |
青山瑠妙 : 「記憶の記憶」時代における日中和解
‘기억의 기억’ 시대의 중일 화해 |
| 6 |
中山大将 : NHKスペシャル三〇年における<和解>
NHK 스페셜 30년에 있어서 <화해> |
| 7 |
米倉律 : テレビの「八月ジャーナリズム」におけるアジアの表象――放送メディアに媒介される〝和解〟の契機と課題
TV의 「8월 저널리즘」에서 아시아의 표상 : 방송 미디어에 매개되는 ‘화해’의 계기와 과제 |
| 8 |
加藤恵美 : 日本社会における戦争と植民地支配の記憶――戦後キネマ旬報ベスト・テン映画の検討
일본 사회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기억 : 전후 키네마순보의 Best 10 영화 검토 |
| 9 |
バラク・クシュナー浅野豊美 : 戦争・ホロコーストと帝国・植民地支配表象をめぐるメディアの正義と和解――ヨーロッパとアジアをまたぐ複眼的視座を求めて
전쟁·홀로코스트와 제국·식민지 지배 표상을 둘러싼 미디어의 정의와 화해 :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중층적 관점을 찾아서 |
| 10 |
武井彩佳 : 「ホロコースト・ドキュメンタリー」――記憶と和解
‘홀로코스트 다큐멘터리’ : 기억과 화해 |
| 11 |
小菅信子 : 記憶・文化・和解――戦後英語圏の映画・ドラマに見る日本イメージの変化
기억·문화·화해 : 전후 영어권의 영화·드라마로 보는 일본 이미지 변화 |
Download Excel Table
Ⅳ. 닫는 글을 대신하여 : 종교화해학의 가능성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이념 대립, 압축 성장의 급격한 산업화, 군사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은 상처를 가졌다. 지금도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양극화, 젠더 문제, 세대 갈등, 남북 대립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절실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32)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몇몇 원혼 위무 의례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33) 한반도에서 화해의 극적인 성과는 손꼽아보기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학자들도 화해 실천을 목표로 하는 학술적 화해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화해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은 꾸준히 등장한다. IARS에도 서울대학의 남기정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34) 하지만 연구소 단위로 참가하는 독일, 일본, 미국 등과 달리 한국 학자의 참여는 개인 차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 수도 적은 편이다. 한국 현실에 화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글이 특히 강조하려는 것은 한국 종교학자들의 화해학 연구 참여다. IARS는 화해학의 이론·실천·교육 분야 형성을 위해 연구자·정치인·실무자(NGO 등) 및 갈등 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그 연구는 역사학·정치학·사회학·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 전공자들의 학제 간 작업이다. 그렇다면 종교 연구자들의 화해학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IARS 학술대회부터 ‘종교와 화해’ 패널이 설치되어 논의되기 시작했고, IARS의 학술지에도 ‘종교와 철학에서 화해’ 분야가 명시되어 있음은 그 사실을 입증한다.
화해학 연구자들은 대개 화해의 과정과 방법, 결과에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 까닭은 종교가 갈등/분쟁 당사자 각자에게 익숙한 종교적 지혜를 제시함으로써 삶과 가치관을 변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제시하는 지혜는 갈등/분쟁의 근본 원인과 해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종교의 신앙·경전·의례·상징은 인간 존엄성과 화해의 서사를 드러낼 수 있고, 종교의 힘은 분쟁/갈등 당사자의 자기 변혁을 유도함으로써 평화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교가 갈등/분쟁 당사자들을 만나게 하는 독특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기여 지점으로 제시된다.35) 심지어 종교적 자원을 무시하면 평화 구축 노력에 해로울 수 있다는 충고마저 있다.36)
종교가 화해의 문을 여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종교적 지혜와 세속적 지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 사이의 긴장은 오히려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37) 그러므로 종교로써 갈등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보다는, 종교가 갈등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자기 변혁과 공간 제공 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38)
종교가 화해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종교학도 화해 연구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화해학(Reconciliation Studies)은 학제 간 연구이므로, 종교학의 참여가 거부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해 연구에 있어서 종교학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종교학은 종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화해학의 핵심 개념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린다 래지크와 콜린 머피에 의하면, 화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① 사과(apologies), ② 기억(memorials), ③ 진실 말하기(truth telling), ④ 사면(amnesties), ⑤ 재판과 처벌(trials and punishment), ⑥ 정화(淨化[사회적 배제], lustration), ⑦ 배상(reparations), ⑧ 용서(forgiveness), ⑨ 심의 과정 참여(participation in deliberative processes)의 단계들로 구성된다.39) 문제는 각 단계에 등장하는 사과·기억·진실·사면·정화·용서와 같은 핵심 개념들의 정립이 어렵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개념들을 받아들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가치관 전환 및 자기 변혁을 유도하는 종교적 지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종교의 가르침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하고 그친다면, 화해를 위한 실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조너선 스미스에 의하면, 종교학자는 종교를 번역한다.40) 그러므로 종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번역하는 종교학자의 작업은 화해에 필요한 여러 개념 정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종교학은 종교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이루어지지 못한 화해의 사례들을 찾아 모델링함으로써, 화해 이론 개발과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화해 성공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 역시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억, 상징, 의례, 물질 등 다양한 연구 대상들이 있다.
셋째, 종교현상에 민감한 종교학자는 분쟁/갈등의 이면에 감추어진 종교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분쟁/갈등 속 깊숙이 숨은 원인을 캐내는 작업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화해의 신선한 실천 방법을 이끌 수 있다.
넷째, 화해학은 종교분쟁/갈등 당사자들의 내적 변혁을 위한 지침과 실천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종교학은 여기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종교는 내적 변혁을 이끄는 힘을 지니지만 종교 자체의 가르침이 가공되지 않은 형태 그대로 제시된다면, 개종 강요와 같은 폭력적 형태로 비칠 수도 있다. 종교를 객관적·경험적·학문적 관점으로 서술하는 종교학의 기여가 가능한 지점이 이곳에도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아젠다를 하나씩 추출하고 정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화해를 향해 종교학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을 아마도 ‘종교화해학(Religious Reconciliation Studie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화해를 연구하는 것이 화해학, 종교를 연구하는 것이 종교학이라면, 종교화해학은 ‘화해를 위한 종교 연구(Religious Studies for Reconciliation)’, ‘화해의 종교적 차원 연구(Studies in the Religious Dimensions of Reconciliation)’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림 2>에서 보듯 종교화해학은 종교학과 화해학의 학제 간 연구 혹은 종교의 번역을 통해 화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해와 그 구성 요소들의 다양한 개념 정립, ▲화해에 끼치는 종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갈등 이면에 숨겨진 종교적 요소 탐색, ▲용서와 화해 실천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가치관 제공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처를 기억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의 서사를 형성할 수 있고, 상징과 의례를 통해 공감과 연대의 감정을 구축하게 할 수도 있다.
종교학의 넓은 범주에서 보면, 종교화해학도 응용종교학(Applied Religious Studies)41)의 하나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향후 이 분야 연구의 장이 넓어져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 닦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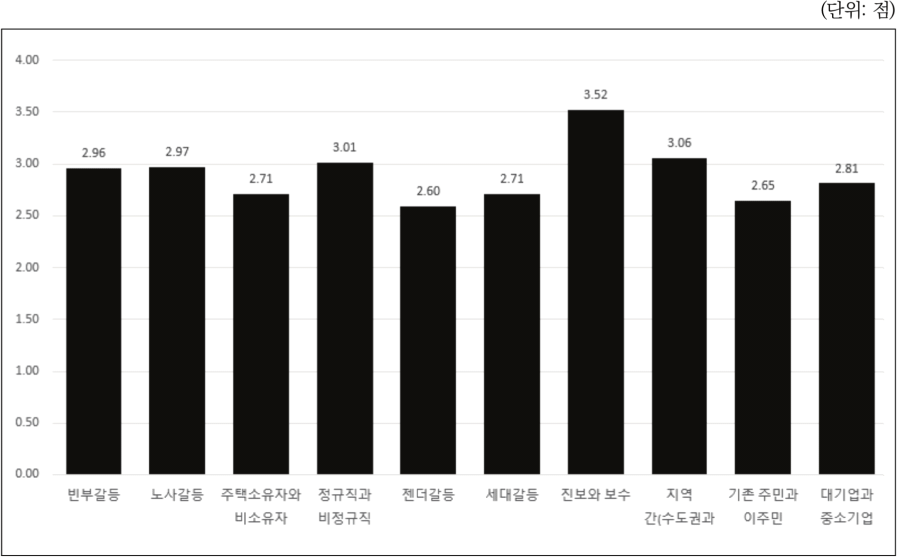
 )’는 ‘서로 응한다’라는 뜻이다. 이 글자의 의미는 ‘구(口)’이고, 발음은 ‘화(禾)’이다.7) ‘구’는 다관(多管) 피리를 입으로 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화롭다, 화합하다, 화목하다, 강화를 맺다, 섞다 등의 뜻이 나왔다고 한다.8) ‘해(解,
)’는 ‘서로 응한다’라는 뜻이다. 이 글자의 의미는 ‘구(口)’이고, 발음은 ‘화(禾)’이다.7) ‘구’는 다관(多管) 피리를 입으로 분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화롭다, 화합하다, 화목하다, 강화를 맺다, 섞다 등의 뜻이 나왔다고 한다.8) ‘해(解,  )’는 ‘분해한다’라는 뜻으로서, 칼[刀]로 소의 뿔[牛角]을 분해하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9)
)’는 ‘분해한다’라는 뜻으로서, 칼[刀]로 소의 뿔[牛角]을 분해하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