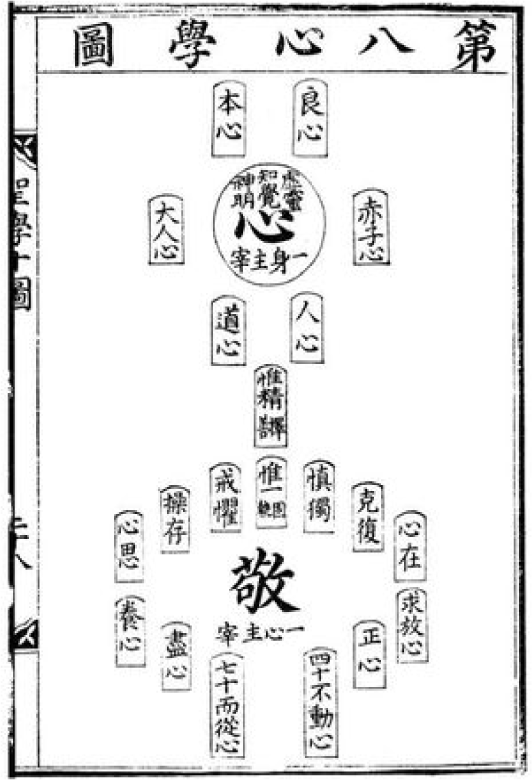Ⅰ. 머리말
본 연구는 대순사상에서 주자(朱子)의 학문 세계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또 변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1) 대순사상은 강증산(姜甑山) 구천상제(九天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사상체계를 말한다. 증산의 종통(宗統)이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에게 이어졌고, 정산은 다시 종통을 도전(都典) 박우당(朴牛堂)에게 계승하였다. 이러한 종통 계승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대순사상은 증산과 정산, 그리고 우당이 남긴 언설과 행적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바탕에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전승된 유·불·도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布德·敎化·修道) 가운데 하나인 수도의 측면에서는 인륜 도덕의 실천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유교적인 요소가 중요한 위상을 지니며 수용되고 있다는 일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2)라는 우당의 가르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유교적 요소의 수용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증산은 선도와 불교, 유교,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을 각각 세우는 공사를 하며 유교의 종장을 ― 유교의 비조(鼻祖)인 공자가 아니라 ― 주자로 세웠다는 것이다.3) 주자를 왜 유교의 종장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는 주자가 대순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그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한대(漢代)에 이르러 오경(五經)박사 제도가 시작되며 독존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를 거쳐 송대(宋代)까지도 유교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반면에 불교와 도교는 크게 융성하였다. 주자는 신유학(新儒學)으로서의 주자학을 완성하였으며 사서(四書) 운동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유교가 부흥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중국의 역사학자였던 전목(錢穆, 1895~1990)의 “역사상 공자와 주자는 중국의 학술사상사와 문화사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고대의 학술사상을 집대성하여 유학을 개창하였고, 주자는 공자 이래의 학술사상을 집대성하였으며 유학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정신을 발휘하게 하였다.”4)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중국 사회에 미친 주자의 영향력은 막대하였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주자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므로 조선 사회에서 주자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주자가 제정한 여러 가정의례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회적 관습의 원형(原型) 내지는 전형(典型)으로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근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이룩된 대순사상에도 이러한 주자의 학문 세계가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사상적으로 변용된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의 학문 세계가 대순사상의 기층(基層)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여기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대순사상 측면에서 주자와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태극 개념을 비롯하여 수양론·심론(心論)·상생이론·체용론 등의 분야에서 대순사상과 주자를 비교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5) 이 분야들은 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로서 주자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순사상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비교적 잘 조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비교 중심의 연구들은 대순사상을 이루고 있는 주자 학문 세계의 편린을 조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 논문은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증산과 정산, 그리고 우당의 언설과 행적이 기록된 『전경』과 『대순지침』을 비롯하여 우당의 ‘훈시(訓示)’ 및 기타 공적 언설에서 주자의 학문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 가운데 대순사상에서 ‘수용’ 내지는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을 논제로 삼고자 한다.6) 그 논제로는 『전경』에 등장하는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과 虛靈·知覺·神明’을 비롯하여 증산이 저술한 『현무경(玄武經)』의 ‘武夷九曲과 虛靈符, 智覺符, 神明符’,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창설 유래를 밝힌 글과 대순진리회의 전신이었던 종단[太極道]의 명칭에서 볼 수 있는 ‘태극(太極)’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이 논제들의 문헌 출처와 그 의미를 분석한 다음 이것이 대순사상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또 변용되고 있는가를 조명할 생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자의 학문 세계가 대순사상의 기층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闢於丑), 인기어인(人起於寅)과 허령(虛靈)·지각(知覺)·신명(神明)
증산은 천지 운행의 법칙 체계인 도수(度數)를 새롭게 정립하는 대개벽(大開闢)의 공사[天地公事]를 행하며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 능력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언설과 행적을 남겼다. 그러한 이유로 신인(神人)으로 칭송받기도 하였다. 증산과 정산의 언행을 기록한 『전경』에는 증산이 남긴 한시(漢詩)와 한문 구절 수십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옛 문헌에 등장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몇 글자를 변용한 것도 있다. 다음은 그 의미를 추론할 만한 전후 맥락이 없이 독립적으로 수록된 것으로 주자의 글과 주자학의 주요 용어가 함께 들어있는 구절이다.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 대체로 글을 쓰셨다가 불사르시거나 혹은 종도들에게 외워 두도록 하셨도다.
① 道傳於夜天開於子 轍環天下虛靈
② 敎奉於晨地闢於丑 不信看我足知覺
③ 德布於世人起於寅 腹中八十年神明7)
* ①, ②, ③과 아래 해석은 필자가 덧붙임
도는 밤에 전해지고 하늘은 자시에 열리며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님은 허령이다.
교는 새벽에 받들고 땅은 축시에 열리며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발을 보라 함은 지각이다.
덕이 세상에 펼쳐지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나며 뱃속에 팔십 년을 있었음은 신명이다.
위의 인용문은 ①, ②, ③이 서로 대구를 이루는데, 추상적인 용어가 많아 의미가 무척이나 난해하다.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이라는 어구는 기존의 문헌에 등장하는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문장과 거의 일치한다. 이 문장은 ‘『논어집주』, 「위령공」의 주자 주석’을 비롯하여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성리대전본-』, 「찬도지요(纂圖指要) 하」의 채원정(蔡元定) 말에 대한 주자의 주석과 임천 오징(臨川 吳澄)의 주석,’8) 그리고 ‘『주자어류』 권45의 28·29·30·31조목’ 등에 등장한다. 이 어구는 증산이 이러한 문헌에 등장하는 문장에서 ‘生’을 ‘起’로 글자 하나만을 바꾸어 변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虛靈’·‘知覺’·‘神明’이라는 말도 주자학에서 마음[心]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변용된 것으로 보인다.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 등장하는 문헌 가운데 이 문장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주자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묻기를, “‘하늘은 자(子)에 열리고 땅은 축(丑)에 열리며 사람은 인(寅)에서 생겨난다(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라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답하길, “이는 소강절(邵康節)의 『황극경세서』 가운데 있는 말로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는 단지 수(數)로써 이와 같이 추론하였을 뿐이다. 그가 인(寅)에서 만물이 생겨난다고 말한 것은 그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과 사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원(元)과 12회(會), 30운(運), 12세(世)가 있으니, 129,600년이 1원(元)이 된다. … .”라고 하였다.9)
주자는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 소강절의 『황극경세서』에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소강절은 우주의 전개를 지극히 법칙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원·회·운·세(元·會·運·世)라는 범주의 반복적인 중첩으로 설명하였다.10)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세는 30년으로 1운은 12세, 1회는 30운, 1원은 12회로 이루어졌다고 하며, 1원인 129,600년이 한 세계의 주기가 된다는 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말은 소강절의 『황극경세서』라 할 수 있는 ‘성리대전본’과 ‘사고전서본’의 「관물내편(觀物內篇)」·「관물외편(觀物外篇)」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11) 주자가 어떤 판본의 문헌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에 관한 주자의 언급은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주자의 답변 전반도 질문의 요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음의 내용에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자가 말하길, “ … 소강절의 『황극경세서』는 원(元)으로써 12회(會)를 통괄(統括)하여 1원으로 삼았으니, 10,800년이 1회가 된다. 처음 10,800년 사이에 하늘이 처음으로 열렸고, 또 10,800년 사이에 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10,800년 사이에 사람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 대개 처음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단지 기(氣)가 꽉 차 있었을 뿐이다. 하늘이 조금 열린 뒤에야 곧 한 덩어리의 찌꺼기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점점 엉겨 뭉쳐져서 땅을 이루었다. … 이로써 반드시 먼저 하늘이 있고 바야흐로 땅이 있었으며, 하늘과 땅의 교감이 있고 나서 비로소 사람과 사물이 처음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12)
주자는 소강절의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하늘, 땅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1회인 10,8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늘과 땅이 차례로 열리고, 이어서 인간(만물)이 생겨났다는 설명이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 할 수 있다. 채원정은 “1원의 수는 곧 1년의 수다. 1원에 12회, 360운, 4,320세가 있음은 1년에 12월, 360일, 4,320시진(時辰)이 있음과 같다.”13)라고 하였다. 이 말은 1원에 12회가 있음은 1년에 12월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12회를 지지(地支)인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에 배속하여 제1·제2·제3회를 각각 자(회)·축(회)·인(회)이라 함으로써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말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증산이 말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은 각 구절 앞에 ‘道傳於夜’, ‘敎奉於晨’, ‘德布於世’라는 구절이 각각 있으며, 이 세 구절이 대구를 이루기 때문에 의미상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야(夜)’와 ‘신(晨)’은 하루의 시간대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세(世)’ 또한 이와 연관된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곧, ‘야(夜)’는 ‘밤’을, ‘신(晨)’은 자정부터 날이 밝을 무렵 사이인 ‘새벽’을 말한다. ‘세(世)’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밤과 새벽과의 시간적 맥락을 고려하면 새벽이 지나고 날이 환하게 밝은 시간인 ‘아침-낮’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축·인은 하루의 시간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세 구절은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며’, ‘사람은 인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자가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우주의 생성론적 차원으로 말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을 증산이 ‘生’을 ‘起’라고 글자 하나를 바꾸어 하늘·땅·사람과 관련하여 하루의 특정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서술하는 말로 변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
‘虛靈’·‘知覺’·‘神明’은 주자를 비롯한 주자학자들의 여러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보다 앞선 ‘轍環天下’, ‘不信看我足’, ‘腹中八十年’ 각 구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자는 고국인 노(魯)나라를 떠나 14년 동안 수레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신이 이상으로 여겼던 도를 실현하고자 편력하였다. 하지만, 끝내 어느 군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시경』·『서경』·『예기』·『악기』·『주역』 등의 경서(經書)를 다듬고 『춘추』를 지어 성왕(聖王)들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였다. 수레를 타고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편력한 공자의 삶을 묘사한 말이 바로 ‘철환천하(轍環天下)’다. 이 말은 『이정유서(二程遺書)』와 조선 전기의 저작인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담겨있다.15)
‘불신간아족(不信看我足)’은 중국 선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가섭존자에게 교외별전(敎外別傳)으로 가르침을 전수했다는 ‘곽시쌍부(槨示雙趺: 관 밖으로 두 다리를 보임)’라는 설화와 연관되어 있다. 부처가 열반하였을 때 가섭과 여러 제자가 먼 곳에 출타하여 있었다. 이들이 돌아와 크게 슬퍼하며 입관된 부처의 유체(遺體)를 뵈었을 때 부처가 가섭을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줌으로써 가섭에게 부처의 법신은 상주불멸(常住不滅)하여 생과 사가 없다는 불교의 진수를 전수했다는 것이 ‘곽시쌍부’다. 이 설화는 대승불교 경전에 속하는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에서 볼 수 있다.16) ‘곽시쌍부’라는 말은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37칙를 비롯하여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권23, 『분양어록(汾陽語錄)』 등에 등장한다.17) ‘불신간아족’은 이 설화를 바탕으로 증산이 의도를 담아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복중팔십년(腹中八十年)’은 도교에서 태상노군으로 추앙하는 노자의 신비스러운 탄생 설화와 관련된 말이다. 『사기(史記)』의 주석서로 당(唐)나라 때 장수절(張守節)이 편찬한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초기 천사도(天師道)의 경전인 『현묘내편(玄妙內篇)』의 말을 인용하여 어머니가 노자를 81년 동안 잉태했다 낳았다는 설과 72년 동안 잉태했다 낳았다는 설이 소개되어 있다.18) 또한, 증산의 언행에 관한 전승 기록 가운데 하나인 『대순전경(大巡典經)』에도 증산이 노자를 초혼(招魂)하여 한 말 속에 노자가 81년을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19) 이는 증산이 81년 설을 수용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왜 ‘81년’이라 하지 않고 ‘80년’이라고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복중팔십년’도 이러한 노자의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증산이 지어낸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허령·지각·신명이 등장하는 용례는 대표적으로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제8도인 <심학도(心學圖)>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퇴계는 동그란 원 안에 크고 두껍게 ‘心’이라고 쓴 다음 그 위쪽에 ‘虛靈 知覺 神明’이라는 글귀를 써 놓았다.(<그림 1> 참고) 또한,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의 제자인 권상하(權尙夏)의 문집에는 “‘<심학도>에서 심(心)의 권역 안에 허령 지각 신명 6자를 썼는데, 허령 지각 외에 별도로 이른바 신명이란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선생께서 ‘어찌 그러겠느냐. 허령 지각이 곧 신명함의 소이(所以)다.’라고 하였다. 또, ‘신(神)은 심(心)입니까?’라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답하였다.”20)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러한 문답과 퇴계 <심학도>의 용례를 통해 허령·지각·신명이 마음과 관련한 주자학의 용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허령’에 대해 살펴보자.
‘텅 비어있으나 영명함’(虛靈)은 저절로 마음의 본래 모습 자체가 그러한 것이지 내가 텅 비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귀와 눈이 보고 듣고 할 때 보고 듣도록 하는 것은 곧 그 마음 때문이니, 어찌 (마음에) 형상이 있겠는가? 그러나 귀와 눈이 있어서 보고 들으니, 곧 형상이 있는 것과 같다.21)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구체적인 형체와 자리한 위치가 없으며 또한 스스로 ‘신묘하게 밝고’(神明)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이 ‘허령’이라는 두 글자가 성립하는 까닭이다.22)
위는 주자의 말이고, 아래는 우암의 제자인 김창협(金昌協)의 말이다. 여기에서 텅 비어있으나 영명한 마음의 본래 모습을 형용하는 말이 ‘허령’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구체적인 형체나 일정하게 자리한 위치가 없으므로 이를 형용하여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허(虛)’라 하였다. 또한, 마음은 그 기능이 신묘하게 밝고 헤아릴 수 없으므로 ‘영명하다’라는 의미로 ‘령(靈)’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텅 비어있는 까닭에 ‘뭇 이치를 갖추고’(具衆理) 있고 영명한 까닭에 외부의 ‘모든 일에 응하는’(應萬事) 것이다.23) 곧, 마음의 본래 모습을 묘사한 ‘허령’은 비록 구체적인 형체는 없으나 뭇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영명하여 모든 일에 자유자재로 응하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신명’이라고 하면 ‘천지신명’이라는 용례에서 보듯이 신적(神的)인 존재를 가리키는 명사로 이해하기 쉽다. 물론 유교에서도 이러한 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의식 기능이 정밀하고 오묘함을 나타내는 ‘신(神: 신묘하다)’과 무언가를 알고 깨달으며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곧 지적인 총명함을 나타내는 ‘명(明: 밝다)’의 합성어로 쓰이기도 한다. 아래 인용문에서의 ‘신명’은 이러한 마음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형용사적 용법이므로 ‘신묘하게 밝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용례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명함으로 뭇 이치를 갖추고 있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24)라는 주자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각’에 대해서는 송(宋)나라의 학자였던 물재 정약용(勿齋 程若庸)의 “허령은 마음의 체(體)이고, 지각은 마음의 용(用)이다.”25)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허령’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고, ‘지각’이란 이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이다. 주자의 문헌을 보면 지각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이목구비와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한 감각적 인식과 배고프고 춥고 가려운 것 등을 느끼는 능력이다. 이는 동물과 똑같이 가지는 지각 능력이다. 또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사리(事理)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위와 그 결과가 나머지 하나다.”26)
이렇게 허령·지각·신명은 주자학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과 작용, 그리고 기능 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심학(心學)의 중요한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증산의 언설에서는 이러한 의미와는 다르게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道傳於夜天開於子’와 ‘敎奉於晨地闢於丑’, ‘德布於世人起於寅’ 이 세 구절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도가 전해지고 교를 받들고 덕이 펼쳐지는 때는 밤·새벽·아침-낮(세상)이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일어나는 때는 자시·축시·인시로 ‘밤 → 새벽 → 아침-낮(세상)’과 ‘자시 → 축시 → 인시’와 같은 도식처럼 어둠에서 새벽을 지나 점점 날이 밝아 낮이 되는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세 구절 뒤의 ‘轍環天下虛靈’, ‘不信看我足知覺’, ‘腹中八十年神明’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 구절과 의미상 상응하며 또한 어떠한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유교 경서를 다듬고 『춘추』를 지었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함으로써 후세에 유교의 도가 넓게 뿌리내리는데 지대하게 공헌하였다. 이는 대부분 자신의 도를 실현하고자 편력하였던 ‘철환천하’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철환천하’ 시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비록 없었으나[虛], 후대에 유교의 도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사업)의 구상이나 계획 등이 이루어진[靈]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지만[虛], 그 속에서도 뭇 생명체가 (잠을 통해) 내일의 활동을 준비하며 힘을 축적하고 있는[靈] ‘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체는 없으나 뭇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모든 일에 자유자재로 응하는 영명한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의 ‘허령’과도 이미지가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불신간아족’은 두 발을 보임으로써 부처의 법신은 생사가 일여(一如)하다는 불교의 진수를 전수했다는 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말이다. 이 설화에 근거하면 ‘불신간아족’은 부처가 가섭에게 하는 말처럼 보인다. 가섭이 부처의 두 발을 보고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지각’이란 용어는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신간아족’은 부처가 자신의 발을 보고 불교의 진수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각’과 의미상 서로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곧 날이 밝아옴에 따라 사물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남으로써 그 사물이 무엇인가를 점점 인식하게 됨으로써 지각이 이루어져 가는 시점인 ‘새벽’의 이미지와도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중팔십년’은 노자가 어머니의 뱃속에 80년을 있다가 출생했다는 설화를 근거로 한 말인데, 이 말이 신묘하게 밝다는 뜻의 ‘신명’과 의미상 어떻게 상응하는지 헤아리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증산은 분명 이 ‘복중팔십년’의 설화와 ‘신명’이 의미상 상응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중팔십년신명’이라고 글을 남겼을 것이다. 그 상응하는 무엇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허령’과 ‘밤’, ‘지각’과 ‘새벽’이 의미상 상응하는 것처럼 어둠에서 새벽을 지나 밝아지는 시간적 흐름이라는 맥락을 따라 해석한다면 ‘신명’(신묘하게 밝다)은 날이 환하게 밝아 사물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침·낮(세상)’과 이미지가 상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①, ②, ③은 각각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여러 개의 어구가 모여서 각각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①의 예로 보자면,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道傳於夜’, ‘天開於子’, ‘轍環天下’, ‘虛靈’이라는 어구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①, ②, ③의 문장 전체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시간적 흐름과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허령’·‘지각’·‘신명’도 어떠한 사물이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당의 다음 언설에서 이러한 시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주님께서는 … 정사(丁巳, 1917)년 2월 10일 23세 되시던 해에 득도를 하셨다. 23수는 태을주의 수와 일치한다. 그 주문으로 도를 받으셨다. 자신이 서시자 상제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시고 조선으로 나오셨다. 이것만 알아도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때는 허령(虛靈)이었다. 배를 타고 나오시다 풍파를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았는데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한다. … 내리신 곳이 태안(泰安)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안면도(安眠島)에 가셨다.27)
도주님께서는 … 허령 때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 나고 무극도장에서 나오신 뒤, 회문리 회룡재(회룡도장)에 지내시다가 광복 후에 도시인 부산으로 나오셨다.28)
원래 허령 지각 신명 도통이니 만큼 이제야 말로 우리는 지각에 의한 수도로써 신명판단을 기다리고 도통을 바라야 할 뿐입니다.29)
위쪽의 두 인용문은 도주 조정산의 행적에 관한 설명이고, 아래는 1968년 당시 태극도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말미에 도전으로서 소속 도인들에게 공고하는 성명서의 일부다. 정산이 ― 구국(救國)운동을 위해 만주(滿洲)로 가족과 함께 망명한 지 9년 만인 ― 1917년 뱃길로 귀국길에 올라 안면도에 도착한 무렵과 1941년 대동아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 직후까지를 허령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는 허령’과 ‘허령 때’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허령’은 어떠한 ‘시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도 시기를 나타내는 의미가 담긴 ‘이제야 말로’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다. 이는 당시가 ‘지각에 의한 수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시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각’ 또한 어떠한 ‘시기’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령·지각이 이렇게 어떠한 시기를 나타내는 용어라면 ‘신명’도 어떠한 시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또한, 허령·지각·신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안면도 도착 시점과 대동아전쟁 발발 사이의 공백기도 허령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허령·지각·신명’ 다음에 ― 대순진리회에서 개인적인 수도의 완성을 뜻하는 ― ‘도통’을 함께 언급하였다는 것은 허령·지각·신명의 시기를 지나 도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신명판단’이라는 말 속의 신명은 ‘신묘하게 밝다’라는 뜻의 신명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지각에 의한 수도로써 신명판단을 기다리고’라고 하였으므로 이 신명은 수도의 잘잘못이나 성과를 판단하는 주체인 인격신으로서의 ‘신명’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30)
한편, 『전경』에는 ‘도수(度數)’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지닌 용어가 수십 회 등장한다.31) 그 가운데는 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야 하는(人德) 시기’와 도주 스스로는 고향에서 ‘조용하게 은둔해야만 하는(潛伏) 시기’를 뜻하는 ‘인덕 도수’와 ‘잠복 도수’라는 말이 보인다.32) 이 용례에서의 ‘도수’ 개념은 어떠한 특정 시기를 가리키며, 그 시기의 성격을 뜻하는 ‘인덕’이나 ‘잠복’이라는 말과 결합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령·지각·신명’도 이처럼 어떠한 시기의 성격을 뜻하며 도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허령 도수’, ‘지각 도수’, ‘신명 도수’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3장 39절에 등장하는 ‘허령’·‘지각’·‘신명’은 주자학의 주요한 심학적 개념과는 다르게 어떠한 시기를 뜻하는 ‘도수론적 개념’으로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사 3장 39절의 ①, ②, ③ 문장은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에 수록된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마치 비결을 푸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난해하다.33) 그러므로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단지 위의 도전 훈시와 성명서에 근거한다면 ‘허령·지각·신명’은 도수를 나타내는 말이고, ‘허령 도수’는 도주 조정산이 득도한 1917년부터(1917년 이전부터일 수도 있음) 1968년 성명서가 발표되던 시점까지의 시기이며, 성명서 발표 시점부터 ‘지각 도수’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시기까지가 ‘지각 도수’이며, ‘신명 도수’의 경우 그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추론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본 논문에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②, ③의 문장은 하루 특정 시간대의 사태 변화를 유비적으로 확대하여 ‘허령·지각·신명’이라는 도수에 따라 특정 기간의 마디를 두고 증산이 펼친 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증산의 공사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무이구곡(武夷九曲)과 허령부(虛靈符)·지각부(智覺符)·신명부(神明符)
증산은 1909년에 짧은 한문 글귀와 여러 종류의 부도(符圖)로 이루어진 『현무경』을 직접 저술하였다. 이 『현무경』은 난해한 형상의 여러 부도와 앞뒤로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독립된 한문 글귀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신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현무경』은 『전경』의 교운 1장 66절에 부도는 생략된 채 한문 글귀만이 실려 있다.) 이 책에는 ‘虛靈符’, ‘智覺符’, ‘神明符’라는 부의 명칭이 반서체(反書體)로 쓰인 3개의 부가 독립적으로 실려 있다. 각 부마다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武夷九曲’이라는 글귀가 역시 반서체로 쓰여 있다.(<그림2 참고>) 이는 앞서 살펴본 허령·지각·신명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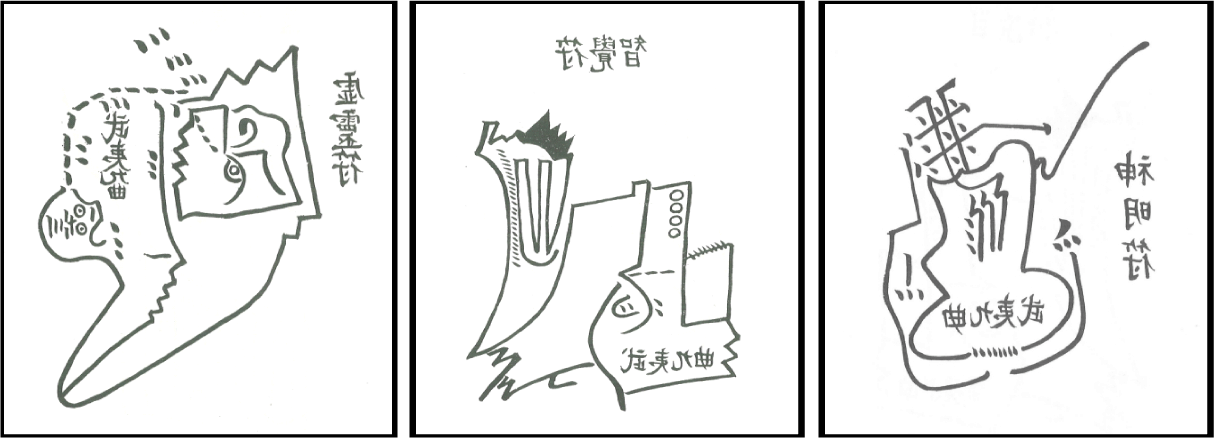
『현무경』의 이 세 개의 부에 적힌 ‘무이구곡’은 중국 복건성(福建省)에 있는 무이산(武夷山)의 아홉 구비의 계곡을 가리킨다. 주자는 무이구곡의 제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조선의 사림은 무이구곡과 무이정사를 주자학의 성지(聖地)로 인식하였다. 주자는 이 무이구곡을 소재로 시를 한 수 남겼는데, 바로 ‘무이구곡시(武夷九曲詩)’다. 이 시는 주자가 55세(1184년)에 지은 것으로 『주자대전』 권9에 실려 있으며, 본래 명칭은 ‘순희갑진중춘, 정사한거, 희작무이도가십수, 정제동유상여일소(淳熙甲辰仲春, 精舍閒居, 戲作武夷櫂歌十首, 呈諸同遊相與一笑)’이다. 일명 ‘무이도가(武夷櫂歌)’ 혹은 ‘구곡도가(九曲櫂歌)’라고도 불린다.
이 「무이도가」는 고려 말에 이미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중반에 이르면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와 더불어 조선의 지식인 계층에 널리 전파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34) “특히, 사림 계층 사이에는 「무이도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있어 문학적 논쟁을 펼치며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였다. 하나는, 주자가 무이구곡이 빚어낸 여러 승경(勝景)을 보고 자신의 감흥을 담아낸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산수시(山水詩)’라는 해석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과 퇴계 이황,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 등을 들 수가 있다. 또 하나는, 학문을 통해 도에 들어가는 차례를 노래한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재도시(載道詩)’라는 관점이다.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를 비롯하여 포저 조익(浦渚 趙翼), 우암 송시열, 성호 이익(星湖 李瀷)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35)
‘입도차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하서는 도가 사라져 천 년 동안 길이 막혔음을 말한 것이 1곡시이며,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색을 멀리해야[遠色] 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의지[舍生之志]가 있어야 함을 2곡시와 3곡시에서 각각 읊었다고 보았다. 또한, 4곡시는 참된 앎[眞識]을, 5곡시는 다시 의문을 품어야 함[又却疑]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36) 또한, “포저는 4곡시부터 6곡시까지는 그 뜻이 대체로 비슷한데, 모두 사욕(私欲)이 없어진 뒤에 스스로 즐거움을 얻어 더욱 그 경지가 깊어짐을 노래한 것이라 하였다. 7곡시는 도학(道學)의 이상적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면려(勉勵)와 온고지신(溫故知新)을, 8곡시는 도학의 경지는 워낙 높아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 거의 없음을 읊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마지막 9곡시는 도학의 극처(極處)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범한 일상의 일들 사이에 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였다.”37) 이렇게 입도차제의 재도시로 해석하는 시각이 산수시적 시각보다 더욱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추종자가 훨씬 많아 사림 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다.38)
한편, “주자학이 난숙기를 맞는 조선 중기 이후 「무이도가」의 차운시(次韻詩: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따서 지은 시)가 유행하여 이름난 주자학자라면 한 번쯤 이 차운시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대표적으로는 퇴계와 한강 정구(寒岡 鄭逑)의 시가 있다. 또한, 타인이 지은 「무이도가」의 차운시를 보고 재차운(再次韻)하여 화답하는 형태로 지은 화운시(和韻詩)도 유행하였는데, 입재 정종로(立齋 鄭宗魯)와 미강 박승동(渼江 朴昇東)의 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39) 이처럼 입도차제의 재도시로 해석하고 차운시, 화운시가 크게 유행할 정도로 「무이도가」에 열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었다. 중국의 지식인 계층에서는 「무이도가」를 단지 무이구곡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도교적 전설을 담아낸 한 편의 서정시로 이해했을 뿐이며, 재도시의 시각과 같이 주자의 학문 세계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경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40)
증산이 『현무경』의 세 개 부에 써 놓은 ‘武夷九曲’이라는 글귀를 후대에 증산을 신앙하던 여러 교단에서는 ‘무이구곡시’, 곧 「무이도가」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현무경』에 미래의 일에 대한 비밀이 비장되어 있다고 믿어 증산이 앞으로의 일을 정하는 공사의 과정에서 ‘무이구곡시’를 사용하였다면, 증산이 짜놓은 도수에 따른 교운(敎運)이나 진법(眞法)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무이도가」는 증산의 천지공사 비밀을 간직한 시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고, 증산을 신앙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애송되었다.”41) 이정립의 “천사(天師)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에 … 주회암(朱晦庵)의 무이구곡시를 맞추어서 교단운로도수(敎團運路度數)를 짜신다고 하셨는데”42)라는 말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증산계열 여러 교단의 「무이도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무이도가」를 재도시적 관점으로 해석한 사림의 이해 방식과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 이는 사림의 그러한 전통이 증산계열의 여러 교단에도 문화적으로 전승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극도 시기에 입도하여 대순진리회에서 지금까지 수도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몇몇 도인의 증언에 의하면 태극도 당시 회실(會室)의 벽에 「무이구곡도」를 걸어두고 「무이도가」를 외우고 애송하였다고 한다. 1958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도통감』 ‘수서본(手書本)’의 본문 마지막 뒤에는 부록과 같은 형태로 첨부된 「무이도가」가 실려 있다.43) 1956년에 처음 인쇄되어 발간된 『태극도통감』은 태극도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은 경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도인들에게는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필사하고 그 뒤에 「무이도가」를 첨부했다는 것은 이 시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 시를 외우고 애송하였다는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는 후대로 이어져 대순진리회에서도 적지 않은 도인들이 이 시를 애송하며 나름대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대순진리회 전 중앙종의회 의장이 중국 기행문에서 무이구곡과 관련하여 소회를 밝힌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문득 무이구곡시의 ‘구름다리를 한 번 지나니 소식이 없더라(虹橋一斷無消息)’는 구절이 떠올랐다. 옥황상제님께서 한번 무지개 다리를 딛고 가신 후로 소식이 없었다는 뜻으로, 주회암(朱晦菴)도 구곡시를 옥황상제님 도수에 맞추어 절묘하게 지었으니 주자도 도통을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44) 「무이도가」 1곡시의 ‘홍교일단무소식’을 ― ‘한번 무지개 다리를 딛고 가신 후로 소식이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 ‘도주 조정산의 행적과 관련한 도수’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산의 태극도 감천도장(甘川道場)의 동북쪽 800M 지점에는 옥녀봉(玉女峯)이 있고,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앞산 바로 너머로 바위가 몇 개 있는데 그 아래에는 남한강 물이 돌면서 흘러간다. 이 옥녀봉을 2곡시의 ‘옥녀봉’에, 강물이 돌면서 흘러가는 것을 8곡시의 ‘암하수영회(巖下水縈洄)’에 비유하며 이제 곧 9곡의 도수가 도래한다는 설이 도인들 사이에 한때 회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증산이 펼친 도가 머지않아 결실기에 접어들어 개인적인 수도의 완성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서 김인후와 포저 조익의 해석에서 보는 것처럼 1곡부터 9곡까지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해석은 보이지 않지만, 종단의 도인들 사이에서는 「무이도가」를 이처럼 증산의 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교운의 전개 과정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공사 3장 39절에서도 보았듯이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매우 난해한데, 특히 『현무경』의 내용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허령부·지각부·신명부’라는 세 개의 부와 그 안에 ‘무이구곡’을 친서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증산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을 비롯하여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많은 도인이 이를 「무이도가」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근거에 바탕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근거가 되는 문헌이나 구전 전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증산의 여러 친자(親炙) 종도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어떠한 전승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무경』의 ‘무이구곡’과 ‘허령부·지각부·신명부’를 증산의 교운 도수에 대한 공사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앞서 살펴본 도수론적 의미를 지닌 ‘허령·지각·신명’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각부’의 ‘智覺’이 앞선 ‘知覺’과 한자는 다르지만, 知覺은 시비의 구별이나 사리의 분별과 판단 등을 뜻하는 智覺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45) 비록 의미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허령부·지각부·신명부’ 또한 허령·지각·신명과 같이 도수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이도가」를 증산의 교운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 특정한 시기를 뜻하는 용어인 ― ‘도수’가 변화한다는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허령부·지각부·신명부 각 부마다 ‘무이구곡’이 쓰여있다는 것은 허령·지각·신명이라는 각각의 도수마다 「무이도가」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교운이 전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자의 「무이도가」는 본의(本意)와는 다르게 증산의 교운 도수와 관련하여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우주 본연법칙으로서의 태극(太極)
‘태극’이라는 말은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의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46)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북송의 주렴계(周濂溪)가 이 ‘태극’을 중심으로 우주의 생성을 도형화한 태극도(太極圖)를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논설을 남긴 것이 바로 「태극도설(太極圖說)」이다. 주자는 이 「태극도설」과 더불어 소강절(邵康節), 장횡거(張橫渠),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 등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을 완성하였다. 주자학은 리(理)와 기(氣),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인간의 심·성(心·性)과 도덕을 비롯하여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유기적으로 해석한 학문이다. 주자는 이 ‘리’가 곧 「태극도설」의 ‘태극’이며 만물이 그렇게 존재하고 변화하는 궁극적 원리라고 하였다.47) 이는 태극을 만물에 두루 내재하는 초월적·절대적 진리라고 규정한 것이다.
「태극도설」의 첫 문장이 “無極而太極”인데, 여기 등장하는 ‘무극’과 ‘태극’의 개념과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두고 주자는 육상산(陸象山)과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에서 주자는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이 하나의 사물과 같아져서 온갖 변화의 근본이 되기에 부족하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은 공적(空寂)함에 빠져서 온갖 변화의 근본이 될 수가 없다.”48)라고 하며 ‘무극’과 ‘태극’이 동일하고 동시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주자의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라는 식의 해석은 존재론적으로 유적 요소와 무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유와 무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므로 논리적 모순이다. 하지만, 무극과 태극은 초월성과 절대성을 지닌 형이상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영역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육상산은 ‘無極而太極’을 “自無極而爲太極”이라고 하여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된(나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49) 이는 생성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노자의 “이 세상의 만물은 유(有)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無)에서 생겨난다.”50)라는 사유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육상산은 무극이 태극보다 시간상 앞선 것으로 보아 무극과 태극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無極而太極’이란 문장에서 ‘말 이을’ 而 자는 순접, 역접, 조건 등등 어떤 형태로든 전후의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다. 그러므로 주자처럼 ‘~ 이면서’라고 할 수도 있고, 육상산과 같이 시간적인 선후의 의미를 담아 ‘~ 이 있고 나서’(무극이 있고 나서 태극이 있다)와 같은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순사상에서는 ‘태극’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이 무극(無極)이고 무극이 태극(太極)이라 우주가 우주된 본연법칙은 그 신비의 묘(妙)함이 태극에 재(在)한바 태극은 외차무극(外此無極)하고 유일무이한 진리인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우주의 모든 사물 곧 천지일월(天地日月)과 풍뢰우로(風雷雨露)와 군생만물이 태극의 신묘(神妙)한 기동작용(機動作用)에 속하지 않음이 있으리오.51)
모든 것이 진리 안에 다 들어 있다. 대순이라 함은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대순이 무극이요, 무극이 대순이요,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다. 전 우주의 모든 천지일월이라든지 삼라만상의 진리가 대순, 태극의 진리다.”52)
위는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유래를 밝힌 글의 첫 서두에 해당하는 일부분이고, 아래 내용은 우당의 훈시다. 여기에서 대순사상에서는 태극을 무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극과 동일한 개념이며 우주의 본연법칙으로서 유일무이한 절대적 진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자의 태극에 대한 인식과 다르지 않다. 주자는 우주 만물을 리와 기의 결합체로 규정하였다.53) 이런 까닭에 리는 기를 떠나서 존립할 수 없고[理氣不相離], 또 그 기 안에는 항상 리가 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그 안에 내재한 원리(본연법칙)인 리, 곧 태극의 기동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 ‘우주의 모든 사물이 태극의 신묘한 기동작용에 속한다’라는 말도 바로 주자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순’과 ‘원’을 ‘무극’·‘태극’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대순사상만의 독창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가 곧 대순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순이 태극’이고 ‘대순이 무극’이며, ‘대순’이란 삼라만상에 두루 내재하여 막힘이 없이 두루 통한다는 것이다. 동그란 ‘○’(원)은 둥글게 이어져 계속 순환하여도 막힘이 없다. 이러한 속성을 형이상학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여기에서의 ‘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이라는 개념이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므로 ‘대순이 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자의 ‘태극’은 우주 만물의 존재론적 근원이며 만물을 주재하는 근본 원리[天理]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우주의 절대자인 구천상제가 이러한 태극을 관령(管領)하고 주재(主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54) 곧, 주자학에서는 태극이 궁극적 실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면, 대순사상에서는 이 태극을 넘어 태극을 관령하고 주재하는 구천상제가 실재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개념적으로 동일한 ‘대순’·‘무극’·‘태극’은 이러한 개념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종단의 명칭에도 활용되었다. ‘대순진리회’(1969~)는 그 전신이 ‘태극도’(1948~1968)이며, 또 그 전신은 ‘무극도(無極道)’(1925~1941)이다. 비록 종단의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였으나, 무극·태극·대순은 동일하므로 “이 세 종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종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극도가 곧 태극도요, 태극도가 곧 대순진리회가 된다는 것이다.”55) 대순사상에서는 이렇게 본체론적 개념인 주자의 무극과 태극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순사상만의 고유한 용어인 ‘대순’을 이들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단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주자의 무극과 태극이 그대로 수용되고 또 새로운 맥락에서 독창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대순사상에서 주자의 글과 시를 비롯하여 주자학의 주요 용어 등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하며 남긴 공사 3장 39절의 글 가운데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起於寅’은 주자의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이라는 문장에서 유래한 것이며, ‘虛靈·知覺·神明’은 주자학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과 작용, 기능 등을 나타내는 용어다. 주자의 문장은 『논어집주』 「위령공」과 『황극경세서-성리대전본-』에 실린 주자 주석을 비롯하여 『주자어류』 등에 등장한다. 이는 주자가 소강절의 원회운세론에 근거하여 우주 생성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증산은 이 문장에서 ‘生’을 ‘起’로 바꾸어 하루 특정 시간대의 사태를 나타내는 말로 변용하였고, ‘허령·지각·신명’ 또한 도수론적인 개념으로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증산이 저술한 『현무경』에는 반서체로 ‘虛靈符’·‘智覺符’·‘神明符’라는 부의 이름과 각각에 ‘武夷九曲’이라고 쓰인 세 개의 부가 실려 있다.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많은 도인은 이 ‘무이구곡’을 주자가 남긴 ‘무이구곡시’(「무이도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시에는 증산의 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교운의 전개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무이도가」를 입도차제의 재도시로 해석한 조선 사림의 해석과 유사한 모습이며, 증산의 친자 종도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어떠한 전승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이구곡’과 세 개의 부를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도인들의 이러한 해석과 같이 이해한다면, ‘虛靈·智覺·神明’이라는 각각의 도수마다 「무이도가」에 담긴 내용과 같이 유비적으로 교운이 전개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주자의 「무이도가」는 증산의 교운 도수와 관련하여 시의 본의(本意)와는 다르게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순진리회의 창설 유래를 밝힌 글에서는 우주의 본연법칙으로서 태극을 무극과 동일하고 동시적인 존재로 규정한 주자의 개념이 그대로 수용되었고, 대순사상만의 고유한 용어인 ‘대순’을 이 무극·태극과 같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극도’ - ‘태극도’ - ‘대순진리회’로 바뀐 종단의 명칭에도 사용함으로써 무극과 태극이 새로운 맥락에서 독창적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제들 외에도 대순사상의 저변에는 이기론적 사유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는 “이치가 비록 고상하더라도 태극과 무극에서 나온 표상이니 일상생활 속의 일과 사물의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56)라는 말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전후 맥락상 단순한 하나의 진술로 보이며 이기론적 사유도 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증산이 김형렬 종도에게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1장」에 있는 주자의 “대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하였고, 전문(傳文) 10장은 증자의 뜻인데 문인(門人)이 이를 기록한 것이다. 옛 ‘고본(古本) 「대학」’은 자못 착간(錯簡)이 있어 이제 정자(程子: 程伊川)께서 정한 것을 따라 다시 경문(經文)을 살펴 별도로 차례를 만들기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라는 글을 외워주었다는 내용이 있다.57) 이 내용에서도 단순하게 증산이 외워주었다는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의 이 두 구절에 실린 내용들이 비록 주자의 학문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수용’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무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논제로 삼지 않았음을 밝힌다.
하나의 큰 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류의 하천이 있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가 새롭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학문이나 종교, 사상 등이 부분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주자의 학문 세계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근현대에 걸쳐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대순사상을 형성하는 여러 사상적 지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을 ‘주자학의 나라’라고 할 만큼 주자학은 조선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이나 호락논쟁(湖洛論爭), 심설논쟁(心說論爭) 등을 통해 인간의 심·성·정(心·性·情)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제시하며 수많은 학문적 자산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영향력과 학문적 자산을 고려한다면, 조선 말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대순사상의 형성에 ― 유교 사상 전반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주자의 학문 세계가 그렇게 심대하게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자의 학문 세계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일에 초점을 둔 까닭에 공사 3장 39절에 실린 한문 문장 전체의 의미를 밝히는 데는 크게 집중하지 못하였다. 물론, 증산의 천지공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문 전체의 온전한 의미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드러내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또한, ‘武夷九曲’이 주자의 ‘무이구곡시’인 「무이도가」이며, 이 시가 증산의 교운 도수에 관한 공사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단정한 부분은 비록 몇몇 증언이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근거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공사 3장 39절의 한문 문장의 온전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